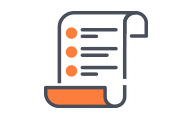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3리 |
신도비명과 서문
전의이씨는 고려태조 도(棹)로부터 비롯하여 대대로 높은 벼슬과 깨끗한 선비가 끊어지지 않아서 울연하게 우리나라의 대성이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선조 때에 제신濟臣은 호가 청강이니 깨끗한 명성과 굳은 도의관념이라든지, 문장과 재략이 당시에 크게 소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고, 또 어진 자손이 많으므로 더욱더 여러 사람의 추앙하는 바가 되어서, 청강공을 모르는 것을 모두 부끄럽게 생각 할 정도이었다. 청강공의 아들 기준(耆俊)은 벼슬이 정자인데, 이 분이 현령 중기를 낳았으니 일찍부터 재상자격이 있다는 촉망을 모았으며, 공은 그의 맏아들인데 이름은 행건(行健)이고 자는 사이(士以)이며 어머니는 풍천 임씨(角川任氏)이다.
공은 나면서 부터 준걸스럽고 특이하여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이 보고 항상(恒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5-6세 때에 비로소 글을 읽을줄 알아 경사를 모조리 통달하였으며, 25세 때에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그 무렵에 적신이 자주 큰 옥사를 일으켜서 선비들을 제거하였는데, 정자공의 서동생 경준(耕俊)이 이 그물에 걸려 죽게되니, 온 집안이 그 누를 입게 되어 현령공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 가서 살게 되자, 공이 항상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고 봉양하였다. 천계 계해년(1623)에 인조대왕께서 반정하시니 광해주 때에 배척받은 사람들은 차례로 거두어 쓰게 되었는데, 어때에 현령공의 인망이 대단히 높아서 외직으로 신계 현령이 되었다가 재임중에 세상을 떠났다. 공이 이때에 사포서(司圃署) 별제(別提)로 있었는데 동생되는 의정공 행원(行遠)과 함께 관을 모시고 고향에 돌아와서 장사지내고, 여막을 짓고 시묘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치었고 또 조모의 승중복(承重服)을 입었다. 이미 문과에 급제하여 곧 예조 좌랑으로 임명되었다가 바로 병조 좌랑으로 옮기었고 정랑으로 승진 되고 이어 사간원 정언이 되었는데 , 그때 귀척중(왕의 인척)에서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목릉에 물이 괴었을 것이라고 하여 광중 가까운 곳에 도랑을 내고보니 그렇지 않음으로 대론(臺論 : 사헌부, 사간원의 의견)이 선왕의 능침을 거짓말로 헐뜯은 것이라 하여 부도죄(不道罪)로 인이 그 사실을 알아보니 용서할 만한 점이 있었으므로 온건하고 공평한 의견으로 맞섰더니, 반론이 물끓듯하여 공의 의견이 잘못이라고 공격하여 드디어 사간원에서 체임되어 사예를 거쳐 경력(經歷)으로 나갔다.
충정공 이 귀(李貴)가 이조 판서가 되니 즉각적으로 다시 청망을 되찾았고 임금께서도 공이 다른 뜻이 없음을 아시어 드디어 지평으로 소환되어 여러가지 직위를 거쳐 장령이 되었지만, 공이 앞의 사건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고, 또 편안하게 정양하기 위하여 자청하여 인천 부사로 나갔는데 치적이 가장 뛰어났으므로 왕께서 품복(品服)을 주어 권장하였다.
대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탈상한 뒤에 시강원 필선, 통례원 상례를 역임하였고, 병자년(1636) 구란(寇亂) 때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독전어사로 선임되어 풍설을 무릅쓰고 갖은 고생을 다하였더니, 적군이 물러간 뒤에 호성 공로로 통정대부로 승진되어 승정원에 들어가 동부승지를 거쳐 좌승지에 이르렀는데 간혹 공조 참의도 되었다. 그리고 또 왕비의 책례(冊禮) 때에 마침 장례원 장례(掌禮)로 있었으므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어 영흥 부사로 나갔는데, 대체로 공이 항상 주습(周拾)하는 임무에 있었고, 공은 또한 정계에 오래 있을 의사가 없더니, 영흥에 있을 때 토질土疾에 걸려서 가마에 실리어 서울로 돌아왔다. 공이 행정을 하는데에는 청렴과 결박과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과 아전들을 복종하게 하였으니, 이민들이 뒷날까지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덕의를 칭송하였다.
일찍이 청풍 군수로 나간 것은 대체로 산수가 청유(淸幽)하여 양병하기에 알맞기 때문이었는데 또한 오래 있지 아니하고 돌아왔고, 갑오년(1654) 8월 11일에 동지중추부사로서 세상을 떠났다. 공은 어버이를 정성껏 섬기어 혼정신성하는 예를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 한 일이 없었으며, 재물을 사사롭게 처분하는 일이 없고 봉록(俸祿)의 수입은 받드시 대부인께 여쭈어서 처리하였다. 처가는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어서 혹 명분이 있는 물자(物資)를 주는 일이 있었지만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 청렴하고 깨끗하면서도 호걸스러운 것은 대체로 청강공의 가법(家法)이었으니 이 몇가지 일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가히 추측할 만하다.
공은 소무원종공신(昭武原從功臣)으로서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고, 묘는 양근 선영하의 을좌 언덕에 있다. 전부인은 전주이씨이고 후배로는 청송의 대성 심대후(沈大厚)의 딸을 맞이하여 아들 형제를 낳았다. 부인은 여사풍모(女士風貌)가 있었으며, 공의 병을 시중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게 한 일이 없었고, 제사를 받들고 아들들을 가르치는 일이 모두 법도가 있었다. 맏아들은 만웅(萬雄)이니 맑은 지조와 아름다운 언행이 있어 선비들의 한결 같은 추앙을 받았으며, 벼슬은 관찰사를 지냈고, 둘째 만종(萬鍾)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측실에서 딸 형제를 두었는데 맏딸은 권순(權諄) 정시필(鄭時弼)의 아내가 되고, 하나는 나두천(羅斗天)의 첩이 되었다. 관찰사의 아들로 징명(徵明)과 징하(徵夏)가 있고, 딸이 4형제인데 사위는 심권(沈權), 이세희(李世熙), 정중진(鄭重震), 한세량(韓世良)이며, 학생 만종(萬鍾)의 아들로는 징선(徵善) 징헌(徵獻)이 있다. 공이 청풍으로 부임할 때에 지나는 길에 청음 문정공 김상헌(金尙憲)을 양주 도산(陶山)으로 찾아와 인사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 모퉁이에 앉아 공의 행동하는 것을 보니 풍채가 당당하고 말이 물 흐르듯 하는데 문정공이 다른 사람과 대할 때에는 일찍이 터놓고 친절하게 하는 일이 없었는데 공에게 대하는 품은 심히 조용하게 담화를 나누었다. 이제 공의 여러 손자가 현석(玄石) 박화숙(朴和淑)이 지은 묘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신도비의 명을 써 줄 것을 청하는지라, 화숙(和淑)은 즉 공의 중표(中表)이다. 삼가 그 글을 바탕으로 하여 간략하게 위와 같이 서문을 쓰고, 이어 다음과 같이 명을 엮는다.
전성의 이씨성은 태사공이 시조이니,
태사공은 고려초에 높은 공훈 쌓았기에,
후손이 연면(連綿)하게 그 뜻 지켜 나오더니,
청강공 때에 와서 더욱 크게 보답되고,
현령공(縣令公)이 계적(繼蹟)하여 나라 기둥감이더니,
재상까지 못 오르니 모를 것은 천리일세.
공은 어린 시절부터『가아』라고 기림받고 장성하여
뜻 못얻어 가업계승하였지만,
마침 때를 못만나서 앞 길마다 험하였네.
성군이 반정하여 재덕인사(才德人士) 등용할제,
공같이 겸전한분 좌우 모두 찬성하여,
현령자리 낮았지만 시용이니 취임했네.
공의 대과급제함이 모두 늦다하였지만,
대서에 임관하여 직언으로 충성할제,
옳은 의견 내었어도 여러 공격받은 후에,
청운길도 때가 있어 청명 다시 인정받고,
인과가 밝혀지니 일월같은 왕 뜻일세.
다시 뜻을 얻었지만 그래도 장애있어.
하늘 높이 못 날고서 몸 늙고 힘 줄었네.
어찌 이렇듯 뜻과 달리 중도에서 끝맺은고.
동의 할 일 남았더니 신명이 돌봄인가?
금옥같은 여러 아들 큰 발전은 없었지만,
효손이 떨쳐나니 앞날이 촉망되네.
공의 약력 간략 간추려서 비명으로 새겨 두네.
좌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지음
|
|
|
同知公 諱 行健 神道碑銘 幷序
全義李氏○肇自高麗太師○奕世蟬聯○蔚然爲東方大姓○至我宣廟朝○有諱濟臣○號淸江以淸名直道文學才略○大爲一世之重○又多賢子孫故○益爲人所推○人有不知淸江公者咸以爲牌淸江公有子曰耆俊○官正字○是生諱重基○官縣令○早負公輔望○公其第一子也○諱行健字士以○母以川任氏○公生而儁異○申文貞公欽見之○未嘗不稱賞○十五六○歲時○始知讀書○輒淹貫經史二十五中司馬○時賊臣屢起大獄○以除去士類○正字公○突弟耕俊絡罹而死○闔門株累○縣令公○奉母夫人○流落鄕土○公常漁獵以爲養○不憚勞若○天啓癸亥○仁祖大王改玉○坐廢者次第收用○時縣令公時望甚隆○而力求外得新溪縣○未幾沒於官○公時爲司圃署別提○與弟議政公行遠○扶匍歸葬○因廬側○克盡情文○又居王母承重服○旣登文第○直拜禮曹郞○俄遷兵曹佐郞○陞正郞○入司諫院正言○有貴戚上書言○穆陵有水患及溝○而不驗○臺論以爲誣罔先王陵寢○不道請置法○公知其情○有可恕者頗持平便之議○物論譁然非○公遂遞諫職○由司藝○出爲開城府經歷○李忠定公貴○掌銓○卽復通淸望○上亦知公無他○遂以持平召還○歷諸司爲掌令○公以前言猶未己○且爲便養求爲仁川府使○以治最賜品服以奬之○大夫人沒○去喪○拜侍講院弼善○通禮院相禮○丙子寇亂○入南漢城○差督戰御史○冒犯風雪○備嘗艱危○寇退以扈聖勞○陞通政入承政院○自同副○轉至左承旨○或爲工曹議○以嘗差王妃冊禮時掌禮○陞嘉善○爲永興府使○蓋公在周拾間而公亦久無當世之意矣○在永罹水土疾○落歸京裏○公爲政以廉白惠愛○服吏民心○吏民追思頌之○嘗就淸風郡守○盖取山數淸幽○便於養病也○亦不久而歸○甲午八月一日○以同知中樞府事終焉○公善事親○定省之禮終始無 ○財貨無所私○俸祿之入○必咨大夫人所處○婦氏家財饒○凡其所歸雖有名輒辭不取其淸峻豪擧○盖淸江公家法也○觀此數事○餘可見也○公有昭武原從功臣○贈吏曹判書○墓在楊根先兆負乙之原前夫人全州李氏○後聘靑松大姓沈大厚女○生二子○夫人有女士風○侍公疾始卒不懈○奉祭敎子○皆有法度長子萬雄○淸操雅望○甚爲士類所推○官止觀察使○次學生萬鍾○早夭○側出二女○爲權諄○鄭時弼妻○一爲羅斗天妾○觀察男徵夏徵明○四女晦○沈權李世熙○鄭重震○韓世良也○學生男徵善徵獻○公之赴淸風也○歷辭淸陰文正公於楊州陶山○余隅坐竊觀公○身貌琺然○言語玧玧○文正公與人言○未嘗款洽○及對公甚從容道語○今公諸孫以玄石朴和叔所撰幽誌○來示余請爲神道之銘○和叔卽公中表也○謹據其文○而略序如右○銘曰全城之李○始于太師○太師於麗功莫與夷○後承遙遙○不墜餘規○至于淸江○益大以祈○縣令繩武○國器是期俱閼公輔○理有難知○公在童年○實稱家兒○旣長而騫○以輪以箕○適丁不辰○行塗坎坤○聖主龍飛○管剌罔遺○淃公大家○左右咸宜○吻試于初○公不辭卑○狹決大科○人謂其遲○圖歷臺署○矢以不欺○不與人同○以招群非○雲衢方啓○遂成丕悚○有事源委○天鑑曲垂○旣屈復伸○不殄于詩○飛不盡翰○衰老及之○不如而止○於斯公有○不食神落○白眉峻望○如玉亦不○大施孝孫○振振思美○其爲我撮○其略篆此銘詞○左議政宋時烈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