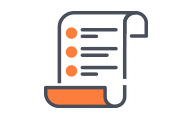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릉리 약촌 |
신도비명과 서문
이씨로서 전의를 본관으로 하는 집은 모두 고려 태조 도(棹)를 근본으로 삼는다. 조선에 와서 효정공(孝靖公) 정간(貞幹)이 백세의 어머니를 효성껏 받든다는 소문이 세종대왕께 들리게 되어 세종대왕이 교서와 작위(爵位)와 수서(手書)와 궤장(免杖)을 하사하시어 우대하였다.
6대를 내려와 청강공 휘 제신(濟臣)은 문장과 행절이 선조조 때에 크게 울리었으니 이분이 공의 조이고, 이 아들은 정자 기준(耆俊)이니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지 아니한 해가 없는 분이고, 손자인 현령공 중기(重基)는 어려서부터 재상이 될 인재라고 모두 촉망하였으나 벼슬이 하료에 그치고 세상을 떠나니 식자가 모두 한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전부공(典簿公) 임색(任穡)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다. 6살 때에 임진란(壬辰亂)을 구원하러 나온 중국 장수가 보고 기이하고 사랑스럽게 여겨 날마다 손을 잡고 함께 거닐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크게 귀히 될 것이라 하였다.
현령공이 공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중국 촉(蜀)나라 선제의 말 가운데 『악(惡)한 일은 적다고 하여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착한 일은 적다고 하여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을 본보기로 들었다.
19세때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26세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였다. 이보다 먼저 간신들이 혼주(昏主 : 광해군)를 꾀어서 여러번 큰 옥사를 일으키었는데 공의 집도 이에 휩쓸려 들어가서 현령공이 향리(鄕里)로 스스로 숨어버리니, 공과 백씨 행건(行建)은 천렵(川獵)과 사냥으로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이미 급제하여 관적에 이름이 실렸으므로 비록 간당들이 늘어섰어도 오히려 괴원에 속해 있었으니 대체로 공의 사람됨과 문벌을 감히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못한 때문이다. 정자(正字)를 거쳐 박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천계 계해년(1623) 3월 13일에 창졸간에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손에 활을 들고 몸을 낮추면서 나섰으니 대체로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죽을 각오를 한 것인데, 밝을 녘에는 인조께서 반정한 것을 알고 즉시 어전에 나아가 임금께 뵈오니, 임금이 급히 공에게 명령하여 옥의 자물쇠를 부수고 갇힌 이들을 풀어 놓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서역(書役)할 것이 번거롭고 많았는데 공이 빠르고 속하기를 신처럼 처리하니 그때부터 王의 교론 기타 문서를 모조리 공에게 맡겼지만 얼마있지 않아서 몇 천장을 써내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았으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글씨[飛書]라는 별명을 붙였다. 천망(薦望)으로 예문관 한림(翰林)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옥당 남상 홍문관 정자로 임명되었다. 그 때에 현준賢俊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논의가 일신되었는데 공이 제일 우두머리로 꼽히니 당시 사람들이 영화롭게 생각하였다.
그 무렵에 날이 크게 가물어 임금께서 친히 비를 빌려고 할 때에 공이 여러 동료와 함께 상차 간단하여 임금께서 몸소 기도하지는 말도록 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임금이 몸소 비를 빌면 임금을 외경하는 마음이 해이하여지기 쉽지마는, 신하로 하여금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면 대월(對越)하는 정성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반정할 때에 간신 박승종이 폐주 광해(光海)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정언 홍호(洪鎬)가 박을 포상(褒賞)으로 높여주기를 청하였더니 임금이 특명으로 홍호를 파직시키었다. 공이 관료 동료(同僚)와 함께 차(箚)를 올려서 논하기를 『승종은 곧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되는 신하입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전폐(殿陛) 안에서 죽은 것도 아닌 것을 어찌 포숭(褒崇)하여야 한다는 말이 당한 말입니까. 그러나 호(鎬)는 어리석고 혼암하여 그런 당치 아니한 말을 하였으나 다만 그 말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인데, 하필 죄까지 주어 충간하는 언로를 막으려고 하십니까.』하였더니, 호는 이와 같은 건의로 인하여 파면은 되지 않았다.
이괄이 반하였을 때에 현령공(縣令公)이 임소 황해도 신계(新溪)에 있었는데, 마침 적군이 서울로 침입하는 길목이었다. 공이 상소하여 그 부친과 더불어 종군하여 적군을 치겠다고 청하였더니, 임금이 허락하여 신계에 도착하여 보니 감사 림공(林公) 서(繪)가 벌써 현령공을 불러서 종군토록 한 뒤이었다. 얼마 뒤에 현령공이 세상을 떠나니 3년상을 마치고 수찬 교리 정언(正言) 헌납(獻納) 등의 여러 요직을 거쳐 이조에 들어가서 낭관(郞官)이 되었고, 조금 지나 옥당(玉堂)으로 옮기었다. 임금께서 사묘(私廟)를 숭봉(崇奉)하고자 하므로 공이 포저(浦渚) 조익(趙翼), 잠곡(潛谷) 김육(金堉)과 함께 힘써 그 일이 예법에 어긋남을 변백(辨白)하였다. 어사로서 황해도 지방을 순찰할 때에 외사(外使)인 현방(玄方)이 서울에 와서 공갈(恐喝)을 한바 있으므로 공이 사람을 시켜 꾸짖어 물리치고 또 완곡한 말로 타일렀더니, 외사가 부끄러워 하면서 승복하였다. 집의(執義)와 응교(應敎)로 승진되었을 때에 이경증(李景曾)과 이상질(李尙質)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임금의 명을 거역한 일이 있었는데, 공이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한 일도 있었다. 임금이 사친을 장차 태묘(太廟)에 승부(陞蟄)하려고 하면서 또 장차 중국에 주청하려고 하니, 공이 잇달아 차를 올리어 힘써 간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만약에 사친을 사당에 모신다고 하면 여러 임금의 위패를 마땅히 차례로 옮기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모셔져야 할 처소가 전도(顚倒)될 뿐만 아니라, 신도도 또한 편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크게 노하여 방자하다는 죄목으로 특명하여 잡아다가 국문하고 또 멀리 귀양보내라고 하였지만, 모든 대신들이 말리어 무사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뜻이 오래도록 풀어지지 않아서, 공을 청선(淸選)에 추천하였다 하여 이조의 여러 관원을 파면한 일도 있었다. 인목대비께서 세상을 떠난신 뒤에 공이 초종과 장제(葬祭)에 정성껏 일을 보살핀 공으로 승지로 승진시키었다가, 다시 전직으로 옮기었고, 대부인의 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치고 구관직으로 복직되었다. 병자호란 때에 경황없이 궁을 떠난 임금을 모시고 가는데, 임금이 내관에게 명하여 그가 탄 말을 공에게 주고 대신 걸어가게 하였으며, 남한산성(南漢山城)이 둘러 쌓이고 난병이 가까운 곳까지 핍박하여 오니, 행궁의 관원이 전날에 척화(斥和)를 배척하던 신하를 적군에게 내어 주기를 청하였더니, 공이 칼을 빼어들고 꾸짖어 물리치며 말하기를 『아무리 위급한 때를 당하였기로서니 너희가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였다.
시남(市南) 유공(兪公) 계(棨)가 이 사실을 곁에서 목격하고 공의 의용에 탄복하기를 마지 않았다. 난리가 끝난뒤에 호종한 공로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고 사간원 대사간(大司諫)과 국자감(國子監)으로 승진되었다.
청음(淸陰)과 동계(桐溪) 두 어른이 먼저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가 시의(時議)에 거슬렸다 하여 적신 이계(李埼) 등이 반드시 엄중하게 추궁하려고 하니, 공이 대사헌으로서 한가지씩 사실을 따져서 그들의 잘못이 없음을 변명하였는데, 임금께서도 계 등의 간사한 행동을 어지간히 아는 까닭에 공의 이러한 언동에 대하여 별일이 없었다.
경기 감사가 되었다가 다시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부빈객으로 세자를 따라 심양(瀋陽)에 갔었는데, 오랑캐들이 또 청음(淸陰)을 북쪽으로 잡아가게 되어 장차 화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를 지경이었다. 공이 통분히 여겨 침식을 폐하기에 이르니, 오랑캐들까지도 공의 행동에 탄복하여 『이빈객(李賓客)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심양에서 돌아와 열한가지의 벼슬을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을 때에 강빈(姜嬪)의 옥사에 대하여 여러 번 계를 올려 논쟁하였지만 윤허되지 아니하더니 최후로 임금이 탑전에 대신 이하 여러 중신을 인견할 때에 특히 공을 불러 앞줄에 서서 강의 죄를 조목조목 들어 수죄하도록 하였는데, 공이 물러나와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논쟁을 정지시켰다.
이조에서 참판으로 있다가 판서로 승진하였고, 다시 병조판서로 옮겼으며, 정해년(1647)에 특별히 우의정(右議政)으로 발탁되었고, 무자년(1648)에 임금의 명을 받아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공이 이때에 이미 병이 깊었는데도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길에 올랐으나 병이 매우 심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래어 태의(太醫)를 엄선하여 가서 병을 치료하여 구하라 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었다.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의주부의 관원에게 말하기를 『임금의 명을 받고 떠났는데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한이로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부고를 받고 크게 슬퍼하였으며,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깝구나, 나의 훌륭한 보좌를 잃었구나.』라고 하였다.
공은 이름이 행원(行遠)이고 자는 사치(士致)요 호는 서화(西華)인데 키가 크고 골격이 수려하며 수염이 많이 났고 기상이 호방하고 명랑하며 매우 우람하였다. 평소에는 겉으로 화기가 넘쳐 흘렀고 솔직한듯이 보였으나 마음은 간중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두터워서 대부인을 지성으로 섬기고 동생들을 극진히 사랑하였다. 일찍이 명령으로 중국사람을 접반할 때에 대부인이 병환이 있었으므로 얼굴빛이 근심에 쌓여 달라진 것을 보고 중국 사람이 이 내용을 물어서 알고 말하기를 『나도 늙으신 어머님이 계신데 공의 말을 들으니 나의 마음도 걱정으로 죄어 드는구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였다.
벼슬자리에 앉아 일을 처리할 때에는 청렴하고 근신하는 것으로 제일 목표를 삼았다. 임금께서 지우함을 받아 긴요한 자리를 거치어 정승의 지위까지 올랐고, 전후 30년 동안 벼슬살이를 하였으나, 논밭이나 가택(家宅)이나 노복들이 옛날보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으니, 대체로 청강공의 가법(家法)이 그러한 것이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집이 허물어진 것을 혹 다시 짓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이 말하기를 『난리 뒤끝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 집지을 생각을 하겠느냐?』고 하였다.
대체로 그때에 동궁이 볼모로 잡히어 가있고, 국가의 수치를 설치하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다. 동호(東湖) 신익성(申翊聖)이 재목과 기와를 보내어 두어칸 집을 지으니, 사람들은 두 분을 위하여 모두 잘된 일이라고 하였다. 사람들과 추축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무가 끝나서 물러나오면 문을 닫아걸고 삿자리에 기와로 구어 만든 베개을 베고 드러누워 있는 폼은 쓸쓸하기가 이를데 없어, 마치 가난한 선비와 같았다. 손님이 찾아오면 술을 내어 서로 즐기며 밤이 되도록 담소하니, 보는 이들이 왕사王謝의 풍도가 있다고 하였다. 공이 젊었을 때에 꿈 가운데서 시를 한 수 지었는데 『늙으막에 장상(將相)을 사양하고 돌아가서 산수간에 누워 있으리라.』라는 것이었다. 정승이 되고서도 항상 물러나 쉴 뜻이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대체로 공의 꿈속의 시는 반은 맞치지 아니한 셈이었다.
공의 초취는 나주박씨이니 남곽(南郭) 동설(東說)의 딸인데, 딸 하나를 두어 현령 이관하(李觀夏)에게 시집갔고, 후취는 현감 한사덕(韓師德)의 딸이니 아들 형제 딸 3형제를 낳았다. 맏아들은 만최(萬最)이니 봉사이고, 다음은 만유(萬有)이니 학생이며, 맏딸은 부제학 이단상에게 다음은 감사 유상운에게 막내는 종실(宗室) 낭원군(郞原君) 간에게 각각 시집갔다. 봉사 아들로는 징주(徵舟) 징즙(徵楫) 징해(徵海)가 있고, 세딸 중에 둘은 최응망(崔應望)과 정식(鄭栻)에게 각각 시집갔으며, 막내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고, 학생은 공의 종제되는 참의 행우(行遇)에게 출계하였으며, 아들은 징룡(徵龍)이고 딸은 형제인데 박정양(朴正陽) 유수익(柳壽益)에게 각각 시집갔다. 현령 이관하(李觀夏)는 아들 장령(掌令) 선원(善原)과 주부 선연(善淵)과 지평(持平) 선부(善溥)가 있으며, 딸 형제는 유이승(柳以升) 김일태(金一兌)에게 각각 시집갔고, 부제학 이단상(李端相)은 아들 희조(喜朝) 하조(賀朝)가 있으며, 딸은 위로 4형제는 이행(李痼) 김창협(金昌協) 민진후(閔鎭厚) 송징오(宋徵五)에게 출가하였고 막내는 아직 어리며, 감사 유상운(柳尙運)은 아들 봉서(鳳瑞) 봉징(鳳徵)이 있는데 아직 어리고 딸은 맏이는 이세최(李世最)에게 시집갔으며 하나는 아직 어리고, 낭원군(朗原君)은 아들로는 도(渡) 준(濬) 부(溥) 등이 있는데 모두 위호(位號)가 있고 둘은 어리다. 나는 시골에서 생장하여 공(公)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군이 지은 행장을 본 즉 그의 조부(祖父)인 백주공(白洲公)께서 공을 칭찬하여 한 말씀을 들어 말하기를 『사치(士致)는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한 세상을 개미떼를 보듯하고 천고를 달관하여 저절로 하늘끝에 닿을듯한 기상이 있더니 급기야 높은 벼슬에 올라 논난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출입할 때에는 모든 벼슬아치들이 두려워하고 꺼리었으며 그 문사와 묘한 글씨 등은 모두 덮어두고 보이지 않아도 알만한 것이지만, 세상의 속물들과 더물어 숨기고 보이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지금 세상 사람들로서 미칠 수 있는 경지이겠는가?』라고 한 것이었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가히 공의 인품의 대략을 알 수 있다.
공은 숭정 무자년(1648)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57세였고, 양근(楊根)의 수남리(水南里)에 장사지내니 이 곳은 즉 공의 선영이다. 이어 다음과 같이 명을 엮는다.
전의(全義) 이씨들은 여초(麗初)부터 나타나서,
조선초의 효정공은 행의(行義)가 탁월하며,
청강공에 이르러서 명성이 크게 울리었고,
자손 또한 번창하여 순풍에 돛이러니,
현령공은 촉망에 비해 위계 낮아 아까웠네.
저승에서 자손 도와 다시 창성하는건가?
어릴적에 남과 달라 중국장군(中國將軍) 놀랐으며,
과거는 알성이요 뭇 닭속에 학(鶴)이었네.
착한 임금 중흥 도와 현준(賢俊)들의 뜻을 이어,
여러 청현 거치면서 막힘없이 나아가서,
직위마다 충의바쳐 나라 운을 이끌었네.
화한 얼굴 곧은 말씀 정의위해 쟁간(爭諫)하며,
해마다 지위 올라 재상까지 되시었네.
반대파도 당도 없고 외면한 일
누가 하나 임금님의 슬퍼했네.
성효로운 자손있어 공의 신도 밝히려네.
묘 앞에 행적 새겨 아름다움 영원하리.
내 지금 명 지으니 사모 더욱 끝이 없네.
좌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지음
|
|
|
西華公 諱 行遠 神道碑銘 幷序
李公望全義者○皆本於高麗太師棹○本朝孝靖公貞幹○有百歲母○以善事聞○世宗大王優賜以寵之○六世而至淸江○諱濟臣○文章節行大鳴○宣祖世○是公曾祖○子正字諱耆俊無年不顯○孫縣令公諱重基○早負公輔望○終於下僚○識者恨之○典簿任公穡○妻以女○而生公○六歲而有東征天將奇愛之甚○日與提携曰○必大貴也○縣令公○敎公○必擧蜀先帝語曰○勿以惡小而爲之○勿以善小而不爲○十九○中進士○二十六擢謁聖及第○先是突臣慫慂昏主○屢起大獄○株累公家○縣令公自廢于鄕里○公與伯氏行健○漁獵以爲養○旣通籍雖姦當堵立○猶分隸槐院○盖以公人地不敢捨也○由正字兼博士○攝職堂后○天啓癸亥三月十三日○倉卒聞軍聲○手弓棄高○盖將爲所事致死也○黎明知聖上反正○卽詣御前謁上○上吻命公剖鎖放獄囚○時書役繁棠○公敏速如神○自是○敎諭諸文○盡以屬之○公俄頃掃盡累千紙○不錯一字○一時稱以飛書○薦入藝文館翰林○間卽眞于堂后○遂拜玉堂○南床○時賢俊盈庭○論議一新○而公首居極選○一時榮之○大旱上親禱○公同諸僚○上箚○請勿以己禱而遂弛敬畏之心○益篤對越之誠○反正時○孼臣朴承宗○棄廢主走死○正言洪鎬請加褒崇○上特罷鎬公○又與館僚箚論○以爲承宗卽致亂之臣○死不償罪○況不死於殿陛間○豈合褒崇○然鎬以愚暗○妄論當○不用其言○何必罪之以防言路○鎬由是得不罷○李适叛○縣令公○在任所○在賊路○公上疏乞與父從軍討賊○上許之旣至則○監司林公繪隻以自從○未幾縣○令公歿○服局○歷修撰校理正言獻納○入吏曹爲郞○俄遷玉堂○上欲崇奉私廟○公與浦渚趙公翼○潛谷金公堉○力辨其非禮○以御使廉察海西○外使玄方至京○有所恐喝○公以學使責斥之○又緩辭以諭之○外使愧服○陞執義應敎○時李公景曾李公尙質○因事臨旨○公伸救甚至○上尊奉私親○復將以陞蟄太廟○又將奏請天朝○公連上箚力爭○略曰私親旣入廟則○列聖又當以次蔿遷○不惟所顚倒○神道亦未安○上震怒○目以縱恣○特命拿鞫○又命遠竄皆以大臣言而止○然上意久未解○以擬公淸選○特罷銓曹諸官○仁穆大妃薨○公以董事勞○陞資爲承旨○遞復拜○丁大夫人憂服局○復舊官○丙子虜變○倉皇隧駕○上顧命內官○給馬代步○城圍急○亂兵直逼行宮○請出前日斥和臣○以與虜○公拔劍叱退曰○雖當危急之除○汝等何敢乃爾○市南兪公棨在傍○目其事○服公義勇○極加歎服焉○亂己用扈從勞○陞嘉善○歷長諫阮國子○淸陰桐溪二公○先以斥和臨時議○賊臣李埼等○心欲重究○公以大憲○逐節卞其誣○上頗知埼等之姦○而公亦見遽○而己爲京畿監司○復長諫院○以副賓客從世子于瀋館○虜又以淸陰北去○禍將不測○公痛杳憤鬱○至廢寢食○虜亦服公曰○李賓客善人也○自瀋歸○歷十一官○復爲大司憲○爭論姜獄○屢啓不允○最後上於榻前○引見大臣以下○特召公使前列○數姜罪○公旣退○遂與諸公相議停論○以吏曹判○陞判書○移判兵曹○丁亥特拜右議政○戊子承命赴燕○公時己寢疾○而不敢辭○上道甚劇○上聞大驚○極擇太醫○赴救之則己不及矣○臨沒謂義州府官曰○受君命未○復是吾恨也○上聞訃震悼○又曰惜哉○喪予良弼○公諱行遠○字士致○號西華○公長身秀骨○美鬚角頰○氣像豪爽俊偉○平居和易坦率○內實簡重篤於孝友○事大夫人盡其誠○友弟妹極其愛○嘗以命接伴王人○時大夫人屬疾○怪色不容○問而知之曰○我亦有老母○聞公言○我心蹙然○遂許鏶歸○當官任職○一以淸愼爲主○遭遇盛除○進途大闢○首尾三十年○田園第宅臧獲盖藏○一無有加於舊盖○淸江公家法然也○亂后屋廢○或勸其營綠○公曰艱虞未定○何以家爲○時箇春窮乭於質館○國家羞牌未雪故○其言如此○東湖申公翊聖○歸材與瓦爲作數間屋○人兩美之○公不喜與人追逐○每公退杜門大臥瓦枕○草澄蕭然若寒士○客至置酒相歡○談笑永夕○言者以爲○有王謝之風○公少時夢中有詩曰○老來辭將相○歸去臥林泉○及拜相○常有休退之意而未及○公盖於夢得其半○而失其半矣○公老娶羅州朴氏○南郭東說之女○擧一女○適縣令李觀夏○後娶縣監韓師德女○生二男三女○男長萬最奉事○次萬有學生○女長適副提學李端相○次適監司柳尙運○次適宗室朗原君○奉事男徵舟徵楫徵海○二女適崔應望鄭龜○季末行○學生出後○公從弟議行遇○一男曰徵龍○二女適朴正陽柳壽益○縣令男掌令善源○主簿善淵○持平善溥○二女適柳以升金一兌○副提學男喜朝賀朝○四女晦李痼○金昌協閔鎭厚宋徵五○季幼○監司男鳳瑞鳳徵○二幼適李世最一幼○朗原君男渡濬溥深皆有位號○二幼○余以蓬茅賤士未嘗延公顔面○今見李君所撰以狀則○擧記王父白洲公稱公之言曰○士致閒居燕處○解衣盤儁○屑視一世○達觀千古○自有天際之想○及其垂紳搢笏○出入論思百僚畏憚○至其文辭筆妙皆 而○不見不欲與世爭名○此豈今世人之所及也○觀此亦可以知公之大略矣○公沒于崇禎戊子四月十六日○得年五十七○葬于楊根水南里卽先兆也○銘曰全城之李○顯自麗初○本朝孝靖○行義卓殊○至于淸江厥聲大振○子姓繁昌○前則是順○惟縣令公○望隆位細○歸成後人○克昌厥世○公生而異○鎌動王人○場屋得雋○秀出群倫○聖祖中興○接武賢俊○安坡鳳池○平步以進○所在盡誠○以替興運○誾誾郭郭○公館三復○其庸未羅○慟纏宸極○烝烝孝孫○思顯厥懿○宅相述行○罔有溢美○我作銘辭 劤于無止○左議政宋時烈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