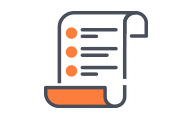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과 서문
국가에서 외구의 환난에 대처함에 있어 사단을 빙자하여 공갈을 앞세우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오는 것이 가장 난처한 일이다. 효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착하기만 하여 약한 태도로 업신여김을 받기만 하겠는가? 용맹한 마음을 떨쳐서 적들을 꺾어 누를만한 책략으로 국위를 신장하여야 하겠다』고 하셨다. 이 무렵에 동래 부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추천하였더니 왕이 뜻에 맞지 아니하여 다시 추천하라고 특명하시어 숭정 기해년(1659) 봄에 홍문관 응교 이공 만웅(萬雄)을 추천하였더니 위계를 높이고 차례를 뛰어올려 동래 부사로 임명하였다. 왕을 뵈옵고 임지로 떠나는 날 왕께서 직접 대면하여 부탁하시는 말씀을 주시었다. 공이 임지에 도착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효종대왕께서 승하하시니 왜관에서 상업하는 그들이 옛 습성을 다시 나타내기 시작하여 징구(徵求)하여 왔으니 공은 엄하게 거절하고 쫓아 버렸더니 왜인들이 난동을 일으키려는 생각으로 칼을 빼어들고 왜관을 나와 부산진으로 들어가서 사방으로 나돌아 다니면서 강탈과 약취를 일삼으니 공이 조정에 대하여 대마도주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어 약속을 위반함을 문책하여야 하겠다고 청하였더니, 조정에서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공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지나친 염려를 함으로써 한번도 위엄으로 그들을 제재(制裁)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날로 조장하고 있다. 무력을 발동하여 놈들을 남김없이 죽여 없이한 후에 격서를 대마도에 보내면 잘못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들이 스스로 두려워 움츠려 들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한 보비(補裨)를 시켜 무기를 정돈케 하였다. 장계가 들어간즉 조정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미친 생각이라고 비난하고, 공을 추문하여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공은 다시 강경하게 이해관계를 설명하였더니 이때에 외구(外寇)들이 공의 굳은 뜻을 정탐하여 알고 작란질을 중지하고 왜관으로 철수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공이 끝내 왜인대처에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뜻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여 당초부터 왜인들을 포로처럼 대우하여 약속사항을 어기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 형사 담당부서로 불러들여 신문하니 이에 대한 답변에 더욱 의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면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방숙方叔의 장한 꾀가 서생으로부터 나올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더니, 지금 공을 위하여 밤으로는 북두칠성이 있는 허공을 본다고 하였다.
뒤에 공이 별세한 것을 듣고 국가를 위하여 아프고 아까와서 공의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눈물이 나왔었다.
이제 그의 두 아들인 징명(徵明)과 징하(徵夏)가 문곡(文谷) 김수항공(金壽恒公)이 지은 행장을 갖고 나를 찾아와서 묘갈명을 청하니, 문곡은 공의 지기의 벗이며, 그 말이 진실하여 꾸미거나 화려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원래부터 공의 뜻과 업적이 뒷 세상에 올바르게 알려지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던 참인지라, 그 행장에 의거하여 서술(敍述)하기로 한다.
공의 자는 심보(心甫)이고 전의인인데 고려 태사 도(棹)의 후예이다. 근세의 휘 제신(濟臣)은 문무를 겸한 재간이 있어 선조조의 뚜렷한 명신인데 세상에서 청강선생(淸江先生)이라고 하였다.
휘 기준(耆俊)은 재주는 있었으나 오래 살지 못하여 승문원 부정자를 지냈을 뿐이고, 휘 중기(重基)는 젊어서부터 재상감이라는 촉망을 받았으며, 석실(石室) 김문정공(金文正公)과 서로 친숙한 사이인데 현령을 지내고 별세하였으며, 휘 행건(行健)은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고 그 부인은 청송의 대성인 심대후(沈大厚)의 딸인데, 청강공으로부터 공의 세대까지 5세 동안 관작과 덕업이 서로 비길만 하더니, 공이 또한 성품이 특출하여 모두 나라의 기둥감으로 기대하였다. 어릴때 택당(澤堂) 이식공(李植公)의 저택(邸宅)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앵도가 한창 붉게 익어 여러 아이들이 따 먹으려 한즉, 공이 어른의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따 먹으려 하느냐고 제지하니 택당(澤堂)이 크게 기특히 여기었다.
또 한번은 누가 복숭아 두 개를 주니 먹지 아니하거늘 그가 먹지 아니하는 뜻을 짐작하고 다시 복숭아 두 개를 더 주었더니 그래도 먹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어버이께서 아직 맛보지 못하신 것을 감히 먼저 먹을 수 없다』고 하였다며, 서당에 나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문장으로 붕우사이에 명망이 있었다. 병자 정축년(1636-1637)에 오랑캐의 난이 지나간 후 시를 지어 뜻을 보이고는 과거에 응시할 생각을 끊었더니 나이 20세 때에 어버이의 명령으로 기묘년(1639)에 진사시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10년 후에 재랑(齋郞)에 임명되었고, 효종 경인년(1650)에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의정부를 거쳐 시강원 설서(說書)로 옮겼다가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승진하였는데, 언해(言解)나 처사에 있어 대신들에게 아첨하지 아니하여 미움을 받았고, 또 윤선도(尹善道)의 음패(淫悖)를 논핵(論劾)하였더니 선도가 왕의 사부(師傅)로서의 옛 은의가 있어 왕께서 공의 직책을 고의로 바꾸어서 평강 현감(平康縣監)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행정면에서 청렴과 공평을 숭상하고 묵은 폐습(弊習)을 개혁하는데 힘쓰니 아전이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더니, 이듬해에 홍문관 부수찬으로 불려 들어감에 현민(縣民)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워서 은혜를 잊지 않았다. 들고 나며, 의논하고 생각하는 바를 왕께 품계하는 일이 많았는데 왕께서 일찍이 공의 응제(應製) 때의 시가 훌륭하다고 하여 초모(貂帽)를 하사하여 총애하는 뜻을 표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 뒤에 옥당에 있었는데 천변이 있어 수심과 반성에 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왕께 올렸고, 또 여러 부마가 대궐 안에서 유숙함에 대하여 존엄을 모독하는 일이므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진언하였더니 왕께서 옳게 여겨 여러 공주와 옹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이런 의견은 비록 너희는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나 나로서는 이와 같이 곧은 신하가 조정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바이다. 모든 신하가 이모(李某)와 같다면 나라의 일은 걱정할 것 없이 잘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다.
다음에 이조 좌랑이 되었으나 공이 영진(榮進)하는 것을 원래부터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또 중요한 자리에 대한 엄선에 뽑히는 것을 바리지 아니하여 굳이 사양하고 어버이를 효양하기 위한 길로 영동의 수령으로 자원하여 나갔더니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불려 들어와서 이로부터 연하여 옥당(玉堂) 사간원(司諫院)의 장원(長員) 이조 낭관으로 서임敍任되었고, 삼자함의 일을 겸무하다가 명령에 따라 호서지방을 염찰(廉察)하고 돌아와서 바로 동래 부사로 나가라는 명이 있었고, 경자년(1660)에 연안 부사로 옮겼는데, 공이 연안과 강도(江都)가 지리적으로 형세가 서로 관련됨으로 소를 올려 서치공로제(胥齒控路制)(입술과 이와의 관련에 따른 교통통제交通統制)를 써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였더니 조정에서는 이 의견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신축년(1661)에는 본도 관찰사로 승진하였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밤낮없이 근심속에서 부지런히 구제에 힘쓰는 품이 시종이 지성스러워서 백성들이 신뢰하여 혼란이 없었다. 7월에 대부인의 병으로 집으로 돌아기기를 상소로 청하였더니 즉시 허용되어 공이 돌아왔는데 대부인께서는 이미 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공이 매우 고달파 하더니 겨우 일주야(一晝夜)를 지낸 윤달 초하루날 별세하니 조정에서는 조문(吊問)과 부조(賻助)를 예에 따라 내리고, 양근의 서쪽 선영(先塋)아래 간좌(艮坐) 언덕에 안장하도록 하명이 있었다.
공은 살결이 희고 키가 훤칠하며 수염이 길고 얼굴이 풍만(角滿)하였으며, 성품이 청명하고 순박하여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어서, 겉 보기에는 원만(圓滿)하였지마는 그 마음은 굳세고 씩씩하였다. 날마다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가묘(家廟)에 배알한 후에는 조용히 독서하되 밤을 세워 새벽에 이르렀으며, 조정에 출사出仕한 후로는 관적(官籍)이 오랬동안 경악(經幄)에 있었으므로 항상 비위(非違)를 가리는데에 중점을 두고 안팎으로 임무에 진심하여 효종께서 그 인망이 동료들보다 특출함을 아시었다. 가정에 있을 때에는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끝나면 종족끼리 돈목하는데 힘쓰고 어버이를 여읜 외로운 소년이나 과부들을 교도하고 위로하여 은혜로운 뜻이 균등(均等)하게 미쳤으니 대체로 그 행의(行義)가 고인의 예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거의 없었다. 단아(端雅)한 성정이 속세의 취미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산수간에 뜻을 두더니, 언제인가 꿈에 경치가 좋은 곳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선영하에서 청강공의 옛 집터를 발견하게 되어 살펴보니 완연히 꿈속에서 보던 경치와 같았으므로 몽탄이라고 호을 짓고 풀 지붕 정자를 이룩하여 청강공의 시어를 따서 녹수(綠水)라고 불렀으니 이미 돌아갈 뜻이 결정된 것인데, 마침내 그곳이 공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아! 이것은 아마도 미래를 예견한 조짐兆朕이 아니겠는가?
부인 서씨는 당성위(達城尉) 경주의 딸이며, 충숙공(忠肅公) 성(紺)의 손녀이고 선조대왕의 외손이다. 징명(徵明) 진사(進士)는 사우들의 아끼는 바이며 여서(女晦) 넷은 심권(沈權) 이세희(李世熙) 정중진(鄭重震) 한세량(韓世良)이고 내외손이 약간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공이 동래 부사로 있을 때에 효종대왕께서 재세하셨더라면 반드시 공의 헌책을 채용하여 하룻강아지같은 왜노들을 사로잡아 전 대마도(對馬島)가 꼼짝 못하게 다스려져서 우리 임금께서 오늘과 같은 근심이 없도록 하였을 것이고, 공이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더라면 반드시 능히 날카로운 힘을 비축하여 기계를 써서 중국 본토(中國本土)를 도모하여 백세토록 씻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었을 것이며, 또 정의를 앞세워서 오늘날 하늘에 닿은 사회를 구했으리라. 어찌 지금처럼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몸둘 곳을 못 찾을만큼 두려워만 했겠는가?
아! 하늘이 무심하여 효종대왕의 떠나시는 길을 잡을 수 없어 명예로운 계획을 저승에서나 써 볼것인가? 끝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으니 아 슬푼지고, 아 슬프고 말고. 이어 다음과 같이 명(銘)을 엮는다.
고려태조 건국할제 태사공의 공이 커서,
수많은 공경들이 세덕을 이어 왔네.
청강공 때에 와서 더욱 뚜렷해지더니,
공이 업적 계승(繼承)하여 티없는 옥이었네.
품은 뜻 아름다워 행적도 화려했네.
시대에 합당한 일 내외직을 완수했네.
동래부사 보낸 왕명 왜인(倭人)꺾을 웅도짜서,
품하기 전에 왕 가시니 계책은 휴지됐네.
계책 아니 쓸 뿐인가 오히려 문죄했네.
천수 또한 길지 못해 중도에서 별세하니,
어찌타 공의 정충 가신 후에 빛 더하고.
한여름 엄동 설한 베옷 털옷 생각하듯,
말세인가 끓는 여정 내 누구와 한길 갈까?
녹수(綠水)라는 저 정자엔 산 높고 물은 양양,
생전에 즐기더니 돌아가서 또 묻혔네.
뚜렸한 명당이니 영원 안식 하시겠지.
뒤에 오는 사람들아 이 명보고 공 기리소.
좌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지음.
|
|
|
黃海監司公 諱 萬雄 神道碑銘 幷序
國家患外寇○憑陵疑喝○顯以要索爲事○孝宗大王敎曰○豈可終於善弱○受侮以啓戒○心宜有以震驚○挫抑以伸國威也○會當選遣東萊府使○該司所薦不當○上心特命改薦○崇禎己亥春○以弘文館應敎李公萬雄○陞秩超拜陛辭日○賜對而諭公○至任未幾○孝廟禮陟○倭人互市者復踵前習○有所徵求○公嚴辭以斥之○倭人故欲生亂○露刃出館入據釜山鎭○仍四出奪掠○公請於朝○欲移書島主○責其違約○朝廷不許○公又力請以爲我國失於過慮○一不能威制○使侮我之心日長○請以于戈從事○殄滅無餘然後○檄諭島中則○曲不在我○彼必自摺矣○仍命一膾裨○治器械○狀啓至○朝廷愕燒○以爲狂謀○至請推責○公復力陳其利害○會外寇偵知公意○收晸還館○朝廷慮公終不但己○托以當初致虜犯約○爲可罪○召下廷尉○公對語益慷慨憤發○余以書勞之曰○不料方叔壯猷○出於書生○今爲公夜看斗牛之墟矣○後聞公歿○爲國慟惜興言必涕○今其二子徵明徵夏以文谷金公壽恒之狀○來謁余銘○文谷公之知己也其言質而無華○余固懼公之志業○不顯著於今後○遂據其狀而爲文○敍曰公字心甫○全義人○高麗太師棹之後○近世有諱濟臣○以文武全才○大爲宣祖朝名臣○世所謂淸江先生者也○諱耆俊○有才無年○官至承文副正字○諱重基○早負公輔望○石室金文正公相與友善○以縣令卒○諱行健○文科同知中樞府事○其配靑松大姓沈大厚女○自淸江至公五世○風猷克兢○公又性度離倫○人期以國器○幼時詣澤堂李公第○庭有朱櫻方熟○諸兒欲取以啖之○公止以未有長者命○澤堂大奇之○嘗受人二桃而不食○人識其意○復贈二桃○又不食曰○親未及嘗此○不敢先食也○出遊壇舍○以文名朋友間○丙丁虜變後○作詩以見志○絶意場屋○年二十○以親命取己卯進士○後十年除齋郞○孝廟庚寅○中增廣文科○由槐院移侍講院說書○陞拜司諫院正言○言事不阿○大臣己不悅○又論尹○善道淫悖善道有師傅舊恩○上故遞公職○出爲平康縣監○治尙廉平○務祛宿弊○吏民大悅○明年以弘文館副修撰召入○邑人追思碑之○出入論思○多所啓沃○上嘗善公應製詩○賜貂帽以寵之○丁外憂制除○仍在玉堂○因天變進修省之戒○又嘗以諸駙馬留宿禁中○力陳其冒犯褻寫不可許○上嘉而入以語諸主曰○此雖汝曹所不欲○予實喜有此直臣在庭○諸臣皆如李某則○國事其庶幾矣○爲吏曹佐郞○公 不喜榮進○又不欲遽當極選○力辭得遞○乞養出監永同○而己又召還○自是連拜玉堂○諫院官○吏曹郞○兼帶三字銜○間受命廉察湖西○歸未幾○有東萊之命○庚子拜延安府使○以公延與江都形勢相關○上疏陳脣齒控路制之策○廟堂格不用○辛丑陞爲本道觀察使○適値歲儉○夙夜憂勤○凡所賑恤出於至誠○一境賴焉○七月以大夫人疾上疏乞歸○卽許之○公至則大夫人己勿藥○秀鬚角頰○淸明坦夷 無有畛域○外雖優餘○而內實彊毅○日必冠帶謁廟而退○正坐看書○夜以繼晷及通朝籍○久在經幄○常以格非爲要○歷試內外○所在盡心○以故主知人望特出等夷○居家推事親之餘○篤於宗黨○敎育孤維○恩意均洽○盖其行義不合於古人者鮮矣○雅性薄於世味○獨有山水癖○嘗夢遊一勝境○後於先兆下○得淸江公遺址○宛然夢中所見也○遂名以夢灘○而結草爲亭○仍取淸江詩語○名以綠水○盖歸意己決○而竟爲公永歸眞宅○嗚呼豈其兆耶○夫人徐氏○達城尉景女○忠肅公紺之孫○宣祖大王之外孫也○徵明進士爲士友所推○四女晦○沈權李世熙鄭重震韓世良也○內外孫○摠若干○余竊惟○公在東萊時○孝廟臨御則○必能用公之策○草禽校奴震罫○全島不貽吾君今日之憂○使公在於今日則○必能蓄銳出奇致力中原○以灑百世難雪之牌○亦必能正義住脚○以救今日滔天之士禍矣○夫豈泄沓林織而己哉○嗚呼上天不仁○龍馭莫攀○而宿譽九原之觀○終不可與歸矣○嗚呼可悲也己○嗚呼悲也○己銘曰麗祖逐鹿○太師效力○累公累卿○仍襲世德○逮于淸江○所立倬絶○公承厥緖○肉好無瑕○內積厥美○外震其華○茂實旣騰○出入具宜○上眷東梁○命公往治○雄圖未試○上聖厭世○豈惟未試○反以爲罪○天又閼年○半道而稅○奇意精忠○沒世猶晳○寡夏隆冬○輪葛之思○末路滔滔○吾誰與歸○綠水之亭○有峨有洋○公生而樂○公沒而藏○有寧一○宮旣安且藏凡厥後人○視我銘章○左議政宋時烈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