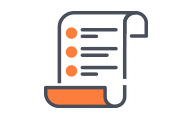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과 서문
공은 휘는 징명(徵明), 자는 백상(伯祥), 성은 이씨(李氏)로 본관은 전의(全義)이니, 고려 때의 태사 도(棹)의 후예이다. 세종 때에 이르러 효정공(孝靖公) 정간(貞榦)이란 분이 있었고, 선조 대에 이르러 5세조(世祖)인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휘 제신(濟臣)이 문무의 재주를 겸하였으나,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여 끝내 귀양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쳤다. 고조는 정자(正字)를 지냈는데 휘는 기준(耆俊)이고, 증조는 현령을 지냈는데 휘는 중기(重基)이고, 조부는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는데 휘는 행건(行健)이다. 부친은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휘는 만웅(萬雄)으로 문학과 행의(行誼)로 당대의 중망(衆望)을 받았다. 모친 서씨부인(徐氏夫人)은 달성위(達城尉) 경주(景주)의 따님이다.
공은 인조 26년인 무자년(1648) 11월 24일에 태어났다, 14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몹시 슬퍼하면서도 예를 다하였다.
계축년(1673, 현종14)에 사마시(司馬試)에 선발되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발언하고 토론할 때에 늘 좌중을 압도하니, 동류들이 경탄하여 받들었다. 갑인예송(甲寅禮訟) 이후에 정권을 잡은 여러 사람들이 송공 시열(宋公時烈)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감히 변호하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공이 이를 듣고는 조랑말을 타고 도성에 들어오니, 원근에서 앞을 다투어 모여든 자가 700여 명에 이르렀다. 송공을 위해 소장을 올려 억울함을 변호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공은 포의(布衣)로서 명망이 무거웠으므로 선배 제공(諸公)이 크게 기대하였고 김 청성(金淸城 김석주(金錫冑))은 늘 국사(國士)로 허여하였다.
공은 장신에 수염이 아름다워 신수가 훤하고 성품 또한 활달하고 쾌할하여 정성으로 남과 사귀었고 간혹 익살과 웃음도 섞였다. 그러나 지기와 절조만큼은 강직하고 굳세어 일을 만나면 곧장 앞으로 밀고 나가고 회피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허적(許積)이 국정을 맡아서는 마음속으로 더욱 공을 꺼려서 누차 말 가운데에 드러내었다. 당시 무함하여 죄를 주는 화(禍)가 두루 미치자 가솔을 이끌고 산협(山峽)으로 들어가 몸소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고생스레 봉양하였고 한가한 때에는 《논어》 등의 여러 책을 열심히 읽어 평소 잘못된 버릇을 고쳐 법도에 맞게 바로잡았다.
경신년(1680, 숙종6)에 이르러 천거로 도원 찰방(桃源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얼마 후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상기가 끝나자 또 천거로 의금부 도사와 귀후서 별제(歸厚署別提)에 연이어 제수되었다.
갑자년(1684)에 문과에 급제하여 창방(唱榜)하기도 전에 예조의 낭관에 제수되었다. 병조의 낭관으로 이배되니, 병조의 장을 맡은 자가 공의 말을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 정언으로 이배되었다가, 어사가 되어 북로(北路)를 염문(廉問)하고 돌아와 다시 정언이 되었다. 지평으로 천전되어 윤세기(尹世紀) 부자(父子)가 몸가짐이 청렴하지 않고 또 대각을 모욕하였다고 논핵하였다. 옥당에 들어가 수찬이 되었다. 당시 상이 막 탈상할 때였는데, 능에 배알하고나서 그 길로 서교(西郊)에 가서 열무(閱武)하니, 공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양암(諒闇) 중에 계시다가 이제 막 탈상하셨으니, 선왕을 사모하는 마음에 의당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실 터인데 예가 끝나자마자 출발하여 고취(鼓吹)를 울리고 몸소 군기(軍旗)를 잡아 군사들이 서로 말을 내닫게 하시니, 신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노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파하였다. 수찬과 부수찬이 된 것이 두 번이었고 부교리가 된 것이 네 번이었다.
병인년(1686, 숙종12)에 지진으로 인해 임금이 자책하고 구언(求言)하였는데 공이 소장을 올려 경계하기를, “바라건대 곤전(坤殿)을 권면하여 외가를 산칙하기를 명덕마황후(明德馬皇后)가 했던 것처럼 하게 하소서.”1) 하고, 또 여알(女謁)을 논하여 아뢰기를, “말을 듣는 통로가 바르지 않으면 와서 찬소하는 길이 쉬이 열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길이 이미 넓으면 병을 조심하는 뜻이 쉽게 풀어집니다.” 하였으니, 대개 그 뜻이 곡진하여 분명히 가리키는 바가 있었다. 상소가 올려지자 상이 대노하여 공을 불러 은대(銀臺)에 이르게 하여 여러 승지로 하여금 면전에서 힐책하게 하였다. 당시 상의 진노가 매우 커 보는 자들이 사색이 되었으나 공의 대답은 더욱 개절하여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김창협(金昌協 )이 공을 죄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상이 더욱 노하여 삭탈관직(削奪官職)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하였다. 이에 대신과 삼사가 교대로 간쟁하였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참 뒤에 공을 위해 말하는 자가 많아 마침내 서용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주의(注擬)한 내외의 관직에 모두 등용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충원 현감(忠原縣監)에 제수되었다. 충원은 주(州)에서 현(縣)으로 강등된 고을로서 충청과 영남의 사이에 끼어 땅이 크고 풍속이 사나워 투송(鬪訟)하기를 좋아하였다. 공이 부임하여 간리(奸吏)를 다스려 엄히 처벌하니 금령(禁令)이 행해지고 백성이 원망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창고를 열어 기민(飢民)에게 진대(賑貸)한 죄에 걸려 체포되어 면직되었다. 이윽고 서용되어 검상(檢詳)이 되었으며 부교리로 이배되었다. 장 귀인(張貴人)의 어미가 가마를 타고 대궐에 들어오자 대관(臺官)이 수레를 불태우고 종을 매질하였다. 상이 노하여 법리(法吏)를 장살(杖殺)하니, 공이 청대(請對)하여 극언하기를, “여염의 천부(賤婦)가 자주 금중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 뒤에 재이(災異)로 인하여 나아가 아뢰기를, “《대학(大學)》에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반드시 그 집안을 먼저 다스린다.’라고 한 것은 집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함을 보인 것이니,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이에 더욱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침묵하였으니, 이는 공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발언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국이 크게 변하여 신하들이 죽기도 하고 귀양 가기도 하였는데 공 역시 남해(南海)의 군산(群山)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저습하여 장기(瘴氣)가 많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였으나 공은 상쾌한 것처럼 거처하였고 귀양 가 있던 6년 동안 일찍이 한번도 친구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갑술년(1694, 숙종20)에 방축(放逐)되었던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돌아왔고 공도 용서를 받고 돌아왔다. 이조 좌랑이 되어 아뢰기를, “근세에 인재의 등용에 있어 선발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하는 초기에는 의당 호오(好惡)를 분명히 하고 공도(公道)를 넓혀야 합니다.”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노여움으로 조정이 시끄러웠다. 수찬으로 이배되었다가 다시 이조 정랑이 되었으며, 교리, 응교, 집의, 사복시 정, 사간 겸사서(兼司書)로 천전되었다. 이해 겨울에 동역(董役)에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관례대로 통정대부로 작질이 오르고 예조참의가 되었다. 동부승지가 되고 우부승지로 천전되었으며, 이조 참의로 이배되었으나 사직하여 체면(遞免)되어 예조 참의가 되었으며 대사간으로 이배되고 외직으로 나가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지독한 흉년을 만나 굶어 죽는 자가 여기저기서 속출하자 심력을 다 기울여 피폐한 백성들을 보살폈다. 5두(斗)의 별수미(別收米)2)를 혁파하고 어장(漁場)에서 거두는 세금을 금단하여 그 이익을 백성들에게 주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여 도로에서 손뼉 치고 환호하였다. 군읍(郡邑)을 순행(巡行)할 때 제공받는 음식을 줄이고 또 녹봉을 쪼개어 진휼하는 데 보태었으니, 그 뜻이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추위에 떠는 자를 따뜻하게 해주는 데에 있었다. 도망하여 떠도는 자들을 안집(安集)시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소를 가진 자에게는 빌려 줄 것을 권장하고 자량(資糧)이 없는 자에게는 관아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여 그 실적을 기준으로 포상하고 처벌하였으며, 또 5개 성(城)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리고 아울러 설치할 방략(方略)을 논하여 올렸다. 일찍이 일도(一道)의 민폐를 진달하여 변통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후에 걸쳐 누차 청하였으나 대부분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였다. 감사로 있은 지 1년 만에 백성들이 병통을 호소하지 않게 되었으며 떠난 뒤에는 군읍에서 추사비(追思碑)를 세운 곳이 10여 곳이었다. 해서(海西)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 다스린 자를 꼽자면 100년 이래로 공을 으뜸으로 친다.”하였다. 내직으로 들어와 판결사(判決事)가 되었고 다시 이조 참의가 되었다. 사인 김간(金榦)이 평소 학문이 있었으므로 공이 김간을 의망하여 벼슬에 제수되었는데 장령 유중무(柳重茂)가 김간이 가합하지 않다고 논했하였다. 이에 공이 농담조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 아무개는 참으로 유자(儒者)를 업신여기고 현자(賢者)를 시기하는 자이니, 원악지(遠惡地)로 내쳐야 한다.” 하였는데, 유중무가 이를 듣고 스스로 상에게 소명하니, 상이 노하여 공이 멋대로 천단(擅斷)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다. 이 때문에 파직되었다. 한참 지난 뒤에 어떤 이가 공을 위해 말을 하니, 상 또한 깨닫고서 즉시 대사성에 배수하고 다시 이조에 제수하였으나 모두 극력 사양하였다. 대사간이 되고 비변사 제조를 겸하였다.
이에 앞서 중궁(中宮)을 폐립(廢立)할 때에 이를 연경(燕京)에 청하였다. 그래서 서장관(書狀官)으로 다녀온 권지(權持)를 논상(論賞)하여 자급을 올려 주었다. 권지는 행실이 좋지 않아 중론이 허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이 전조에 있을 때에 일찍이 그가 청현직(淸顯職)에 오르는 길을 막았다. 그런데 공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이돈(李墩)이 이어받아 권지를 은대에 의망하자 낭관이 난색을 표하고 듣지 안았다. 이때에 이르러 공이 상소로 이 일을 논하고 아울러 이돈도 잘못이 없을 수 없음을 말하였는데, 비지가 매우 준엄하였다. 이에 공이 대각에 나아가 스스로 논열하였다. 이어 윤항(尹伉)이 소장을 올려 공을 비난하였으나 상이 그 음험한 마음을 살펴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은 늘 말하기를, “당론(黨論)이 종식되지 않으면 나라 또한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는 섶을 안고 불길에 뛰어들어 그 기세를 조장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평소 미워하는 자라도 편당(偏黨)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을 원망하는 자가 공을 가리켜 패를 갈라 당파를 세웠다고 하자 공이 다시 소장을 올려 변백(辨白)하기를, “신이 전랑(銓郞)으로 있을 때가 마침 갑술년(1694, 숙종20)이었습니다. 신의 말이 너무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 원망을 사는 것이 날로 깊어져 거의 온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었으니, 신의 처지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마침 관서 방백이 공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객사(客使)가 국경에 당도하자 공이 승진하여 가게 되었다. 호령이 분명하고 엄정하였고 사송(詞訟)을 명확하게 처리하여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판결하니, 적체된 안건이 없었다. 서로(西路)는 중국, 오랑캐와 접경을 이루어 방비가 중요하므로 재물을 많이 축적해 두고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였는데 무사한 날이 오래도록 이어지자 법이 또한 이완되어 큰 장사치가 침탈하고 빌려가서 축적해 둔 것이 텅 비게 되어 관(官)은 빈 장부만 끌어안고 있었다. 좀 정돈하여 다스리려면 헐뜯는 말이 들끓어 오점을 남기기 일쑤였으므로 도를 안찰하는 자가 완전히 손을 놓고 감히 힐문하지 못하였는데 공이 호장(豪强)하고 교활한 무리들을 엄히 단속하고 묵은 빚을 독촉하여 징수하니, 곳간이 차고 재물이 남아돌았다. 역관배(譯官輩) 몇 명이 객사의 위세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불법을 자행하고는 공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다. 서리가 체포하지 못하자 상금을 내걸고 체포하여 죽이니, 몇 달 사이에 위엄과 명성이 크게 떨쳐져 온 도가 숙연해졌다. 흑자가 양서(兩西)의 정사가 관대하고 엄한 정도가 같지 않았던 것을 의아해하니, 공이 말하기를, “해서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고 있었으니, 어루만져주기도 바쁜데 어느 겨를에 위엄을 쓰겠습니까. 관서에 이르러서는 습속이 교활해서 남에게 뒤질 세라 이익을 좇고 법에 저촉되는 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축적해 둔 군량을 갉아 먹고 밖으로는 포악과 위세를 빌리고 있었으니, 이런데도 느슨히 대한다면 법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당시에 강외(江外)에 개시(開市)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공은 불가한 일이라고 여겼으나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 병이 나 해직을 청하여 들어와 형조 참판이 되었고 예조로 이배되었다. 대사성에 배수되었으나 힘껏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직으로 나가 경기 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인 기묘년(1699, 숙종25) 봄에 옛 병이 다시 도져 친하게 지내는 의원이 처방을 올렸는데 공은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선친께서는 덕이 훌륭하셨지만 향년과 지위가 덕에 미치지 못하셨다. 나는 선친과 같은 덕이 없으면서 얻은 것은 도리어 지나쳤다. 이미 충분한데 병을 치료해서 무엇 하겠는가.” 하였다. 두 번 상소하여 해직되었다. 병이 위중해지자 아우에게 주는 시를 즉석에서 지었는데 정신이 혼몽하지는 않았다. 자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청하자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평온하다. 죽음은 슬퍼할 바가 아니다. 다만 평소 풍수(風水)의 설을 좋아하지 않은 데다 재물을 탕진해 가며 후하게 장사 지내는 것은 또한 고인이 기롱한 바이니, 단지 평상복으로 염을 하고 관은 얇은 판자를 써서 선영 곁에 묻으라. 이와 같이만 하면 된다.” 하였다. 2월 13일에 정침(正寢)에서 별세하니, 향년 52세였다. 이에 4월에 양근(楊根) 고동산(古同山) 축좌(丑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젊어서부터 지기와 절조가 있었다. 스스로 자부하여 용렬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며 성품 또한 분명하고 과감하게 일 처리가 민첩하였다. 대체(大體)를 견지하여 미세한 것은 도외시하였으며, 천리(天理)에 맡기고 사소한 데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확고히 지조를 지켜 남이 그 뜻을 꺾지 못하였다. 전후로 대각에 있을 때에 임금 앞에서 일을 논하면서 굽히는 바가 없었고 남과 교제할 때에 가차 없이 면전에서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런 까닭에 조정에서 벼슬한 10년 동안 누차 배척을 당하였으나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이르기를, “절의를 위해 죽는 선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임금의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과감히 간쟁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하였는데 공과 같은 사람이 이에 가깝지 않겠는가.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매우 독실하였다. 일찍 양친을 여읜 것으로 인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과부가 된 누이가 있었는데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늘 보살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그 두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누이가 죽었을 때에는 슬퍼하며 친히 염하고 장사를 지냈다. 아우와 이웃집에 살면서 조석으로 함께 거처하였고 종형(從兄)이 죽자 그 집안을 두루 보살펴 장가들이고 시집보내는 것을 때를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2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 덕수(德壽)는 진사로서 자질이 준수하고 문장이 뛰어나고, 덕해(德海)는 어리다. 딸은 심봉의(沈鳳儀)에게 시집갔다.
세당이 공과는 3대에 걸친 교분이 있다. 지금 덕수가 행장을 갖추어 비명을 부탁하였는데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행장에 의거하여 차례로 기술하고 그 끝에 시를 붙인다. 시는 다음과 같다.
이씨의 가문에 / 李氏之世
대대로 명신이 나왔네 / 世宥名臣
강직한 청강공은 / 亢亢淸江
희대의 위인이나 / 希代偉人
지기 매섭고 행실 우뚝하여 / 志烈行獨
버림받은 채로 생을 마쳤네 / 放棄終身
석계공은 맑고 고아하니 / 石溪淑雅
온화함이 봄바람 같았으나 / 溫其如春
끝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 展施不卒
암혈의 봉새요 숲 속의 기린이었네 / 穴鳳藪麟
이에 어진 후손에게 음덕이 스며 / 玆洎賢嗣
재능이 범인을 훨씬 뛰어넘었으니 / 逈超常倫
과감히 행하는 데에 용감하여 / 勇於敢爲
걱정하며 머뭇거리지 않았네 / 慮不逡巡
일찍 화현직에 오르고 / 早登華塗
창성한 때를 만났으나 / 際遭昌辰
바른말은 용납되기 어려운 법 / 諤諤鮮合
중간에 곤액을 당하였네 / 中憂難屯
섬에서 귀양살이하던 여섯 해 동안 / 海島六年
그 순일한 절조 흐려지지 않더니 / 不漓其醇
조정에 복귀함에 미쳐서는 / 逮玆環復
크게 굽혔던 것 폈다네 / 大屈用伸
해서와 관서를 안찰할 때에 / 撫海臨關
위엄을 보이고 인자함을 베풀었으니 / 赫威煦仁
관용과 위엄은 베푼 것이 달랐으나 / 寬猛施異
그 다스림은 실로 같은 것이었네 / 爲治實均
우러러 입은 지우에 보답하여 / 仰報知遇
선발한 뜻 저버리지 않았으니 / 無負選掄
내가 보기에 어진 이분은 / 我觀斯賢
조정의 훌륭한 보배였네 / 曰惟席珍
솔개가 구름 위를 날 듯 / 鵰鶚翔雲
세속에 물들지 않았으며 / 不染埈塵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날아가니 / 凌風遐逝
가을 하늘만 온통 푸르구나 / 萬里霜旻
지금은 이런 분 만나기 어려우니 / 今時難覯
옛날의 적절한 신하에 가까웠다네 / 古直與親
누가 믿고 누가 좋아하는가 / 孰信孰好
아름다운 빗돌에 명문을 새기노라 / 載銘貞珉
|
<註> |
|
1) 명덕마황후(明德馬皇后)가 했던 것처럼 : 명덕마황후는 후한(後漢) 대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의 딸로 명제(明帝)의 후비(后妃)가 되었는데, 부덕(婦德)이 매우 훌륭하였고 친정 사람들이 조정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다. 명제가 죽은 뒤에, 《명제기거주(明帝起居注)》를 자찬(自撰)하면서, 친정 오라비 마방(馬防)이 의약(醫藥)에 참여한 일을 삭제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선제(先帝)가 후궁(后宮)의 친정과 가까이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이다.”라고 하였으며, 장제(章帝)가 외삼촌들에게 봉작(封爵)하려 하자 허락하지 않았다. 《後漢書 卷10 明德馬皇后紀》
2) 5두(斗)의 별수미(別收米) : 별수미는 당초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를 마련하기 위해 1결(結)당 5두의 쌀을 별도로 거두던 것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면서 차츰 혁파되었는데 황해도의 경우는 모문룡(毛文龍)의 요구와 강도(江都)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때까지 혁파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肅宗實錄 9年 3月 24日》
|
|
|
京畿道觀察使 諱 徵明 神道碑銘 幷序
吏曹判書 朴世堂 撰
公諱徵明 字伯祥 姓李氏 全義人 高麗太師棹之後也 至世宗時 有孝靖公貞幹 至宣祖時 五世祖咸鏡北道兵馬節度使諱濟臣 有文武才 亢直不容於朝 卒謪斥以終 高祖正字諱耆俊 曾祖縣令諱重基 大父同知中樞府事諱行健 父黃海道觀察使諱萬雄 文學行誼 負望一世 母徐夫人 達城尉景女 公以仁祖二十六年戊子十一月二十四日生 年十四 丁外憂 哀戚盡禮 癸丑 選上庠 出游賢關 發言吐論 常屈一坐 儕流推伏 甲寅後 當國諸人 欲殺宋公時烈 無敢辨者 公聞之 款段入城 遠近爭集 會者至七百餘人 爲宋公抗章訟冤 不能得 公以布衣名重 先輩諸公 深相期與 而金淸城每許以國士 公長身美髥 神采燁然 性又開爽 推誠與人 間以諧笑 然志節落落 遇事直前 無所回避 人多側目 許積當國 心尤憚之 屢形於言 時羅織禍遍 挈家入峽 服力畎畝 勤苦爲養 暇則益讀論語諸書 砭治夙習 俛就繩墨 至庚申 薦授桃源察訪 不就 俄遭內艱 制除 又用薦連除義禁府都事 歸厚別提 甲子 擢文科 未唱名 除禮郞 改兵郞 長夏官者聽於公以從事 改正言爲御史 廉問北路 還復爲正言 轉持平 劾尹世紀父子持身不謹潔 又詆詬臺閣 入玉堂爲修撰 時上新免喪 因拜陵閱武西郊 公進曰 殿下諒闇纔畢 雨露之感 宜不勝怵惕 而禮畢就路 鼓吹發音 躬秉戌麾 介士交馳 臣謂此非其時 上怒變色而罷 爲副修撰 修撰者二 爲副校理者四 丙寅 因地震 責躬求言 公進疏陳戒 願勉戒坤聖飭厲外家 如明德馬后 又論女謁曰 聽言之階不正 而來讒之路易啓 致傷之道旣廣 而愼疾之意易弛 蓋其意縷縷有所指 疏入 上大怒 削職黜外 於是大臣三司交爭 皆不能得 久之 以爲言者多 乃敍還 然擬注內外 皆不用 最後除忠原縣監 忠原降州爲縣 介於湖嶺 地大俗悍 喜鬪訟 公至治奸吏嚴科 禁令行而民不怨 坐擅發倉貸飢民 就逮免 已而 敍爲檢詳 改副校理 張貴人母乘輧入闕 臺官楚轎榜奴 上怒杖殺法吏 公請對 極言閭閻賤婦不宜數入禁中 後因災異 進曰 大學言治國必先齊其家 所以見家之不齊 則斷不可以治其國也 願明主加意 上黙然 知公有謂而發也 未幾 時事大變 諸臣或死或竄 而公亦謫南海, 群山 湫惡多瘴 人所不堪 公處若淸涼 在謫六年 未嘗作知舊書 甲戌歲 諸放逐者次第召還 公蒙宥歸 授吏曹佐郞 謂近世用人 多不實選 更化之初 宜明好惡恢公道 由是怨恕囂然 移修撰 還吏曹正郞 轉 校理, 應敎, 執義, 司僕正, 司諫, 兼司書 其冬 以董役勞 例進秩通政 爲禮曹參議 爲同副承旨 轉右副 移吏曹參議 辭褫爲禮議 改大司諫 出爲黃海道觀察使 値歲大殺 餓死相望 憊心罷精 惠恤殘氓 罷五斗之租 禁漁場之稅 以利與民 民大歡欣 抃於道路 巡行郡邑 捐削廚供 又割俸補賑 在濯痍煦寒 綏集流逋 使得安業 其有牛者 勸相假借 無資糧者 官爲之助 視以爲褒黜 又圖寫五城形便 兼論設置方略以上 嘗陳一路民弊 合思通變者 前後屢請 多格不行 居一年而民不告病 旣去則郡邑之立石追思者十數 海西人言按治之善 百年而來推公爲首 入爲判決事 還吏曹參議 士人金榦素有學術 公擬榦官得除 而掌令柳重茂劾榦不合 公戲語人曰 柳眞侮儒妬賢者 當斥之遠惡地 重茂聞之 自訴於上 上怒 疑公專擅 坐是罷 久之 有爲公言者 上亦悟 卽拜大司成 復還天官 皆力辭 爲大司諫 兼籌司提調 始中宮廢立 請于燕京 書狀權持論賞陞資 持自處未善 衆論不與 公在銓 嘗泥其淸塗 公去而而墩繼之 擬持銀臺 郞官難之而不聽 至是 公疏論此事 並及墩自不能無失 批旨極嚴 公詣臺自列 繼有尹伉上章詆公 上察其傾險斥不受 公常言黨論不息 國亦必亡 吾不欲抱薪助爇 故雖素忌疾者 亦不敢目之以偏私 至是 怨公者指謂分門樹黨 公又疏辨 言臣爲銓郞 適當甲戌 綠臣語鋒太銳 招怨日深 幾使日世 擧爲仇敵 臣之蹤跡 安得不危
會關西方伯缺 而客使壓境 公進秩以行 號令嚴明 詞訟淸理 耳受口判 案無滯牘 西路界接夷夏 邊防所重 廣蓄金幣 以備不虞 無事日久 法亦縱弛 豪商大賈 侵漁假貸 儲偫一空 官擁虛薄 稍欲整治 謗言騰扇 動受玷汚 按道者斂手不敢致詰 公嚴束豪猾 徵督宿負 庫豐財羨 小譯數人 憑藉客使 私爲不法畏公逃匿 吏不能得 購捕戮之 數月間 威聲大震 一路肅然 或疑兩西之政 寬猛不同 公曰 海西之人 飢餓困敝 阽於死亡 拊摩是急 何暇用威 至於關西 俗狡猾 赴利如馳 觸法不忌 內削軍儲 外假暴威 此而可弛 安所用法 時議開市江外 公意不可 知不能止 會疾作乞解 入爲刑曹參判 移禮曹 拜大司成 力辭不就 俄出爲京畿觀察使 明年己卯春 舊疾復作 親醫進方 公不許曰 吾先子德茂年位不稱 吾無先德 所獲反過之 旣亦足矣 治疾何爲 再疏解職 疾已殆 口占寄弟詩 神識不亂 子弟請所欲言 曰 吾胸中坦然 死非所慼 顧素不喜風水之說 糜財厚葬 亦古人有譏 但斂以時服 棺用薄板 歸祔先隴 如斯而已 二月十三日 終于正寢 壽五十二 是年四月 窆于楊根古同山負丑之原 公少有志槩 自標擧不肯碌碌卑下 性又明決果斷 敏於辨事 存大體而略微 信理命而遺滯累 執守堅確 人不可奪 前後處臺閣 論事上前 無所屈撓 與人交 面斥過失 不少饒 立朝十年 屢遭挫揠 終未嘗悔也 南軒謂欲知伏節死義之士 當求之犯顔敢諫之人 若公者 不亦殆於是乎 居家孝友篤至 以早失二親 身不服采 有寡妹 通共有無 不使匱乏 敎其二子 靡憚動勞 死則哀傷而親斂葬之 與弟連屋 朝夕與處 從兄沒而經理其家 男娶女嫁 俾不愆時 有二男一女 男德壽 進士 明秀有文 德海幼 女適沈鳳儀 世堂於公有三世之懽 今德壽具狀屬銘 不敢辭 據狀敍次 系之以詩曰
李氏之世 世宥名臣 亢亢淸江 希代偉人 志烈行獨 放棄終身 石溪淑雅 溫其如春 展施不卒 穴鳳藪麟 玆洎賢嗣 逈超常倫 勇於敢爲 慮不逡巡 早登華塗 際遭昌辰 諤諤鮮合 中憂難屯 海島六年 不漓其醇 逮玆環復 大屈用伸 撫海臨關 赫威煦仁 寬猛施異 爲治實均 仰報知遇 無負選掄 我觀斯賢 曰惟席珍 鵰鶚翔雲 不染埈塵 凌風遐逝 萬里霜旻 今時難覯 古直與親 孰信孰好 載銘貞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