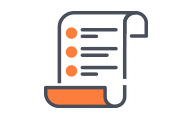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과 서문
숙종 갑술년(1694)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복위된 후 병조 판서 서문중이 세자의 생모인 장희빈을 폐출하는 문제는 다시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기를 왕께 청하였다. 마침 그 때 돈령부에서 상소하고자 하니 모든 재상들이 좋다고 붙쫓기만 하였다. 이공 징하는 그때에 포의(布衣)이며, 문종文宗에게는 친당인데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놀라 가서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하였으나 끝내는 듣지 않더니, 과연 이일 때문에 죄를 얻었고, 의리를 앞세웠다는 주장도 사헌부의 논란거리가 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는데 이때 여러 어진 선비들이 공의 견식(見識)이 보통 사람보다 몇 등급 윗길이라고 칭찬하였다. 공이 이해 벼슬길에 올라 내시 교관을 거쳐 장악원(掌樂院) 주부로 옮겼으며, 이 뒤에 의금부 도사•평시서 영平(市署令), 세자위솔(世子衛率), 사복시 판관, 선혜랑 등을 거쳐 다시 장악원에 들어가서 첨정이 되어 악보를 이정(釐正)하고, 왕께 그 내용을 주달하였는데 그 공적은 공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외직으로는 연안•밀양•회양•무주의 4개부府와 청주•공주•황주의 3곳 목사를 거쳤는데, 황주에서는 일찍이 통판이 되었을 때 지방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친히 소학 가례(家禮) 등 여러 책을 가르쳐서 수년 사이에 유교가 크게 일어났었는데, 나중에 두번째로 부임하니 때마침 큰 흉년을 겪고 있어 온 정성을 기울이어 구호(救護)한 결과 백성들이 굶주리기는 하였으나 굶어죽는 일은 없었다. 방백이 포상(褒賞)을 내신하였더니 통정대부로 승진되어 돈령부 도정, 조사(曹司)의 위장(衛將)이 되었고, 그뒤 가선대부(嘉善大夫)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실전어인(實篆御印)을 잘한 때문이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된 것은 아들 덕부가 시종이 된 까닭에 추은증직(追恩贈職)으로 된 것이다. 이어서 동지 돈령부사,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로 있다가 정미년(1727) 9월17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73세이었다. 뒤에 그 아들 덕재가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으므로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관으로 추증되었다.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집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탐묵선사(貪墨善事) 탐관오리(貪官汚吏) 짓을 하여 상관을 잘 섬김으로 관직을 얻는 것보다 더 더럽고, 이런 것은 도적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위생렴(威生廉) 정성근(政成勤)』의 여섯 자를 써서 벽에 붙이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공의 치적의 바탕은 바로 이 여섯글자가 근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매양 관직이 갈리어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가인이 무엇인가 가져 왔는가를 눈치보며, 혹시 사실을 감추고 할 말을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집안 백여 식구가 내가 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살아온 지가 수십년이다. 나라의 은혜가 이와 같은데 감히 재물을 저축하여 뒤로 남겨 줄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대체로 공이 행정을 함에 있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왔으며, 그 근본의 원천은 바로 효제(孝悌)였다. 6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슬퍼하는 양이 어른같았었고, 어머니께서 자주 앓으시었는데 좌우에서 부축하여 모시고 약시중이나 음식들은 반드시 손수 마련하여 드렸는데 이렇게 하기를 수십년이 하루 같았다. 병이 위독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었고, 거상(居喪)하는 3년동안 소과를 먹지 않으니 형인 참판공이 성질이 엄하고 급하여 때때로 꾸짓고 엄한 말로 나무라면 말없이 달게 받다가, 그 일을 잊을 만한 때에 조용히 경위를 말씀드리면 참판공께서도 또한 뉘우치시었다. 참판공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애곡하여 눈이 부을 지경이었고, 초종장례 등을 반드시 정성껏 그리고 절차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없었다. 형수에게도 예의를 깍듯하게 하니 형수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섬기는 정성이 그만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외가 선조의 묘가 수호되지 못하여 우마가 짓밟는 지가 몇 백년이 되었는데 공이 그 자손이 없음을 딱하게 생각하여 봉분을 다시 쌓고 비를 세우니 위선하는 정성의 돈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바이다. 지방관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사당의 제사 때나 여러 형제와 자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제사날을 기억하였다가 제수를 보태어 주니 은혜로운 뜻이 고루 퍼져서 멀고 가까움이 없었으니 내행가문을 다스리는 행동이 이처럼 구비하였다.
공의 자(字)는 계상(季祥)이고 전의(全義)사람이니, 고려 태사 도(棹)의 후예이며 이조에 들어와서 명인이 많았는데, 청강공 휘 제신(濟臣)에 이르러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 분이 바로 공의 5대조이다. 고(考)는 휘(諱)가 만웅(萬雄)이니 관찰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선조의 부마인 서경주(徐景)가 바로 그 외조이다. 공은 부인을 두번 맞이하였는데 송강 정상국의 증손이 되는 보연의 딸과 오음 윤두수(尹斗壽)의 증손이며 균(均)의 딸인 윤씨이다. 아들 덕부(德孚)는 승지이고, 덕재(德載)는 지평이니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지평으로 추증된 홍태유(洪泰猷)와 부사 윤봉소(尹鳳韶)에게 시집간 두 딸과 더불어 정씨가 낳은 바이고, 덕현(德顯)은 음보로 판관을 지냈다. 손자로는 원배(元培), 익배(益培), 낙배(樂培)가 있으며 외손으로서 이름이 두드러진 사람은 응교 윤심형과 정언 홍익삼(洪益三)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다.
공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중후하며 처사에는 정상하고 또 더욱 말주변이 훌륭하여 남과 사귀일 때는 정의가 곡진하여 사람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런 까닭에 노소와 잘난사람 못난사람 할것없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예학(禮學)에는 더욱 정수하였으니 현석(玄石) 박공 세채(世采)가 일찍이 공을 아껴 말하기를
예가의 의장(儀章)은 도수가 몹시 번거로와서 내가 아무 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바가 많다고 하였다. 또 전서의 글씨체의 깊은 이치를 깨달았는데 평하는 사람들이 근세에는 그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고, 의술에도 약간 깨달은 점이 있었으며, 천문에도 아는바가 있어 이따금씩 신기하게 맞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도무지 아는체를 하지 아니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항상 말하기를
『검소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사치하면 재앙을 부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이 이치는 털끝 만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식견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감탄하였다. 탕파의 페습을 가리는데에 무척 밝고 또 정확하였으니 이따금씩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역시 스스로 시비가리는 뜻을 감추지 못하는 구석이 더러 있었다. 승지 덕부께서 살아 있을 때에 재(縡)에게 대비의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지라, 내가 사양할 처지가 되지 못하여 드디어 다음과 같이 명을 엮는다.
옛날 들은 순량(循良)이란 공께서 내 보았네. 단아 화평 자상하고 정민하며 너그러워
십군(十郡)이나 다스려도 아전과 백성이 다 기렸네.
성심으로 아껴주고 비위(非違) 아주 미워해도,
선비도로 처리하니 간망이 있을손가?
이처럼 어려운 길 선음(先蔭)으로 밟았으니,
그래도 한탄없이 높게는 재상 계급,
이 또한 글과 붓이 남다른 공 상 불렀네.
재능 비록 많았지만 남보기에 모르는체,
인륜도의 밝은 이론(理論) 듣고나면 부끄럽네.
큰 행적만 골라 적어 후세(後世) 길이 알리려네
도암(陶菴) 이해(李縡) 지음
|
|
|
知敦寧公 諱 徵夏 神道碑銘 幷序
肅宗甲戌○仁顯王后復位○兵判徐文重○以張見廢○請更議大臣而處之○會敦寧府欲上疏○諸宰咸唯唯○李公徵夏○時布衣於文重爲親黨○聞而大駭○往見之○力言其不可○而終不聽○果以此得罪名義○及被臺論○始乃愧謝○君子謂公見識○高於人數等矣○公於是歲○筮仕○由內侍敎官○遷掌樂院主簿○是後歷義禁府都事○平市署令○世子衛率○司僕寺判官○宣惠郞○復入樂院爲僉正○釐正樂譜○提擧章奏○其蹟公讓而不居○外則延安密陽淮陽茂朱四府○淸公黃三州牧○而於黃則曾爲通判○擇邑子之秀○親授而小學家禮諸書○數年間儒敎浸興○及再至値歲大裙○單心佾賑○民饑而不死○方伯褒聞○陞通政○敦寧府都正○曹司衛將○其陞嘉善○及資憲○皆以寶篆書寫○而嘉義則○以子德孚侍從推恩也○連除同○知敦寧知敦寧府○以丁未九月十七日卒○壽七十三ㅍ後以子德載原從勳○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公嘗曰○居家要譽甚於貪墨○善事得官○無異盜賊○且書○威生廉政成勤六字於壁○以自警○公之治績○實本於是○每遞歸之夕○家人假貸以給○或疑其矯情則○笑曰百口待我而哺者○數十年矣○國恩如此○敢圖淚餘○以爲遺後計哉○盖公爲政○以愛民爲主○而原其本則孝悌也○六歲○孤哀毁如成人○母夫人善疾○左右扶將藥餌飮食○必手自調進○十數年如一日○比疾革○血指灌口○居喪三年○不食蔬果○兄判公○性嚴急有時遞責甚襄○而默然深受事過○乃從容開陳○判公亦悔○之及判公喪○哀哭目爲之瞳○送終諸節○必誠必愼○不一委於人○事邱嫂盡禮○嫂謂其子曰○爾曹事我亦不如也○外先之墓○樵牧不禁幾百年○公愍其無嗣○改其封而樹之碣○其篤於先可知○爲邑時○自蔿廟○以知諸兄弟子姪必遍致助祭之需○恩意周洽○無有遠邇行內之備如此○公字季祥○全義人○高麗太師棹之後○入國朝多名人○而至淸江諱濟臣尤著○於公爲五世祖考○諱萬雄○觀察使○吏曹判書穆陵駙馬徐公景其外祖也○公凡再娶○鄭氏松江相國之曾孫普衍女尹氏之考曰均○梧陰之曾孫○男德孚○承旨○德載持平○皆文科○與二女適曾持平洪泰猷○府使尹鳳韶者○鄭出○德顯蔭補判官○孫曰元培益培樂培○外孫之顯者曰應敎尹心衡○正言洪益三ㅍ餘不盡記○公爲人和厚○處事情詳○尤善於辭令○與人交○情義曲盡○不設畦畛○以是無老少賢愚○無不得其歡○於禮學甚精○玄石朴公嘗字公曰○禮家儀章○度數甚繁絮○吾因某而覺悟者多○又深得篆心法○論者謂近世罕倫○少解醫術○而於天文亦往往奇中○然退然若不知者○常曰儉而致福○奢能挺若○此理毫髮無差○人以爲有識之言○深病黨○習平居口不言論議○而至於是非○大頭腦處涇渭甚明○守之又敦確○往往見於言行者○自不能掩也○承旨在時○屬縡以大碑之文○義不能辭○遂爲之銘 銘曰 古聞循良○於公乃觀○愷悌慈祥○精敏平寬○十郡之治○吏民俱安○誠心惻芟○赤繪違干○緣飾儒術○此爲最難○低曰蔭路○未足爲歎○晩致卿秩○亦由筆翰○才藝雖多○自視等閒○灼見倫議○足羞彼顔○我最其大○昭示不刊○陶菴李縡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