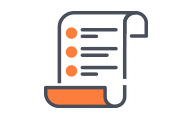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
|
묘비문
공의 이름은 신룡이요, 자는 몽득이니 전의 이씨이다. 고려 태사 도(棹)에서부터 득성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제신이란 어른이 벼슬이 북병사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세상에서 청강선생이라 일컫는다. 기준을 낳으니 승문원 부정자로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니, 이 어른이 공의 고조이시다. 증조의 이름은 후기이니 장악원 정正으로 이조(吏曹) 참판(叅判)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행진이니 이조(吏曹) 참판(叅判)으로 호는 지암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만상이니 벼슬은 통덕랑이다. 어머니는 죽산 박씨이니 통덕랑 영선의 딸이다. 공이 출생하기 전에 지암공의 꿈에 용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름을 신룡이라 하고 또 그 꿈을 상징하여 자를 몽득이라 하였다. 겨우 젖떨어지자 지암공의 슬하를 떠나지 않더니, 지암공이 돌아가실 때에 공의 나이가 10세이라 슬퍼하고 사모하는 품이 성인과 같았다.
계유년(1693)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후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어버이가 늙은 까닭에 스스로 면직하고 다시 동몽 교관에 제수되었다가 의금부 도사로 옮기었고, 장악원 주부로 승진되었다가 호조 좌랑으로 옮기었다. 외직으로 금천 현감이 되었다. 벼슬살이할 때에 청렴하고 근실하므로 아전이나 백성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신사년(1701)에 선혜 낭청에 제수되어 산릉의 보토하는 역사를 감독하는 일을 겸하였다. 다시 호조에 들어가 정랑이 되었는데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 말질할 때 떨어진 곡식을 잉미(剩米)라고 하여 많고 적은 비율에 따라 사용하였다. 공이 이것을 모두 친척 고구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하고 나머지는 아전과 서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적의 재산을 적몰한 것이나 일본 사람에게 싸구려로 판 것들을 여러 동료가 함게 거두어 싼값에 쟁취하였다. 이세백 상공이 그 행동을 매우 해연하게 생각하여 그 하인들을 구속하고 엄중 심문한 결과 오직 공만이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였다.
이공이 찬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이원외 만큼은 이런 추잡한 일에 간섭하지 않을 줄을 알았노라, 그렇지 않으면 이원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삭녕 군수로 제수되었는데 호조에서 계류(繫留)시키어 보내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부령 현감에 제수되었다.
병술년(1706)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고을 백성이 돈을 걷어서 부조하려고 하자 공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이 울면서 보내고 비를 세워 그 공덕을 기리었다. 탈상하자 사복시 주부에 제수되고 두어 달 만에 다시 아버지의 상사를 당하였다. 신묘년(1711)에 다시 호조의 낭관으로 상의원 첨정으로 옮기었다가 장성 부사로 나아갔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는데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구휼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구례(舊例)에 관용은 모두 서원(書員)에게 떠맡기어 값은 싸게 주고 물건은 많이 징발하였다.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관에서는 아전을 등쳐먹고 아전들은 백성들을 우려먹으니 이것이 사람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이에 곡식 수천 섬을 엽전으로 수백 꿰미를 바꾸어 별도로 창고에 넣어 저장하였다가 그 본전은 남겨 두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관용에 쓰게 하니, 백성들이 칭찬이 자자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에 부임한 사람도 이 제도는 고치지 못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빈털터리로서 장성의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정유년(1717)에 다시 삭녕 군수에 제수되었다가 다음해에 나주 목사로 이배되었는데 대관(臺官) 중에서 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늙어서 격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을 헐뜯어 말하였다. 공이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었다. 벼슬자리는 즐기어하지도 않는다. 이제부터는 세상 인연을 영구히 사절할 것이니, 먹고 살기 위하여 치사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하였다.
이해에 또 능주 목사로 제수되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한결같이 부임하기를 권하되, 공은 끝끝내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무술년(1718) 10월 10일에 서울집[京第]에서 세상을 떠나니, 수는 63세이었다.
공은 위인이 준엄하고 청렴하고 개결하여 가난하다고 하여 그의 집심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도 속임수가 없고 간간이 익살스러운 재담으로 재치가 가득하였다. 평생을 청렴결백을 신조로 하여 벼슬살이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공의 처제가 전에 그 재산 일부를 공에게 분재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그 제의를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옛날에 우리 선조 청강공께서 항상 자손들을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손된 사람들은 재물을 보기를 똥이나 흙과 같이 보라’고 말씀하시었다. 내가 어찌 이런 재물을 받아서 내 선조의 훈계를 저버릴 것인가? 하였다. 내외의 벼슬을 두루 거치는 동안 집에는 네 기둥만 덩그러니 서 있을 정도이었다. 돌아가신 뒤에 보니 장롱에 변변한 옷 한 가지가 없었다. 6일만에야 비로소 염습하기 시작하였다.
공의 족제되는 첨정 징성(徵成)이 전에 회양 군수를 지낸 유봉일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새 세상에 벼슬살이하면서 몸가짐이 깨끗하여 우리 무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는 오직 장성 족형이 있을 뿐이다. 유씨가 말하기를, 그대는 할 수 있을는 지 모르지만 나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공이 남의 장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나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뿐아니라, 어떤 때에는 마구 꾸짖으며 나무라니, 공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대체로 이런 성질에 기인하였다.
병든 어버이를 봉양하는데 효성을 다하고 계부(季父)를 아버지처럼 섬기며 동생 하나가 일찍 죽고 과부된 제수씨가 조카들을 키우는데 은혜와 의리로 그 조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내행의 독실함이 또한 이와 같았다. 숙인 능성구씨는 통덕랑 기(錡)의 딸인데 부드럽고 의젓하여 부도의 어긋남이 없었는데 공이 세상을 떠난 15년만인 임자년(1732)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공을 양주 문한산 지암공의 산소 옆에 모시었는데, 숙인이 죽자 태장리 간좌 자리에 공의 묘를 이장하면서 합장하였다.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덕로이다. 참판 박봉령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춘배이고 계취로는 유학 안상만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딸들은 유천령, 김석기, 민정점에게 시집갔다. 춘배는 교관 황민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버지께서 공과 동조(同祖)이었다. 찬성공께서 여러 동생 중에서 공을 더욱 믿음직스럽게 여기었다.
덕수가 어린 시절부터 공의 사랑을 받았는데 현재 옛일이 어제와 같이 눈앞에 선하다. 덕로가 공의 묘문을 부탁하므로 붓을 잡고 명을 쓰려니 눈물이 줄줄이 흐른다. 명하여 말하기를,
옛날엔 사대부라 하면
대체로 청백한 자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7할이고
그래도 오히려 3할은 후하게 준 것인데
이것은 다른 행실도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공의 행적은 내외를 통하여
효도와 우애로 가정을 채웠으니,
9할을 웃돈다 하여도 과하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
|
長城府使 李公 諱 臣龍 墓碑文
公諱臣龍○字夢得○李籍全義○自高麗太師棹始○我穆陵朝有諱濟臣○官北兵使贈領議政○世稱爲淸江先生○生諱耆俊○承文副正字贈左贊成○是爲公高祖○曾祖諱厚基○掌樂院正贈吏曹判○祖諱行進○吏曹判號止庵○考諱萬相○通德郞○騙竹山朴氏○通德郞榮先女○公之始生○止庵公夢有龍徵○遂名而字之○免乳○不離止庵膝下○及止庵公沒○公年十歲○哀慕如成人○癸酉○中司馬○翌年○除厚陵奉○以親老自免去○復除童蒙敎官○移義禁府都事○陞掌樂院主簿○遷戶曹佐郞○出爲衿川縣監○居官廉謹○吏民懷之○辛巳除宣惠郞兼董山陵補土之役○復入地部○爲正郞捧穀時○斛外溢墜者ㅍ謂之剩米○多少率私用ㅍ公盡散親故貧乏者ㅍ有餘○施及吏胥○逆産之籍入及倭貨斥賣者○諸僚輸廉價爭取○李相公世白甚該其爲○拘鞫人按査○唯公獨無所累○李公誕曰○吾固知李員外必如ㅍ此 不如此○惡足稱李員ㅍ外除朔寧郡守○地部啓留不遣○俄又除富平○丙戌○丁內憂○邑民斂錢致賻○公謝不受○民多泣送○又樹碑以追○思服局○除司僕寺主簿○數月又遭外艱○辛卯○復爲地部郞○遷尙衣院僉正○出爲長城府使○直歲飢○缸心賑救民以全活舊例○官用皆責書員○少與其直○而厚徵其物○公歎曰○官刻吏○吏刻民○是敎人而偸也○及以穀千餘斛錢數百緡○別爲庫貯之○存其本而取其剩○彭官用凡百○悉於是乎取○民大稱便○而後爲政者○亦不能改也○及歸○行含蕭然○乃無一南物○丁酉○復除朔寧郡守○翌年○移拜羅州牧使○臺官有麴公者○以老不堪劇論公○公笑謂子弟○吾老矣○吏役非所樂○從今當永謝世緣○無而具腹○累乃公爲也○是歲○又除綾州牧使○親舊交口迭勸○竟辭不赴○戊戌十月十日○終于京第○壽六十三○公爲人峻潔堅介○不以貧窮變其所守○與人交○輸發無所隱○間而諧笑○英華溢發○平生以廉白自○勵 不唯在官爲然○公之婦弟賞柝産以歸公○公貽書却之曰○昔吾先祖淸江公○常戒子孫○爲吾子孫○視財物當如糞土○吾豈受此○以孤吾先祖訓戒○乎歷職內外○而家徒四壁○及沒○敎無遺衣○六日始就斂○公之族弟僉正徵成○嘗語柳淮陽鳳逸○今世士大夫居官潔巳○爲吾用所當法○獨有長城族兄○柳曰○君則能乎○我則不○能 然公雖喜談人美○而亦不能容人之過○時或肆口奮罵○其所取怨○多在於此○奉病親○盡其孝養○事季父如父○一弟早亡館○維嫂畜孤姪○恩義備至○其內行之篤又如此○淑人綾城具氏○通德郞錡之女○柔嘉淑愼○甚得婦道○後公十五年任子四月二十五日沒○始葬公○楊州文翰山止庵公墓側○及淑人喪○改卜廣州胎藏里艮坐之原○移公墓合哮焉○有一男三女○男德老○娶判朴鳳齡○女生一男春培○繼娶幼學安相萬女○女適柳天齡金錫紀閔正漸進士○春培娶敎官黃旻女○先君子與公同祖贊成公○在諸弟中尤賢公○而德壽自在稚漏○又爲公撫愛○今追思如昨日事○德老以公墓文見托○操毫而不自知涕之流落也○旣序而銘○銘曰○古稱士大夫苟能淸白○便是七分人○其所以尙眉三 分者○抑由他行之未純○若公政術著乎內外○
孝友充於家庭○雖加許以九分○又孰譏其過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