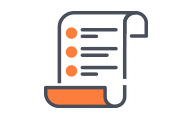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
영조 신해년(1731)에 이공 덕수로 삼관 대제학을 삼았다.
공이 재주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영조가 문형(文衡)은 경(卿)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취임하여 사무를 보라고 재촉하시었다. 이 사실은 정승 조문명(趙文命)이 추천한 것이니 당대의 인사로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
다음해 정월에 경종대왕(景宗大王) 행장(行狀)을 찬진하고 2월에 경종실록이 완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실록 찬수에 있어서 공이 아니면 이 일을 해 낼 사람이 없다 하고 공을 첨지 중추부사로 승직시키어 실록 당상관을 삼고 찬수에만 전력하게 한 까닭에 찬수 사업을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이다. 상이 교서관에 명을 내리어 여사서(女四書)를 인행하게 되었는데 공이 제조(提調)로서 한글로 번역하여 올린 것이었다. 이조 참판에 제수 되자 공이 소를 올려 나아가기 어려운 뜻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현재 용인하는 절차를 보면 갑(甲)에 딸린 무리는 하나도 버림이 없이 모두 등용하는가 하면을乙에 딸린 무리는 모두 버리는 것도 잘못이고 이와 반대로 을에 딸린무리는 빼놓지 않고 등용하는가 하면 갑의 무리는 모두 버리는 것도 또한 잘못이다. 이와는 달리 비율을 따져 분배하여 용인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직 그 마음을 비우고 그 학식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쪽 사람 저쪽 사람과 같이 편을 가르지 말고 오직 그 능력 위주로 등용한다면 이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하였다.
공은 본디부터 당론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그 말씀이 이와 같았다. 뒤에 마침 입시할 기회가 있어서 변두리의 수령 즉 남들이 모두 싫어하는 고을의 수령으로 갈 것을 자청하였더니 상이 그 질소 질박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외임(外任)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들어와서 호당(湖堂)에 들어갈 사람을 초계(抄啓)하라고 명하고 또 도당록(都堂錄)을 지으려 할새 공이 당론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문학의 우열로 준척을 삼았더니 이에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매우 많았다.
계축년(1733)에 송도(松都) 유수(留守)에 제수되었는데 상이 인견(引見)하시고 할 말이 있거든 거리낌 없이 말하라 하였더니 공이 공부를 하는 자세와 검소해야 한다는 뜻을 소상하게 말씀드리었더니 진실한 나라 사랑과 임금 사랑의 표본이라 하시고 오랫동안 칭찬하시었다.
이조(吏曹)ㆍ예조(禮曹)ㆍ병조(兵曹)ㆍ공조(工曹)의 참판(淙判)을 두루 제수하시었는데 오직 이조(吏曹)만을 인의(引義)하고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한번은 병조 참판으로 친정(親政)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상이 손수 시 한 수를 지으시었는데 『서로 돕고 화목하며 마음을 공정하게 가지라[共相寅協秉心公]』이었다.
여러 신하에게 화답하여 지어내라 하시고 공은 전에 문형을 지내었으니 특별히 절귀 한 수를 더 지으라고 명하시었다. 공이 입으로 외어 대답하니 그에 이르기를,
한 집안끼리 서로 도우라는 임금님 말씀
특별히 임금님 시로써 공정을 힘쓰라 하시네.
임금님의 깊은 걱정 열조와 같으시어
조신들이 이후로 다시는 동인이니 서인이니 이르지 말라.
이 말은 선조가 의주(義州)에 있을 때 지은 시 가운데 있는 말인데 앞으로 부지런히 힘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을묘년(1735) 사은 동지부사로 차출되었는데 중국의 재화는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오지 않고 오직 친근한 서책 몇 권뿐이었다. 다음해에 연경에서 돌아오니 상이 인견하시고 중국의 일을 물으시니 공이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도록 할 것, 인재를 수용할 것, 민심을 다독거릴 것, 이 세 가지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지경연으로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에 공이 귀가 먹어서 말을 주고 받을 수가 없으므로 상이 주서를 시커어 글로 써서 보이기를,
『한번 성했다 한번 쇠했다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당연한 이치라 하겠으나 한나라 당나라가 망한 것은 헌제와 소제의 죄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공이 아뢰기를, 『이치는 비록 그러하다 하겠으나 인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하고 이어서 어진 사람, 모진 사람, 무모한 사람, 깐깐한 사람을 가리지 말고 멀리 있는 인재도 찾아 내어 등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뜻을 베풀어 설명하고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인륜 도덕의 모범을 세우시어 탕평의 좋은 정치를 구현하려 하시면 더욱 더 이점에 유념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상이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도록 한다는 뜻을 비롯 여러 번 전조(銓曹)에 신칙하였지만 그저 자기가 친한 사람만을 기용하려고 할 따름이니 걱정이로다.』
공이 아뢰기를, 『가령 한나라나 당나라 때의 붕당이라고 하면 군자와 소인이 각각 스스로 붕당을 지어 인주가 다만 그 사정(邪正)만 잘 분변하면 그런대로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때와 달라 각각 족류(族類)로 한 편씩 갈리어 서로 공격하고 배척하곤 하는데 어찌 한편은 모두가 군자의 집단이고 한편은 소인의 집단일 수 있겠습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찌 쓸 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하고 계속해서 『고(故) 판서(判書) 서문유(徐文裕)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병이 들었는데도 약을 먹지 아니하고 남편을 따라 죽었으며 조남명(趙男命)의 딸 유씨(柳氏) 부인이 남편이 죽자 섶에 불을 지르고 불에 뛰어 들어 자살하여 죽었으니 이런 일을 중도(中道)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마땅히 정려(旌閭)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이 허락하시었다.
며칠 뒤에 또 주강을 행할 때에 공이 아뢰기를, 『주역의 64괘 중에서 오직 겸괘(謙卦)의 육효(六爻)가 모두 길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가득하면 덜리게 마련이고 겸손하면 이익이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인군의 도리는 모든 것을 검소하게 부족할 듯한 것이 겸괘에 해당합니다. 궁실이나 동산을 호사스럽게 꾸미고 자녀에게 진귀한 보화나 비단을 주어 즐겁게 하는 것은 스스로 통이 커야 하고 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모두 겸괘의 뜻과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이런 쪽으로 쏠리면 이것은 모두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몸을 해치는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상이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이시었다. 상이 석강(夕講)을 행할 때에 공에게 말하기를 『잇달아 경연(經筵)에서 아뢰는 것을 보면 경이 역상(易象)에 대하여 매우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괘효나, 단상(彖象)의 뜻을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기 바라네.』
공이 손사로 아뢰기를, 『신이 어찌 깊이 연구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번 읽어 본 것뿐입니다. 하도(河圖)니 낙서(洛書)니 하는 것은 좀 깊이 오묘한 이치를 연구하여 보려고 하였으나 끝내 투철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주역의 깊은 뜻을 십수조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주역의 공부는 이것뿐입니다.』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에 신선의 술을 매우 좋아하여 삼동계(○同契) 등에 관한 책을 여러 해 정독하였고 중년에 우연히 불어(佛語)를 보고 그 심학(心學)을 매우 사랑하여 때로는 영롱하고 투철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만년에는 사서삼경(四書三經)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주역 노자 등에 관한 공부는 투명체를 통하여 물건을 보는 것 같아 깊이 파고 들지를 못하였습니다.』
상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 『참 대단하구려. 이 세상에 있는 책을 아니 본 책이 없이 모두 보았다면서! 』
대답해 아뢰기를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 데 어찌 그것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18세 되던 해에 우연히 읽은 책을 계산해 보니 3000권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60이 넘었습니다. 그 뒤에 읽은 책이 4000권 이렇게 보면 신이 읽은 책이 7ㆍ8000권뿐일 것입니다.』
상이 탄하시기를 마지 아니하시었다.
전에 이광덕을 문형으로 추천한 일이 있었는데 장령 송시함이 공을 탄핵하기를, 『주권이 되었을 때에는 광덕과 같은 요사한 사람을 가리어 의발을 전하고 시험장을 관장하려고 하니까 현필과 같은 부도덕한 사람을 장원으로 뽑는 등 잘못한 일이 많으니 귀양 보내시기를 청합니다.』하니 공은 성에 나아가 대죄하고 대신이 또 아뢰기를 『이 아무는 충성스럽고 순박한 사람이라 백수지년에 어찌 당심이 있겠습니까?』 상이 본디부터 공의 순박하고 정직한 것을 아는 까닭에 특별히 위로하시고 여러 번 지중추 대사헌 등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응명하지 않았다.
나이가 기사(耆社)에 들게 되었을 때에 예조(禮曹) 판서(判書)를 제수하시었다. 이보다 전에 상의 명을 받아 오례의(五禮儀)를 수찬하고 또 속오례의(續五禮儀)를 편찬하여 올리었다.
대제학(大提學)으로 권점(圈點)할 때에 귀록(歸鹿) 조현명과 도암(陶菴) 이재가 모두 4점을 얻었는데 공에게 낙점이 되었다. 필경은 네 번 문형이 되니 국조에서는 택당(澤堂)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당시에 모두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여러 번 이조(吏曹)ㆍ병조(兵曹)ㆍ예조(禮曹)의 판서(判書)와 좌우 참찬을 지내었다. 상우(喪偶)한 뒤에는 임시로 동호(銅湖) 강사(江舍)에 머물러 있었다. 좌참찬에 제수되었으나 병체(病遞)하였다.
상이 세자를 보도(輔導)하는데 있어서는 노성(老成)하고 중후(重厚)한 사람이라야 된다 하여 여러 번 공에게 세자 보도의 책임을 맡기곤 하였다. 계해년(1743) 10월에 세자빈이 죽책문(竹冊文)을 제진(製進)할 일로 입성하여 그 일을 마친 뒤에 병을 얻어 영조20 갑자년(1744) 5월 27일에 성남(城南)의 동호(銅湖) 우거지에서 운명하였으니 곧 영조 재위 20년이었다. 양평군 서종면 수회리 갑좌 자리에 장사지내었으니 이 곳이 선영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공의 방손인 강로(江魯)씨와 천호(天浩)씨가 내게 대비(大碑)의 명(銘)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에 여러 번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삼가 이 명을 쓰게 되었노라. 삼가 그 글을 다음과 같이 쓰련다.
공의 자(字)는 인로(仁老)요 서당(西堂)은 그 호(號)인데 또 벽계(蘗溪)라고도 한다. 이씨는 본관이 전의(全義)이니 고려조 때의 태사(太師)로서 휘(諱)는 도(棹)라 하는 어른이 그 시조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휘 정간(貞幹)이라는 어른이 계시었는데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났었고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5세를 전하여 휘 제신(濟臣)이요, 호를 청강(淸江)이라 하는 어른이 벼슬은 북병사로서 문ㆍ무재를 모두 갖추어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 이 어른이 공의 6세조이다. 고조(高祖)의 휘는 중기(重基)이니 생원으로 현령을 지내었고 둘째 아들 우의정(右議政) 행원(行遠)이 귀하게 된 까닭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증조(曾祖) 휘 행건(行健)이니 진사로 문과하여 벼슬이 동지 중추부사로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할아버지 휘는 만웅(萬雄)이니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黃海) 감사(監司)이었는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아버지의 휘는 징명(徵明)이니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참판을 또 삼도(三道) 방백(方伯)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청송 심씨이니 좌찬성을 추증한 약한(若漢)의 딸이다. 공은 현종 계축년(1673) 7월 30일에 태어났다. 젖먹이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글도 함게 익히어 8세 때에는 이미 통감ㆍ사기ㆍ소학 등서를 통달하였는데 두 번째 중병을 앓고 난 뒤에는 그대로 귀머거리가 되었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은 선공(先公)의 친구이다. 한 번은 편지왕래가 있었는데 집으로 찾아갔더니 판서공은 마침 집에 없고 공이 곧 그 답장을 썼는데 농암이 답서를 보고 그 기상과 문리가 범상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소매에서 붓과 먹을 꺼내어 주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다음에 나의 묘문을 써 다오. 이 붓과 먹은 내가 너에게 그때 써 줄 묘문의 폐백으로 주는 것이라』하였다.
배위 최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공이 스스로 그 묘지문을 지었는데,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은 문장을 감식하는 안목이 당시에 뛰어나서 경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이 지은 지문을 보고 놀래어 말하기를, 이 글이야말로 쇠세의 문장 기백이 아니다. 옛날의 문장가에서도 이와 같은 문장을 드물게 보는 것이다 하였다.
병자년(1696)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기묘년(1699)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한 까닭에 건강을 몹시 상하여 거의 죽을 뻔하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양근의 묘하(墓下)로 내려갔는데 오두막 초가에 자갈밭 며칠 갈이가 전 재산이었다. 이따금 몸소 내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여 그것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병술년(1706)에 현릉 참봉이 되었다가 전옥서(典獄書)의 봉사(奉事)로 승진 되었다. 영릉(寧陵)과 예빈시(禮賓寺)의 봉사(奉事)가 되었다. 신묘년(1711)에 국제(菊製)에 장원급제하였는데 그 때에 고시관(考試官)은 대제학(大提學) 김진규(金鎭圭) 공이었다. 시권(試卷)을 검사하다가 공의 시권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 시권은 범상한 선비의 작품이 아니라』하더니 나중에 탁명(坼名)하여 보고 자기의 감식하는 안목이 높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병신년(1716)에 비로서 승문원에 소속되었는데 과거 전에 이미 자궁(資窮)이 되어 전례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으로 승진 되고 병조의 낭관으로 옮기었다.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외직을 구하여 문의 현령(文義縣令)이 되었다가 곧 춘방(春坊)에 의망 되고 이어서 당록(堂錄)에 참여하였고 또 홍록(弘錄)에도 참여하여 잇달아 병조의 낭관, 전라도(全羅道) 경시관(京試官), 시강원(侍講院) 사서(司書) 등에 제수 되었다.
숙종이 승하하시자 찬집(纂輯) 낭청(郎廳)에 차수 되었다가 곧바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남학(南學) 교수(敎授)에 제수되고 지제교(知製敎)에 선발 되었다. 적신 일경(一鏡)이 기염을 거세게 내뿜게 되자 공의 근척(近戚)이로되 공은 끝내 동요되지 않았다. 일경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하여 외임인 평강(平康) 현감(縣監)으로 내어 쫓았다. 정언(正言) 박필기(朴弼夔)가 소(疎)를 올려 공이 비록 문학에는 뛰어나지만 언의(言議)라든지 풍재(風裁)는 보잘 것이 없으므로 사체에 민감한 직책은 맡길 수 없다 하였으니 이런 것이 대체로 일경의 비위에 맞춘 발언이었다.
공이 젊어서 부터 서계(西溪) 박공에게서 수업하였는데 박공의 시호를 논하는 자리에서 문절(文節) 2자(字)는 서계공의 업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하여 개시(改諡)할 것을 청하니 시론이 모두 옳은 말이라고 하였다.
호조(戶曹) 판서(判書) 김연(金演)이 피화인 이만성(李晩成)을 조문(弔問)한 사건이 터져 그 때 마침 대계(臺啓)를 만나고 있었는데 공이 집의(執義)로서 그 부당한 것을 역설하였다.
공이 본디 조익명(趙翼命)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삭판(削板)해야 한다는 발론(發論)에 대해서 그 하는 말이 사리에 너무 어긋나므로 공의(公議)가 잘못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공이 소를 올려 변백하는데 상당히 논리적이므로 좋은 말이라는 비답(批答)이 내리었다. 공이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과 본디 부터 친하게 지내었을 뿐만 아니라 통가(通家)의 의(誼)가 있는 까닭에 공의 자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고 헐뜯어 남양(南陽) 부사(府使), 간성(杆城) 군수(郡守) 등 외임으로 내어 보내었다.
정미년(1727)에 공이 내간상(內艱喪)을 당하여 양근의 묘하에서 집상 3년하다가 기유년(1729)에 복규하여 형조 참의, 승지, 대사성 등에 잇달아 제수 되었다가 경술년(1730) 정시에 고관이 되었다.
공의 아들 산배(山培)가 을과에 참방하였는데 장령(掌令) 최치중(崔致重)이 소를 올려 사사가 끼이었다고 논하였다. 고관들이 모두 소를 올려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상이 또한 엄하게 그 말을 물리쳤다. 대사간(大司諫), 부제학에 제수되어 소를 올려 조성기(趙聖期)를 포양(褒揚)할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마음이 높고 밝으며 풍화에 흥을 붙인 힘은 송나라 때의 소옹(邵雍)과 비슷하고, 고금을 꿰어 뚫어 치란(治亂)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점으로는 여조겸(呂祖謙)과 짝할 수 있으며 그 본성으로 돌아가 모든 점을 비추어 보는 정신은 반드시 주자를 본받았는데 그 이름이 뒷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어찌 아깝고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더니 상이 특명으로 증직하게 하였다. 공이 매양 벼슬에 제수될 때에는 귀가 먹어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양하니 상이 말씀하시기를, 『귀가 먹었으면 무엇이 안 될 것이있겠는가.』 내가 한번 강(講)을 들어 내 뜻을 뚜렷이 세우고 싶다 하니 영상(領相) 홍치중(洪致中)이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 아무는 사장(詞章)에 깊을 뿐만 아니라 제자백가 아니 읽은 책이 없으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관(講官)감입니다』하고 경연 윤순(尹淳)은 말하기를, 『이 아무는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독서에 대한 근고(勤苦)는 소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박학하다고 통하는 사람은 대체로 책을 한번 쭉 훑어 볼 정도인데 이 아무는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규명하고 외고 하는 까닭에 현재의 문학계에서는 그와 맞수가 없습니다.』
영경연(領經筵)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이 아무는 문장이 같은 또래보다 월등하게 뛰어 나서 경악(經幄)에 이런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골로 아주 떠나려고 한다 하오니 만류하여 서울에 눌러있게 하시옵소서』하고 이제화(李齊華)는 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 아무는 나이도 많고 병이 들어서 직접 정무에 힘 쓰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를 불러서 임금님 곁에 두시고 때때로 경연에 참석시키어 고문(顧問)에 응하게 하면 비익되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 일에 대한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임금님이 만기를 통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이 아무는 훌륭한 문사입니다. 워낙 틀이 커서 소절(小節)에 구애하는 일이 없고 또 귀가 먹어서 세속의 지저분한 속태에는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말하기를, 『아무는 젊었을 때부터 고문 공부에 전력을 기울이어 늙어갈수록 그 학문이 깊어져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고 위인이 중후(重厚)한 데다 기질이 굳고 세며 잔재주를 부릴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소박합니다. 어려서 귀가 먹어서 그 공부가 겉에 드러나지는 아니하나 총명이 안으로 응축(凝縮)되어 넓고 깊게 학문의 진수를 꿰뚫어 알고 제자백가와 육예(六藝) 이외에 심지어 점 치는 일. 관상술 수학(數學) 등에 환하게 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다 노자나 불교에 대하여는 매우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더러는 너무 소박하고 솔직하다고 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명리에 담박하고 물질에 대하여는 초연합니다. 문을 닫아 걸고 독서에만 열중하여 고인의 풍도(風度)가 있습니다.』 수염이나 눈썹이 하얗게 센데다 언어가 소박하고 마음씨가 성실하여 매양 진견할 때에는 상이 기쁘게 예로써 대우하였다.
부고가 상께 알리어지자 상이 조회를 거두시고 슬퍼하고 아까워하시어 관원에게 명하여 장사일을 처리하여 주라 명하시고 부조를 후하게 하라 명하시었다.
철종 신해년(1851)에 판서 정창순(鄭昌順)이 찬시장(撰試狀)을 올리어 문정(文貞)이란 시호를 증(贈)하니 학문을 부지런히 닦고 묻기를 좋아하므로[勤學好問] 문(文)이고 청렴결백하여 분수를 지키었으니[淸白自守] 정(貞) 즉 문정(文貞)이 그 시법(諡法)이었다.
첫째 부인은 정부인 해주 최씨이니 참봉 익서(翼瑞)의 딸이다. 일찍 죽고 후사가 없으며 둘째 부인은 정부인 진주 강씨이니 아버지는 진상이요 할아버지는 교리 석창(碩昌)이다. 1남 3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산배(山培)라 문과하여 조졸(早卒)하였으므로 홍문관 부수찬에 추증되고 3녀는 해주 최지흥(崔址興), 청송 심용(沈鎔) 도사, 해평 윤득여(尹得輿)에게 시집갔는데 군수(郡守)이다. 수찬(修撰)은 2남 1녀를 두었으니 맏아들 창회(昌會)는 음사로 좌부승지이고 다음은 창흠(昌欽)이니 조졸하였다. 딸은 윤우동(尹遇東)에게 시집갔는데 군수이다. 증손(曾孫)은 현오(玄五)이고 능주(綾州) 목사(牧使)이니 생진과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현손은 근영(根榮)이니 생원으로 정랑인데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5대손 희로(僖魯)이니 생원으로 문과하여 홍문관 부제학으로 예조 판서이다.
이하는 생략한다.
오호라! 공은 젊어서 늙을 때까지 만권의 서적을 독파하였고 매양 경연에 모시어 있는 정성을 다하여 진언하여 조금도 거짓이 없이 임금을 독려하여 요순(堯舜)의 도(道)로 나아가게 하였다. 중원에 들어가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였고 문형을 네 번을 맡아 능히 당화 중에서는 송나라 원우중의 완전히 중립을 지킨 어른이라 하겠다. 중립하지 않고 한 쪽으로 쏠리어 덕이 없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선배들이 문장은 한문공같고 충근하기는 육선공같다 하였다. 후생의 변변치 않은 학문으로 어찌 감히 다른 말이 있겠는가?
명하여 이르기를,
어허 공의 선조에는
효정공은 효도로써 이름이 높고
뒤에 청강 선생 계시었으니
문무에 놀라운 재주 가지셨네.
음덕이 이렇게 두터우니
공의 재주 무리에게서 뛰어났네.
농암이 훌륭하다 칭찬하시고
서계에게서 많은 가르침 받았네.
만권의 서적을 독파하고
전적의 깊은 뜻을 탐색하였네.
과거에 응시하자마자 장원급제하니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듯
곧바로 홍문관에 이름 담고
이 석자 청사에 향기를 토하네.
강관으로 발탁 되었으니
임금의 뜻 간곡하기 이를 데 없네.
공도를 부연하여 설명드리고
모든 것을 품어 안으라고 설명하였네.
또 언제나 겸손하고 몸을 낮추시라고
주역의 겸괘는 겸손하여 드러내지 말라는 뜻
스스로 큰 체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
몸에도 해롭고 나라에는 더욱 해로워
임금께서 매양 훌륭하다 받아 들이어
임금의 덕성 수양에 크게 기여하였네.
중국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한 가지 재물도 챙기지 않고
오직 서적만을 친근하게 하였지요.
저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
덕망이 높을수록 헐뜯는 사람도 많아
임금이 그런 참소 듣지 않고서
여러 조曹의 판서를 맡기시었지
네 번이나 문형을 맡았으니
택당 이후 처음 있는 일
영화도 거룩하다 네 번의 문형
어허! 공이 벼슬하던 당시
붕당의 싸움 그칠 줄 몰라
그러나 중립을 지켜 꼼짝하지 않고
오직 정도만을 꿋꿋이 지키어
끝내 아름다운 이름 보전하였지.
이런 것이 크고도 좋은 업적
다시 말해 무엇하리.
이에 명을 마치노니
그 이름 천년 만년 전하리로다
계미(2003) 8월 일 황주 변시연은 삼가 지음
|
|
|
吏曺 判書 西堂 李 文貞公 諱 德壽 神道碑銘
英祖辛亥 以李公德壽爲三館大提學 公以才不稱職 陳疏辭 上而文衡非卿莫可 促令察任 盖因趙相公文命薦 而極一時之選也 明年正月 撰進景宗大王行狀 二月景宗實錄告成 前此實錄纂修 非公莫可 陞公僉中樞 以爲實錄堂上官 專力於纂修 及是有成也 上使校書館 印女四書 公以提調 諺釋以進 除吏曹判 公疏陳難進之義曰 今之用人 甲之徒則盡用 而乙之類則盡捨者 固非也 乙之徒則盡用 而甲之類則盡捨者 亦非也 創乎是而對擧分排 亦未見其得也 惟虛其心 精其識 勿問其蒲人荻人 惟才是擧 庶乎其可矣 公素不喜黨論故 其言如此 後因入侍 自請邊荒厭避之邑 上許其質實 而不許出外 入命抄啓湖堂 又將行都堂錄 而公不循黨議 而以文學爲準 不悅者甚多 癸丑除松都留守 上引見問所欲言 公歷陳典學之工 崇儉之義 上曰質實愛君 稱善者久之 連除吏禮兵工判 惟吏曹則輒引義不出 嘗以兵 親政 上手書一句詩曰 共相寅協秉心公 命諸臣和進 以公曾經文衡 特命加製一絶 公口誦以對曰 同堂戈戰軫淵哀 特揭天章勉至公 聖主深憂同烈祖 朝臣休復更西東 盖用宣廟龍灣詩中語 以寓陳勉之意 乙卯差謝恩冬至副使 不以燕貨一物自隨 惟親近書冊而己 明年歸自燕京 上引見問彼中事 公對以格君心收人才 結民心三者 識其國 以知經筵入侍妓講 公重聽難於酬酌 上使注書 書示曰否泰相仍 歷代沿革 乃當然之理 未如之何則漢唐之亡 非獻昭之罪耶 公曰理雖然矣 人事不可不致極 因數陳包荒 用馮河不遐遺朋亡之意曰 聖上欲致建極蕩平之治 於此尤當穿念矣 上曰不遐遺之意 雖屢飭銓官 而不過各私其所親矣 公曰如漢唐之朋黨 君子小人各自爲朋人主辨其爲正則可矣 今異於是 各以族類分爲一偏 互相攻斥 豈有一邊盡君子 一邊盡小人之理 於此於彼 豈無可用之人耶 仍陳故判書徐文裕妻 夫死病不服藥至死 趙南命女柳氏婦 夫死積薪焚 雖非中道 宜旌其閭 上許之 數日後 又行妓講 公曰周易六十四卦 惟謙六爻皆吉 書云滿招損 謙受益 盖人君之道 以貶損爲謙 宮室苑砒之奉 子女玉帛之娛 與夫自大自聖之心 盖所謂不謙之類 有一於此 皆足以危國而害身 可不懼哉 上開納焉 上行夕講 謂公曰 連聞經延所數奏 知卿深於易象 其詳陳卦爻彖象之義 公謝曰臣豈有深究 盖嘗讀之矣 至於河洛圖書 亦欲窮探蘊奧 而終有未遂 嘗手錄易義數十條易工有此耳 因云臣年少時 頗喜神仙之術 如同契諸書 精思累年 中歲偶觀佛語 因愛其心學 時有玲瓏透徹處 晩而反于四書三經 至易經 老而下工終如隔膜觀物矣 上笑皆不膺 及年至入耆杜 仍除禮判 先是承上命 修整五禮儀又撰呈續五禮儀 大提學圈點時 與趙歸鹿李陶菴 同獲四點 而公爲落點 畢竟四典文衡國朝澤堂以後 初有也 一時榮之 累經吏兵禮刑工判書 左右贊 喪凡後留寓於銅湖江舍 除左贊病遞 上以輔導元良 在於老成重厚之人 令政院下諭 癸亥年十月 以世子嬪竹冊文製進事入城 三十日製呈竹冊文 得病 甲子五月二十七日 考終于城南銅湖第 卽英廟在位之二十年也 葬于楊平西宗面水回里甲坐之原 乃先兆也 乃者公傍裔 江魯天浩兩氏 屬余爲大碑之銘 屢辭不獲 謹爲之敍曰 公字仁老 西堂其號 又曰蘗溪 全義人 以麗太師諱棹爲始祖 入鮮朝 有諱貞幹 以至孝聞 諡孝靖 五傳諱濟臣 號淸江 官北兵使以文武全才稱 於公爲六世 高祖重基生員縣令 以次子右相公行遠貴 贈領議政 贈祖行健 進僉同樞 贈吏判 祖萬雄 進文黃海監司 贈吏判 考徵明 進文禮曹判三道方伯 贈吏判 騙靑松沈氏 贈左贊成若漢女 公以顯宗癸丑七月三十日生 葯學語幷學書 八歲己通漢史小學等 再經重病仍成重聽 金農巖昌協先公友也 嘗有書 而判書公適不在家 公卽答 農巖見其答 嘆其氣象及文理之不凡 袖筆墨來遺曰 汝當作吾墓文 此其先贄也 遭配崔夫人喪 自製誌文 朴西溪世堂文鑑服一世 見公所製 驚曰 此非衰世文氣 求諸古人不可多得 丙子中司馬試 己卯丁外憂 過毁得病 幾不得全 奉母就居楊根墓下 茅屋數椽石田數頃而巳 往往躬自漁獵 以供甘旨 丙戌顯陵奉 陞典獄署奉事 移除寧陵及禮賓寺奉事 辛卯魁菊製 大提學金公鎭圭考試得公券曰 此非凡儒所作 及坼名亦自負其鑑識丙申始隸槐院 以科前資窮例陞成均館典籍 移兵曹郞 爲便養求外 得文義縣令 旋擬春坊仍堂錄又弘錄 連除兵曹郞 全羅道京試官 侍講院司書 肅宗昇遐 差纂輯郞廳旋除司憲府持平 弘文館修撰 南學敎授 選知製敎 賊臣一鏡 氣焰張甚 而爲公近戚 公終不勤 謂公異於己 黜補平康縣監 正言朴弼夔疏論 公雖優於文學 言議風栽無可觀 不可任以激揚之職 盖承一鏡旨也 公自少受業於西溪朴公 而及其議諡 以爲文節二字非所可當 請改諡 時論庇之 戶判金演 以被禍人李晩成吊問事 方遭臺啓 公以執義 力言不當 公與趙翼命有隙 至發削板之論 語多該悖 公議非之 公陳疏有理 上例賜批答之 公與金夢窩昌集 素有世好 且有通家誼故 不知公者 稍有疑謗 癸卯 爲斥補杆城郡守 丁未遭內艱 守制楊根墓下 己酉服局 連除刑曹議承旨大司成 庚戌爲庭試考官 公子山培乙科 掌令崔致重 疏論用私 考官皆疏明其不然 上亦嚴斥言者 除大司諫副提學 疏請趙聖期褒揚曰 盖其玩心高明 寓興風花 有似於邵雍 貫穿今古 究極治亂 有類於呂祖謙 若其反本會宗則 又必以考亭爲法 無聞於後 寧不嗟杳 上特命贈職 公有除拜 每以重聽不合爲辭 上曰重聽何傷 欲一講確予意 領相洪公致中 仍言李某不但工於詞章 諸子百家無書不讀 此眞講官也 經筵官尹淳曰 李某年雖衰 讀書勤苦 無異少年 世號博通者未免涉獵 某必玩味誦之故 今世文學 無與對手 領經延宋寅明言 李某文章超出等輩 經幄不可無此人 今將大歸峽裡 請留之 持平李齊華上疏 略曰 李某年衰病甚 固不責以盡力 而若招致輦櫓之下 時許登筵 以備顧問則 其人也 多識前言往行 未必無補於緝熙之工 史臣曰 李某好文士也 倜惜不抱小節 此有聾病 不蓋世俗態 又曰某自少力爲古文 老益不衰 爲人蒼鬱渾厚有氣力 滑雕繪之習 然時近於野 早病耳聾 聰明內專 淹博貫穿 汎覽諸家自六藝之餘百家之書 至卜筮相術數學之類 無不通曉 尤深於老佛 雖進退棲屑 人或病其不去 然淡於利祿與物無競 閉門看書 有古人風 鬚眉蒼古 言語樸素 每進見 上欣然禮之 訃聞上輟朝悼惜 命官庇葬 特加厚賻 哲宗辛亥 鄭判書昌順撰諡狀 贈以文貞 勤學好問曰文 淸白自守曰貞 其諡法也 配貞夫人海州崔氏奉翼瑞女 早歿無育 再配封貞夫人晉州姜氏 校理碩昌孫 有一男三女 男山培文科早夭 贈弘文館副修撰 三女適海州崔址興 靑松沈鎔都事 海平尹得輿郡守 修撰有二男一女 男昌會蔭左副承知次昌欽早夭 一女適尹遇東郡守 曾孫玄五 生進綾州牧使 贈吏 玄孫根榮 生員正郞 贈吏判 五代孫僖魯 生員文科 弘文館副提學 禮曹判書 下略 嗚呼 公自少至老 讀破萬卷書 每侍經筵進言無諱 期欲勉君以堯舜之道 再入中原 能盡使事 四典文衡 而自能爲黨禍中元祐完人 不有中立不倚之德 烏能然乎 先輩稱文章如漢文公 忠懃似陸宣公則 後生末學復何容喙 系之以銘曰 嗟公之先 孝靖孝聞 後有淸翁 乃武乃文 蔭旣有厚 公材不群 農巖傾勖 西溪陶薰 讀破萬卷 探索典墳 爰捿魁科 如龍乘雲 旋弘錄 三字衛芬 擢以講官 王意有賁 數陳公道 荒包朋亡 又勉貶損 曰謙最藏 自大自聖 苒害國妨 王每嘉訥 補闕伉伉 使燕來往 一物不私 惟親書籍 識彼有方 望高毁至 王不信謗 歷判諸曹 四典文衡 澤堂以後 初有爲榮 嗟公之世 黨鬧充盈 中立不倚 與物莫壟 惟正是導 終保身名 此其大者 復何多冷 銘止于斯 可傳千齡
癸未 八月 日 黃州 邊時淵 謹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