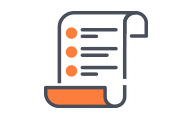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3리 |
청강(淸江) 이공(李公)의 맏아들 이군(李君) 기준(耆俊)은 자가 부선(孚先)인데 성품이 굳세고 높으며 청렴결백하여 기개(氣槪)와 의리가 생활신조였으니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곧 자기 스승으로 삼고, 다른 사람이 나쁜 행실을 보면 자기의 원수처럼 대하여 면대하여 침을 뱉을 정도이었다. 나에게서 준엄한 빛이 보이면 간사한 마음을 감추고 시속에 따라 또 안면에 따라 큰 소리나 치고 겉으로만 태도를 꾸미어 남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는 자와는 한자리에 앉아 말을 나누지도 아니하였다. 의가 아니라면 터럭끝 하나라도 남에게서 받는 법이 없고, 도리에 맞는 일이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버티어 서서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며, 남이 따르거나 말거나, 세상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간에 소신대로 행동하다가 비록 그것이 원인이 되어 깔아 뭉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개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부모를 모시거나 형제자매를 만나면 능히 유순하고 온화하여 한결같이 즐거운 빛을 띠고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대부인께서 일찍이 황달을 앓으실 때에 군은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가시는 곳은 어디나 모시고 다니며 숱한 약을 다 지어 바치니 원근의 선비들이 안면이 있든 없든 다투어 좋은 약이나 맛있는 음식이면 가져다가 군에게 보내 주었으니, 이것은 대체로 공의 효성에 감동하였기 때문이었다.
계미년(1583)에 청강공께서 북병사로서 오랑캐가 국경을 침범하는 란을 만났을 때에 공의 재덕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에 빠져 마침내 옥에 같히게 되니, 군이 신들메를 하고 옥 근처에 빈집을 세내어 혼자 거처하면서 하루 한끼 밥을 먹으며 사람을 대하여 옥에 갇힌 어른의 사연을 이야기할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리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머금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익성군수 홍성민(洪聖民),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이정암(李廷襤)들은 모두 청강공의 친한 벗이었는데, 일찍이 군의 처소를 찾아가서 군을 만나보고 물러 나와서는 입을 모아 군의 효성을 기리었다. 청강공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모두 효자라고 일컫는 것도 사실 군의 이러한 행실 때문에 불려진 칭송이었다. 옥을 지키는 금오의 서졸(胥卒)들은 노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을 존경하여 군의 이름을 외어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비록 기세가 당당한 서리로서 눈을 부라리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이도 감히 군이 곤경에 빠져있다고 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청강공이 서쪽 변지에서 귀양살이를 하게되니, 군은 문을 닫아걸고 세상 사람과 접촉을 끊고 지내더니 하루는 집안 사람들과 청강공께서 잡힌 시말에 대하여 이야기 한 끝에 이어서 눈믈을 흘리며 피를 토하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세상을 떠났으니, 계미년 6월초8일 청강공보다 4개월 전(前)이었다. 아! 아까운지고, 가정(嘉靖) 을묘년(1555) 10월에 태어나서 기묘년(1579)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경진년(1580)에 문과 급제하여 승문원에 선보(선발 보직) 되었다가 부정자직에서 별세하니 나이가 겨우 29세이었고, 갑신년(1584) 봄에 양근읍의 서쪽 갑좌 언덕에 장사지내었다. 군은 모습과 행동이 시원하고 훤칠하여 바라보면 뚜렷한 느낌을 풍겼으며 시에 능하고 궁마의 재주도 있는데다가 사무능력까지 겸하였으니 진실로 만능 재주를 겸비한 재사이었다. 전의이씨로서 시조 도(棹)는 고려태사이었고 대대로 이름난 사람이 그치지 않더니 조선조에 들어와서 효정공 정간(貞幹)이 백세가 된 모부인을 지성껏 받들어 효도로서 이름을 드날리었는데 군의 7대조이다. 증조는 공달이니 양주 목사로서 호조 참판으로 증직되었고, 조부는 문성(文誠)이니 경상도 절도사로서 병조 참판으로 증직되었는데, 일가 숙부뻘되는 흡곡 현령 인손(仁孫)의 후사로 입계하여 이분이 청강공 휘 제신(濟臣)을 낳으니 문장과 절의가 한 시대를 울리었다. 벼슬은 함경북도 절도사를 지냈고 영의정으로 증직되었으며, 비(騙)는 상씨(尙氏)이니 정경부인으로 증직되었으며 선무랑 붕남의 딸이요 영의정 진의 손녀이었다. 군은 광주김씨를 맞이하였으니 감역 익휘의 딸이며 판서 개의 손녀인데 단정하고 의젓하며 화순(和順)한 덕(德)이 있었고, 군이 세상을 떠난뒤 44년만에 별세하니 곧 천계 병인년(1626) 여름이었으며 공과 함께 같은 언덕에 장사지내었다.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맏이는 중기(重基)이니 현령을 지냈고, 둘째는 후기(厚基)이니 현감을 지냈으며, 모두 문행 문필과 행검이 있어서 촉망받는 선비이다. 중기는 전부 임색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형제와 딸 형제를 낳았으니, 아들 행건(行健)은 별좌이며, 행원(行遠)은 수찬이고, 맏딸은 정용에게 다음딸은 진사 허박에게 각각 시집갔다. 후기는 도사(都事) 남호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형제와 딸 삼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행진(行進)이니 시직이고, 행우(行遇)는 진사이며 맏딸은 현감 이두양(李斗陽)에게, 다음은 현령 이위국(李緯國)에게, 다음은 이후준(李後俊)에게 각각 시집갔다.
처음에 청강공께서 군으로 가독을 삼은바 있더니, 천신 대부에서부터 평범한 손에 이르기까지 청강공께 와서 학습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씨집안이 대대로 덕을 쌓았지만 공의 부자가 또한 효성스럽고 우애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광휘가 계속전승하여 그 지위나 사회적 공헌이 아울러 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청강공께서는 밭을 갈아서 이랑을 지었고, 군은 씨를 뿌리었으나 거두어 들이지는 못한 격이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좋아하고 미워함이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도 어긋나는 수가 있을까? 혹은 천도는 너무 멀어서 먼 뒷날에 보답(報答)을 내리어 군의 자손대에 와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거의 헤아릴 수가 없구나.
신흠이 일찍 청강문하에 장가들었으므로 군과는 본디 형제나 다름이 없는데다가 거듭 친구로서의 정분까지도 겹쳤었는데 현재 군이 세상을 떠난지가 벌써 36년이 되었다. 중기씨 형제가 행록(行錄)을 가지고 와서 명을 써 주기를 청하면서 흠(欽)에게 말하기를『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저희가 외롭고 어렸기 때문에 아주 철부지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겨우 묘갈을 세우게 되었으니 공께서는 한 말씀 주시어야겠다』고 청하는지라, 흠欽이 개연히 죽은이와 살아있는 이에 관하여 생각하니 한스럽고 슬프기 그지 없는지라, 이에 다음과 같이 명을 엮는다.
밭에도 골이 있고 두둑 있듯이,
잘되고 못되는 것 언제나 있네.
꽃나무들 심어서 잘 가꾸었는데,
왜 이리도 오갈들이 걷히지 않나?
잘 살아야 할터인데 왜 이러냐고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행실을 비석에 새겨 두노니
보는 이들 옛날처럼 전하여 주소.
상촌 신흠(申欽) 지음
|
|
|
淸江李公○胤子曰李君耆俊字孚先○性剛介○廉潔○負氣義○聞人善○立以爲己師○見人惡若己曲唾戎如雀○我有色襄○內荏炤缶○脂韋逐顔○面代代飭彩皿○爲容悅者○卽不忍與坐語○非其義也纖毫不取諸人○如其道也挺然自立不詭○隨且不隨○世凉熱○去就低昻○雖以而抹壺不顧也○唯篤於履行○侍父母○遇兄弟○姉妹○能柔緩和○巽○一於怡愉母違也○大夫人曾患疸○君日夜不解衣○擎跡奉引○致藥萬方○遠近士夫○無論識不識○爭賚奇劑珍餌○以赴君○盖感其孝也○歲癸未○淸江公○以戎師遭邊鄧○爲變落者所中○竟下理○君屢徹○緣賃圄隙屋○塊處不再食○對人說獄○輒淚○人過君者視聽爲之○動亦靡不揭揭然涕也○洪益城聖民李知樞廷襤○俱淸江公執友也○嘗訪君所○觀君爲○退交口增增○感君能子○慶○淸江公有子稱世孝子○必歸君○金吾胥卒自長老至童○孺皆敬君誦君名○不己○雖爪牙吏○恣號虎○而冠者不敢以君困故而凌折之也○淸江公卒暈于西土○君杜門不與世接○一日與家人○語及淸江公被逮事始末○因叉泣嘔血○翌朝遂卒○癸未六月初八日也○嗚呼惜哉○生於嘉靖乙卯十月○中己卯進士○庚辰文科○選補承文院○至副正字○得年葯二十九○甲申春○葬于楊根治西○負甲之原○君姿儀爽逸○望之皎然○長于詩○便弓馬○有吏才○眞全才也○系出全義始祖棹○高麗太師○世有冠冕○入本朝○孝靖公貞幹○奉百歲母○以孝聞君○七代祖也○曾祖曰公達○楊州牧使○贈戶曹判○祖曰文誠○慶尙道節都使○贈兵曹判○出爲族父卵谷縣令仁孫後○寔生淸江公○諱濟臣○文章節義鳴一世○官咸鏡北道節度使○贈領議政騙曰尙氏○贈貞敬夫人宣務郞鵬南之女領議政震之孫君聘光州金氏監役益輝之女判書鎧之孫有端莊和巽之德後君四十四年卒卽天啓丙寅夏也與公葬同原有子二人曰重基縣令厚基縣監咸有文行爲望士重基娶典簿任穡女生二男二女男行健別座行遠修撰女長鄭涌次許博進士厚基娶都事南琥女生二男三女男行進侍直行遇進士女長李斗陽縣監次李緯國縣令次李後俊初淸江公有君爲之家督薦紳大夫芳凡客○習於淸江公者○擧曰李氏世積德○公父子○又用孝悌○慤植○休光○相襲○位與施宜竝大也己○淸江公嫁而不賂○君種而未穫○豈天之所好惡○戾於人耶○抑天道遠而徵成于後○而栗之於君之子孫耶○殆未可量也○欽早娶婦於淸江門下○君固視兄弟也者○而重有友之道焉○今距君沒三十有六年矣○重基氏兄弟○苛行錄命欽曰○當先君子捐館舍○不肖孤稚昧無所知識○逮于玆始具麗牲之石○公合有辭○欽慨念存望愴恨而銘涅銘曰○疇之夭沃○曷無年之○樹之沙茂○曷揭顚○誰之不如而止於斯○我篆其○而後之孫○象村申欽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