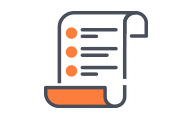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과 서문
영의정 정원용(鄭元容) 지음
우리 순조(純祖 : 1801~1834)께서는, 총명하고 예지의 자질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시어, 오직 말없이 묵묵하게, 사람의 예능과 단점과 장점을 살피셨다.
만기(萬幾)를 총괄하시고, 사람의 자질을 헤아려, 좌우의 굳센 선비로 하여금, 용이 일어나고, 비늘이 모이는 형상과 같게 하여, 각자가 빛나게 하였는데, 오직 당헌(棠軒) 이공(李公)은 제일 먼저 왕의 눈에 띄어, 항상 측근에 두었으니, 왕께서 하루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공이 병을 칭하고 사직을 하자, 문안을 물으니 대궐에 나아가 매번 서둘러 들어갔다. 공은 아름다운 풍모과 좋은 거동(擧動)을 갖추었으니, 왕께서 항상 두고 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의심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보고 물었다. 공은 전대(前代)의 문헌과, 우리나라의 제도와 문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왕께서 묻는 것마다, 대답함에 막힘이 없었다. 또한 바른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순박하고 정직하여 숨김이 없었으니, 항상 아뢰어 말하기를, “위징(魏徵)이 기풍(譏諷)을 좋아하였으나, 이는 급암(汲黯)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이로써 공을 명(命)으로 자주 부르니, 임금께서 바로 밤에 불러들여, 독대(獨對)하고 내찬(內饌)을 내려주시고, 공의 말을 받아들이고 담론하기를, 한 집안사람과 같이 하였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궁에서 물러 나왔다. 그 베푸는 은총의 깊이와, 가깝고 밀접하기가, 나 원용(元容)에 비할 바가 아니고, 사관(史官)으로서 항상 몸소 보는 바가 이와 같았다. 세상의 모든 이가 공을 헤아려 크게 쓰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겼다.
선비가 다행히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을 잘 만나게 되면, 생각한 바를 반드시 말하였지만, 태고의 뛰어난 선비도 가히 스스로 뜻하는 바(주장하는 바)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기약할 수 없는 데, 이는 (위의 분들이) 화려한 곤룡포와, 빛나는 비단(권세와 현실)에 만족하고, 명분과 지위의 성쇠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으니(허례허식을 숭상하고 신분의 몰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어찌 (선비의 인품과 능력이라고) 족히 논하겠는가?
공(公)의 휘(諱)는 문회(文會)이고 자는 주경(周卿)이다. 어머니가 꿈에, 거북이를 보고 공을 낳으니, 영조 무인(戊寅 : 1758/영조 34)년 9월 3일이다. 어려서 총명하고 뛰어남이, 다른 아이와 달랐다. 비로소 처음 책을 받고, “천지의 개벽 이전은, 어떤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깊은 물은 어디에서 끝나는가에 대해서 물으니” 서당 스승이 기이하게 여겼다. 장성함에 이르러 시문을 짓는 구상이 날로 발전하여, 명류(名流)들과 교유(交遊)하였다. 나이 18세에 이르러, 임금께서 인원성모(仁元聖母)의 가까운 혈족이라 하여, 불러보아 악수를 하며, 기이함을 칭찬하고 곧 관직에 제수하셨다. 다음날 또 불러서, 호랑이 가죽을 하사하였다. 정조(正祖) 초에 윤대(輪對)하여 포교(褒敎)를 받들었다. 경술(庚戌 : 1790/정조 14)년에는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발탁되었고, 전시(殿試)에서 장원을 하여, 임금께서 준례(準例)대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리고, 승지(承旨)에 제배(除拜)하시면서 말하기를, “전향(傳香 : 임금이 향축을 전하는 일)시에 비단옷을 입고 아름다운 소년을 보았는데, 종친의 부마 도위(駙馬都尉) 같았다. 내가 너를 보고 어찌 선조의 뜻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몇 살이기에 이 직사(職事)를 다하는가? 내가 장차 물러나 눈 여겨 바라보리라” 하였다. 광릉(光陵 : 세조(世祖)와 정희왕후(貞憙王后)의 능)의 악차(幄次 : 거둥할 때 임시로 장막을 치고 임금이 쉬는 곳)에서 공에게 술을 사(賜)하고 임금께서 사교(辭敎)를 발하니, 글을 받들어 붓을 놓지 않으니, 임금께서 놀래어 말하기를, “자상하고 민첩하기가 이와 같은가. 오래 담당한 사람도 미치지 못한다.”하였다. 광릉 밖에 이르러 임금께서 말하기를, “어떤 처지에도 문식(文識)이 적합하고 권장하여 쓰였는데, 영락하여 이제 너인가. 어찌 관작(官爵)을 명에 말미암겠는가” 하였다. 순조(純祖) 초기에 연달아 승지(承旨)에 제배(除拜)되었는데, 조석으로 강연에 오르고, 글의 뜻을 고금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정확하고 아주 적절하게 펼치니, 반드시 통하고 가르치며, 보태고 더하고자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라 나라는 씨족을 숭상하여,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의 직을 겸하니 흥함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임금이 신하의 가르침을 즐기면, 즉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엿보아 나아가니, 임금의 덕이 간함을 받아들이기를 먼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한 연후에야, 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였다. 또 가로되, “사물이 생기는 근원이, 넘쳐서 과거에 이른 자는, 나가고 취하는 기술입니다” 하였다. 천둥과 이상한 일로 인하여 아뢰어 말하기를, “선대(先代) 왕께서는 한 달에 여섯 번 일을 아뢰게 하고, 신하들이 바라는 말을 아뢰게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전조(前朝)의 정사(政事)에 힘쓰는 덕을 본받아, 날마다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하고, 잘 지내며 서로 도우면, 곧 재앙은 가히 그칠 것입니다” 하니, 임금께서 흔쾌히 받아들여 칭찬하였다. 원자(元子)와 상견례를 행할 때,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생각건대 낮은 벼슬아치들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하께서 몸소 친절함을 실천하여, 가르침만은 못하는 것이니, 이는 중국 왕실의 중요한 요체(要諦)입니다. 또한 사물을 대할 때, 전하의 언동이, 한결같이 바른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 공을 본받도록 하니, 어찌 외전(外傳)을 좇음에 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즐겨 받아들이셨다. 여러 도(道)에서 올린 계문(啓聞)은 기간이 지난 것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살피고 공이 비의 혜택, 농작물의 형편, 변경의 정세, 백성의 고통으로서 본보기를 삼기를 임금께서 허락하였다. 당시 후궁들이 임금의 전교를 칭하자 차율[流刑]로 다스릴 것을 특별히 명하니, 공이 그 불가함을 힘써 아뢰었다. 후궁이 또한, 밤에 야간통행금지를 범하니, 공이 말하기를 “전하의 근신이 어찌 이와 같이 무엄한가” 하고 엄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 옳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친히 궁궐을 거닐 때, 횃불을 떨어뜨리니, 조랑(曹郞)들에게 잘못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공이 나아가 말하기를 “군무(軍務)가 아닙니다. 훗날의 폐단을 여는 것이 까 염려가 됩니다” 하니, 임금께서 깨달아 고쳤다.
좌상(左相) 이시수(李時秀)를 국문(鞠問)하라고 불러들이고,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임금께서 친히 맞이하겠다고, 보여(寶輿)를 타고 나가려고 하니, 공이 앞에서 만류하며 말하기를, “호위병도 없이 혼자서 어찌하여 나가십니까?” 하고, 이에 모시는 사람들에게, 모시고 나가지 말도록 훈계하니, 왕이 다시 돌아왔다. 임금이 공의 문학을 사랑하여, 여러 문제로 글을 짓도록 명령을 하고, 혹은 친히 운자(韻字)를 띄워 주기도 하고, 경전과 옷걸이를 상으로 내려주었다.
궁중에서 제술(製述)에 응하여 본조(本朝)의 이문회(李文會)를 사전(謝箋)의 제목으로 삼았다. 일세의 영화로 하여금 전후 은대[銀臺 : 승정원(承政院)] 고신(告身)이 백여통이 되었는데, 본원의 조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늙은 관리도 또한 공에게 질문한 연후에 행하였다.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적신(賊臣)이었던 권유(權裕)의 옥사(獄事)에, 그 무리들이 그 죄상을 자세히 심사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간원들에게 일을 빨리 처리하여 줄 것을 사주(使嗾)하려하자, 공이 상소를 올려 그 싹을 잘라버렸다. 형조의 못난 선비가 징토(懲土)를 가칭(假稱)해서, 태학(太學 : 성균관(成均館))에 투서(投書)를 하니, 그 죄가 무고(誣告)에 해당하였으나, 죄안(罪案)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임금이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명하니, 공이 불가함을 고집했고, 두 번 상소를 했는데, 공이 떠나자 일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공은 일을 만났을 때, 정도(正道)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으니, 또한 이로써 기뻐하지 않은 자가 많았다. 성균관(成均館)의 장이 되어서, 시험과 부과를 정밀하고 강력하게 하였고, 증광(增廣) 동당시(東堂試 )를 주관하고, 아울러 복시(覆試)에 관여했다. 대사(大史) 이만수(李晩秀)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담백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얽힘이 없는 자는, 오직 하나인데, 공(公)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조대 외시(外試)에서 공은 안악군(安岳郡)에 봉해졌다. 임금께서 전교(傳敎)하기를, “군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또한 전지[양전(量田)]를 측량하는 데는, 오직 그대만이 할 수 있다” 하였다. 고이 장부를 받들고, 아랫사람에게는 후하게 하고, 강경해서 굽히지 않은 사람은 정의로써 회 하니, 서로 기뻐하여 복종하였다. 식량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배급을 하고, 전지를 조사하는 사람들도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어느 해인가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자리를 묶고 집을 엮어서 주린 백성들을 거처하게 하고, 관(官)에서 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불때서 스스로 먹도록 하였다. 보리가 익을 즈음에서는, 부공(副公)의 전주(田主)와 같이하여 기민(饑民)을 살리고, 세속이 글을 모르니 서당을 열어, 학도들을 가르쳤으니, 마치 범공(范公)이 스승을 맞이하여 훈도 하는 것과 같았다.
성천부(成川府)을 다스릴 때에, 낮에는 옛날 현자들이 이행한 법도를 따랐고, 한가할 때에는, 누(樓)에 올라 시를 지었고, 송경(松京)에 거류(居留)할 때에는, 장부는 비었는데, 지급과 조달의 규모가 줄어서, 임금에게 상소하여 청하기를, “금천(金川)과 장단(長湍)의 세금을 보조해주고, 역군(役軍)을 줄여달라고 청하였다. 교관(敎官)과 시관(寺官)을 나누고, 임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고, 백치진(白峙鎭 : 금천군(金川郡)에 있음)의 장이 되어서는, 국경을 굳게 지켰다. 이 세가지는 모두 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공(公)이 말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그에 준거해서 허락하였으니, 그 진영(鎭營)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부유한 백성들이, 은을 무역하는 법도를 혁파하고, 관시(關市)에서 금한 것을 행하고, 향음(鄕飮)의 예(禮)를 행하였다. 임기만료 후에 중경(中京)의 관민들이, 술병을 갖고와 마주하고, 교자(轎子)를 메고 환송하였다. 해서(海西 : 황해도(黃海道)를 말함)를 안찰(按擦)하는데, 절의(節義)와 사랑으로 하여, 세금의 납체(納滯)를 정돈하고, 적규(쌀을 사들이는 규정)를 정돈하고, 역람(驛濫)을 금하고, 포구세(浦口稅)를 살피고, 억울한 것을 신원(伸寃)하고, 풀어주되 해이하지 않도록 하고, 살펴서 가혹함이 없도록 하고, 스스로 선행을 행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함이 지극하였다.
공(公)은 전의인(全義人)으로 먼 조상으로는 고려(高麗)시대 태사(太師)를 지낸 도(棹)가 있다. 본조(本朝)에 들어와서는 정간(貞幹)이 있는데, 정간은 중추원사(中樞院使)로 효정(孝靖)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고, 사관(士寬)을 낳았다. 사관은 경기감사(京畿監司)를 지냈고, 서장(恕長)은 대사헌(大司憲)으로 양간(襄簡)의 시호를 받았다. 4대를 내려와서 또 제신(濟臣)이 있는데, 제신은 문무(文武)에 두루 재주가 있어서, 북방 병영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냈으며,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고, 호를 청강(淸江)이라 하였다. 3대를 내려오면 행원(行遠)이 있는데, 행원은 우의정(右議政)을 지냈고 효정(孝貞)이란 시호를 받았다. 호(號)가 서화(西華)로 국가를 중흥시킨 어진 재상이 되었으며, 만최(萬最)를 낳았다. 만최는 봉사(奉事)를 지냈으며, 징해(徵海)는 목사(牧使)를 지냈고, 휘(諱) 덕린(德鄰)은 군수(郡守)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고, 후사(後嗣)가 없어서, 종질(從姪)인 영배(永培)를 취하여 아들을 삼았다. 영배는 목사(牧使)로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고, 연일 정씨(延日鄭氏) 학생(學生) 여량(與良)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관찰사(觀察使) 휘(諱) 시성(始成)의 현손(玄孫)이 되며 정부인(貞夫人)에 증직(贈職)되었는데, 공(公)의 어머니이다. 목사(牧使)를 지낸 징즙(徵楫), 참봉(參奉)을 지낸 덕봉(德鳳)은 공(公)의 생가(生家) 쪽의 증조(曾祖)와 조부(祖父)이다.
을미(乙未 : 1775/영조 51)년에 장녕전 참봉(長寧殿參奉)에 제수되었고, 봉사(奉事), 직장(直長)에 올랐으며,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다. 을해(乙亥 : 1779/정조 03)년에 외환(外患)을 당하였다. 경술(庚戌 : 1790/정조 14)년에 사옹원 주부(司饔院主簿)가 되었고, 평시서(平市署)로 옮겼으며, 가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며,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 호조 참의(戶曹參議),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 대사간(大司諫), 병조참의(兵曹參議),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되었다. 계축(癸丑 : 1793/정조 17)년에 안악 군수(安岳郡守)로 나갔다. 기미(己未 : 1799/정조 23)년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순조(純祖) 신유(辛酉:1801/순조 01)년에 복(服)을 마치자, 승지(承旨)에 다시 제배(除拜)되었다. 갑자(甲子 : 1804/순조 04)년에 대사성(大司成)에 제배되어, 승지와 겸대(兼帶)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기사(己巳 : 1809/순조 09)년 2월에 혜경궁(惠慶宮)의 회갑을 맞이하여, 승지를 경유하여 가선 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임금께서 전교를 내려 말하기를 “비로소 내가 탄강과(誕降科)에서 장원(壯元)으로 뽑은자이다” 하시고, 부총관(副摠管), 한성부 좌우윤(漢城府左右尹), 호조 참판(戶曹參判), 동의금(同義禁)에 제수하였다. 신미(辛未 : 1811/순조 11)년에 경연(經筵), 호조 참판(戶曹參判), 동지부사(冬至副使)에 제수하였다. 계유(癸酉 : 1813/순조 13)년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예조참판(禮曹參判), 성천 부사(成川府使)에 제수되었다. 무인(戊寅 : 1818/순조 18)년에 동춘추(同春秋)가 되었고, 기묘(己卯 : 1819/순조 19)년에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신사(辛巳 : 1821/순조 21)년에 동돈녕(同敦寧)이 되었고, 임오(壬午 : 1822/순조 22)년에 형조 참판(刑曹參判)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제배되었다. 병술(丙戌 : 1826/순조 26)년에 이조 참판(吏曹參判)과 도승지(都承旨)에 제수되었고, 정해(丁亥 : 1827/순조 27)년 익종(翼宗) 대리(代理)시에 대사헌(大司憲) 겸 승문원(承文院) 사역원(司譯院) 봉상시(奉常寺) 빙고(氷庫) 제조관(提調官)에 제배되어,관직을 두루 거치고, 대사헌(大司憲)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여러 번 하였다. 무자(戊子 : 1828/순조 28)년 6월 13일 고종명(考綜命 : 명(命)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 하니, 공(公)의 나이 향년 71세였다. 부음이 들리니, 예를 갖추어 7월 4일 북부(北部) 성산리(城山里) 참판공(參判公) 묘의 오른쪽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夫人)은 정부인(貞夫人)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정언(正言)을 지낸 상현(商賢)의 딸이며 참판(參判) 평(枰)의 현손(玄孫)으로, 언행이 훌륭하고 부드럽고, 행동에는 지극하고, 다스림에는 법도가 있어서, 그 움직임에는 본받을 바가 있었으며, 베푸는 데에도 마땅함이 있었다. 전원(田園)과 녹봉(祿俸)의 용도는, 모두 절도가 있으니, 이종가(李宗家)의 가법과 비견되었다. 공(公)이 집을 잘 다스린 것은, 실로 내조의 덕이다. 아들이 많았는데, 현서(玄緖)는 현재 참판(參判)으로 있으며, 현서의 아들 근필(根弼)은 지금 수찬(修撰)이다. 딸은 진사 윤긍규(尹兢圭)와 혼인하였다. 근필의 자녀는 어리다. 긍규의 아들은 홍진(泓鎭)이고, 딸은 한명교(韓明敎)와 정인건(鄭寅健)과 혼인하였다.
오호라! 공이 안으로는 집안을 잘 다스리고, 밖으로는 엄숙하고 단정하고, 일에 임하여서는 신중하여, 가벼이 발하지 않았고, 발하면 되돌리지 않아서, 어떤 일에도 요체(要諦)가 흔들리지 않아서, 모든 일을 너그럽고 넉넉하게 귀결시켰다. 부모를 효도로써 섬기니, 단지(斷指)하여 피를 흘려 넣어주어, 병간호를 하였고, 초상을 당하여서는, 몸을 상하면서까지 극진히 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지성(至誠)으로 다하였고, 동생들과의 우애도 지극하였다. 덧붙여 말하면 공은 나와 같이 검소한데, 공의 검소함은 한갓 선비와 같았다.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서 책을 대하였는데, 거의 문을 나오지 않았으며, 항상 전야에 물러나 쉬면서 생각하였다. 어려서부터 경서에 힘써서, 항상 암송하는 것이 많았다. 글을 화려하게 꾸며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치에 통달하여 도달하였다. 병려(騈麗)에 더욱 능하여, 몇 권의 문집(文集)을 남겼는데, 집에 보관하였다. 공은 문지가 있으나, 조정에서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되, 묘당(廟堂)에서 쓰이지 못하였으나, 이는 스스로 법도를 지키고 몸을 단속하는 본보기이다. 규각(圭角)을 드러내지 않음은 처세의 증거이다. 집에 있어서는, 집안의 법도를 바르게 하고, 관직에 나가서는 정치를 밝히니, 오직 스스로 믿고, 세상에 따라, 아첨을 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높이 날아,. 권세가 대단하지는 못할 지라도, 성군(聖君)을 깨우치고 밝은 은총을 입으니, 시종 세상에 견주어 존경을 받고, 드러남을 대신 하지 못하니, 일컬을 일없는 것이 어떠한가? 옛사람이 임금의 한마디를 얻으면, 종신토록 영광으로 여겼으니, 공과 같은 사람을 가히 그렇다고 하겠다. 명왈(銘曰)
무늬 옷을 입지 않고, 꾸미지 않고, 빛나지 않되, 스스로 높으며,
구차하지 않으며 세상을 배우지 않고,
옛날에서 배우고 밖으로 내달리지 않으며, 안으로 반드시 살피고,
오직 그 정성, 질박함, 아름다움의 정성에 놀라며,
항상 징무의 손급당(遜汲戇)을 아뢰었다.
임금께서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임금을 모시면서 강연의 강(講)을 하였다.
현자의 임가가 수레에서 나가고 정성을 다하였다.
나아간 즉 소열 황제(昭烈皇帝 : 유비(劉備)를 말함)의 융성한 교분을 맺었고.
물러난 즉 대대로 내려오는 한나라의 밝은 명을 지켰다.
사람들이 공이 깊이 알고, 박식하고 훌륭한 문장력을 칭송하여,
어찌 산룡(山龍) 조화(藻火)의 상(象)이 아닌가 하였다.
또 공을 이르기를 덕이 정밀하고 훌륭하고 통달한 그릇됨이,
어찌 임우주려(霖雨舟礪)를 우러러보지 않겠는가.
내가 곧 이르기를 임금을 가까이 모시면서 있었으니 벼슬을 받고,
근사하게 차려진 음식상을 벌려놓은 것이 어려울 것이 뭐 있겠는가.
자리에 영화롭게 있고 아름다움을 감춘 듯하여 덕을 드러나지 않고
자식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현달(顯達)하여 모범을 지키니,
귀신이 보답하고 내려보는 바를 거울 삼을 수 있다.
이에 가히 거울이 될만하다.
|
|
|
神道碑銘
領議政 鄭元容 撰
我 純祖 以聰明叡智之姿 年御極 惟不言而黙察人藝能短長 及總萬幾程量器使左右鴻 猷如龍興鱗集 各自藉光澤 而惟棠軒李公 先受知常置近著 宣召歿無虛日 移病問起居詣閤 每趣入公美風儀善 癸對欲常常見 而有疑難必顧詢公暗練前代文獻 國朝典章隨問無滯對 且好匡救諍諫 樸直無隱回 常奏曰 魏徵好幾 此不及汲處 上以此尤多公頻命 上直直夜引對 宣內饌從容談論如家人及退宮漏下曉刻矣 其眷注之深 當時邇密者 莫敢此望元容 以史官常所躬覩者如此也 世皆以公之未究大用 爲惜然 士逢堯舜之聖昭融 契遇有懷必陳者是千古英雋之彦 所未可自期而必者 則斯足爲華袞衣 而耀竹帛 名位升沈顧何足論哉公諱文會 字周卿 母夫人夢龜而生公 實英宗戊寅九月三日 幼聰雋異凡 兒始受書 問天地闢前 何所始闔浚何所終 塾師大奇之 及長文思日進 交遊皆名流 年十八 上以仁元聖母近屬召見握手稱奇 卽除官 翌日又召見錫皐比 正宗初輪對承褒敎 庚戌擢增廣文科魁 殿試例授通政階拜承旨 諭曰傳香時見着緋衣者 美少若宗室都尉問之爾也 予視爾 豈不惟先朝意乎 年幾何須盡職事 予將退目送之扈駕光陵幄次賜公酒 上發辭敎承書不停筆 上警曰 詳敏乃若是乎 久是職者莫及也及管外 上曰 某處地文識合獎用而倒乃爾耶 豈官爵由命歟 純祖初連拜承旨朝夕登 講席因文義援古今敷陳明易切必欲啓裨益 有曰我國尙氏族一人而兼衆職曠所由興也 且人主好臣其所敎 則奸進矣 君德莫先於納諫導之使言然後諍路開矣 又曰 源泉之至盈科者進取之工也 因雷異奏曰 先朝月行六對時接事詣臣願 上法先朝勤政之德 日親賢士交泰相須 則可 上動容稱善 元子宮行相見禮 公進曰 諭善僚屬必皆簡選正直而 猶不若殿下身敎之爲親切 唐宗中主也 亦且遇物 則誨殿下言動一出於正其功效 豈比於就外傳哉 上嘉納諸道聞 過期者政院察推 公請以雨澤農形邊情民隱爲式 上可之時野掖隷冒稱上敎者特命次律公力陳其不可掖隷 又犯夜侵逼巡綽者 公曰 殿下之近習 何若是無嚴請嚴治 上是之 上親宮享街炬失飭 命曹郞記過 公進曰 非軍務也 恐啓後弊 上寤立改以拿問左相李公時秀因事引入上下令躬迎初昏乘步輿出公前挽曰 儀衛不備獨先安之 仍戒御者勿進上還內 上愛公文學 命製各體 或親拈硬韻賞賜經傳衣禁中應製以 本朝李文會謝箋爲題一世榮之前後銀臺告身爲百餘通 本院條例未詳者老吏亦質公而浚行焉 長諫院賊臣權裕之獄其黨懼盤嗾一臺請速勘公論折其萌亞秋曹悖儒假懲討投文太學罪涉誣逼案未具而遽 命酌處公執不可再爭之公去事已公遇事持正不撓而亦以此多不悅者長國子課試精强主增廣東堂試秉公覆試李大史晩秀歸語人曰 澹然無物我累者惟一人盖指公也 正宗外試公授安岳郡 敎曰郡弊劇且方量田惟爾能之公自奉薄而以厚下爲先强不屈者 以義柔之相悅服虧糧者悉輸檢疇者不敢瞞歲大侵結席屋處饑民官給米使樵自食至麥熟如富公之奠區活飢峽俗不知文開書宇敎學徒 如范公之延師訓迪 其爲成川晝一前規而暇登樓賦詩居留松京錢簿虛而支調縮疎請劃付金川長湍田賦以補頒需請還減分敎官分寺官仕朔以淹滯請自白峙鎭將以固關防三者 皆難行而公言 故朝廷皆準許一營大悅 罷富民貿銀之式 革關之禁 行鄕飮之禮後持節過中京吏民壺酒迎爭擔轎以送按海西一於節愛請逋案整規禁驛濫防浦稅審刑獄伸寃枉疑者 多釋爲治舒而勿而察而勿苛自爲善 故所至人愛思之 公全義人 遠祖曰 高麗太師諱棹入 本朝有諱貞幹中樞院使諡孝靖 生諱士寬京畿監司 生諱恕長大司憲諡襄簡四傳 有諱濟臣文武全才關北兵使贈領議政號淸江三傳有諱行遠右議政諡孝貞號西華爲中興賢相 生諱萬最奉事 生諱徵海牧使 生諱德鄰郡守贈吏曹參議無嗣取從姪 諱永培爲子牧使贈吏曹參判 娶延日鄭氏學生 諱與良爲觀察使 諱始成玄孫贈貞夫人公考也 牧使諱徵楫參奉 諱德鳳公本生曾祖祖也 乙未除長寧殿參奉陞奉事直長禁府都事 乙亥丁外憂 庚戌司饔院主簿遷平署秋文科除敦寧府都正戶曹參議承政院承旨大司諫兵曹刑曹參議 癸丑出安岳郡守己未丁母夫人憂 純祖辛酉服又拜承旨 甲子拜大司成 以承旨兼帶格外異數也己巳二月惠慶宮冠回甲 由承旨進嘉善秩 敎曰始予誕降科 唱甲者也 除副摠管漢城府左右尹兵曹參判同義禁 辛未除同經筵戶曹參判冬至副使 癸酉除同中樞禮曹參判成川府使戊寅爲同春秋 己卯爲開城留守 辛巳爲同敦寧 壬午拜刑曹參判黃海道觀察使 丙戌除吏曹參判都承旨 丁亥翼宗代理拜大司憲兼承文院司譯院奉常寺氷庫提調官銜多疊徑而 諫長泮長尤屢 戊子六月十三日考終 享年七十一訃聞吊賻 備禮九月四日葬北部城山里參判公墓右枕癸之原 配貞夫人靑松沈氏正言商賢女 參判枰玄孫嘉柔有至行治御有制度其動有法其施之各有宜田園祿俸用度皆有節隣尙之李宗家法 公之理家實內助爲多男 玄緖今參判 玄緖男根弼今修撰 女進士尹兢圭 根弼子女幼 兢圭子泓鎭 女韓明敎鄭寅健 嗚呼 公內坦易而外峻整官 臨事愼重 不輒發發之不回撓其要 歸於寬厚 事親孝 侍病血指 及喪毁瘠踰制祀必以誠篤 友弟藩俸盡付之曰 如吾儉也 公儉素如寒士 朝退對書冊罕出門常有退休田野想 自少經史 多常誦者 爲文不尙華藻 而暢達理到 尤長於騈儷 有遺集略干卷藏于家 公有文而不率施於朝廷 有器而不見用於廊廟 繩墨自守檢身之律也 圭角不露處世之符也 在家而家道齊 在官而官政著 惟其自信而不隨世脂韋 故雖不能騰薰赫然 以聖主則哲之 明寵遇出常 始終不替視世之尊顯 以無所稱者何如也 古人人主一言 爲終身之榮 如公者其可謂 渭不遇者耶銘曰 弗弗磯弗汶汶而苟依 弗學于世 而學于古 弗外之鶩而內必顧維 其懇樸懿之 常奏徵之遜汲戇 上曰龍夙夜出納長侍宣室之對延英之講 遽伯玉止車之行仲山甫補袞之誠 進則結昭主之隆契 退則守法家之淸聲人謂公淹識宏辭之才胡不山龍藻火之象 又謂公德密練達之器 胡不霖雨舟礪之望我則謂風雲之際日月之側 何有乎 紆金紫而列鍾鼎薔于位 而羸後祿若之蘊而如錦之 子若孫之繼顯 而守範神所報者 此可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