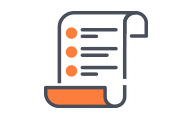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묘갈문
나의 선부군(先府君)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29년이나 되었으나 묘소에 아직까지 행적을 새긴 비명을 세우지 못하였는데 불초한 우리 형제는 벌써 모두 노쇠한 나이에 접어 들었다. 만약 이 시기에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후세에 그 어른의 덕업을 고증할 근거가 없게 될 것이 두려워 삼가 관력(官歷)과 사적(事蹟)의 대략을 엮어 눈물을 머금고 삼가 쓰는 바이다.
부군(府君)의 휘(諱)는 익회(翊會)이고 자(字)는 좌보(佐輔)요 호(號)는 고동(古東)이다. 이씨의 관향은 전의(全義)이니, 시조는 고려 태사(太師) 휘 도(棹)이다. 이 뒤로부터 관작과 학행이 서로 이어지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휘(諱) 정간(貞幹)은 벼슬이 중추원사(中樞院使)이었는데 100세 되신 모부인(母夫人)을 극진히 섬기어 시호를 효정공(孝靖公)이라 하였고, 여러 대를 내려와서 휘 제신(濟臣)은 문과에 급제하고 북병사를 지냈으며,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는데 문장과 절의가 한 시대를 덮을 만하였으니 세상에서 청강 선생이라고 추앙하였다. 4대를 지나서 휘 만웅이 황해 감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으며 호(號)를 몽탄이라고 하였으니 이 어른이 부군의 고조이고 증조의 휘는 징하이니 지돈령부사로서 좌찬성으로 추증되었으며, 조(祖)의 휘(諱)는 덕재(德載)이니 사간원(司諫院) 정언을 지냈으며 이조(吏曹) 참판(參判)으로 추증되었고, 고휘(考諱)는 득배(得培)이니 이조 참의로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비는 정부인으로 추증된 평산신씨이니 교리(校理) 휘(諱) 정하(靖夏)의 딸로서 위로 두 대代에 증직의 의전이 있었음은 부군이 귀한 지위에 오른 까닭이었다.
생가의 조(祖)의 휘(諱)는 덕현(德顯)이니 밀양(密陽)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이조(吏曹) 참판(參判)으로 추증되었는데 증참판 정언공의 동생이고, 고휘(考諱)는 약배(樂培)이니 동지 돈령부사이며, 비는 정부인으로 추증된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니 부사(府使) 휘 정헌(鼎獻)의 딸이며, 아들 한분을 두었는데 휘는 정회로서 진주 목사를 지냈고, 계비는 정부인 해주오씨이니 학생(學生) 정(珽)의 딸인데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이 어른이 즉 부군이다.
부군께서는 영조 정해년(1767) 2월 8일에 출생하시었는데, 천자가 빼어나고 기이하며 말씀하시는 품이 더디고 중후하여 보는 사람들이 모두 원대한 포부를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신유년(1801)에 사마시의 일등에 뽑히고, 임술년(1802)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영희전(永禧殿) 참봉으로 임명되고 사복시를 거쳐 호조의 낭관을 지내고, 갑자년(1804)에 임실(任實) 현감(縣監)이 되었으며, 병인년(1806)에 김제 군수로 전임되고, 신미년(1811)에 정시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기묘년(1819)에 통정대부에 승진되었으며, 정해년(1827)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었고, 경인년(1830)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뽑히었다. 처음부터 정리하여 보면 먼저 시강원을 거쳐 정언 헌납 홍문관 수찬(修撰)을 거쳤고, 응교에 올라갔다가 승정원 승지(承旨) 이조•예조•공조 참의•대사간(大司諫)•대사성•돈령부 도정 등은 통정대부 품계 때의 관직이고, 대사헌•홍문관•예문관 제학•세자 빈객(世子賓客) 등은 선직(選職)이며, 경연 춘추관•의금부사총관 주사(籌司) 당상(堂上)•전의감 제조(典醫鑑提調)•지실록사(知實錄事) 등은 겸함(兼啣)이고, 동지 정사(正使)는 왕역(往役)이며, 안동 부사•황해 감사•수원 유수 등은 외직이었다.
병신년(1836)에 기사(耆杜)에 들어갔으며, 계묘년(1843) 11월 10일에 정침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이때 나이가 77세이었고, 갑진년(1844)에 용인현(龍仁縣) 번산리(樊山里)에 장사지내었다가 자리가 좋지 않아서 병오년(1846)에 양주 양정리(陽正里) 자좌의 언덕으로 이장하였으며, 계해년(1863)에 문간공(文簡公)이라고 시호(謚號)가 추증되었다. 부군(府君)께서는 큰 키에 헌칠하며 이마와 미목이 훤하게 트이고 깨끗하고 맑으시며 밝고 고요한 천품을 지니시었다. 어버이를 극진히 받들어 어버이가 마음먹는 방향에 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받들었으며, 생가의 부모인 돈령공(敦寧公)과 오부인(吳夫人)이 함께 장수를 누리시었지만 가정이 항상 화기가 융융하였고, 백부인 목사공께서는 순수(舜粹)한 효행이 있다고 이름이 알려진 어른인데, 어렸을 때부터 스승처럼 지성껏 받들어 늙어갈수록 은애로 대하는 품이 더욱 독실하였다.
신사년(1821) 가을에 전염병이 널리 퍼지더니 목사공께서 이에 걸려 호되게 앓아 누우니 마을과 집안 사람들이 멀리 피하였지만, 그러나 부군께서는 극진히 간호하여 그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다가 마침내 상을 당하였는데 정의와 예제를 다하여 초종을 치루었다. 동생들이나 누이들로부터 서제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 자녀들의 시집 장가 보내는 일과 독립하여 살도록 하는 데까지도 살피지 않은 일이 없으니 가정에 있을 때의 윤리에 돈독하기가 이와 갔았다. 김제 군수로 있을 때 큰 흉년을 만나 계획을 세워 구제하여 가는데, 온 관내가 거리에서 쓰러져 죽어야 할 형편인 것을 요와 이불까지 처분하여 겨우 살려 나갔더니, 가을이 되어 풍년이 드니 어느 백성이 자루에 쌀을 담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생명을 보전하게 되고 또 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모두 군수님의 덕택입니다. 지금 삼가 이 곡식을 바치는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 군수님께 알리려는 생각에서 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사(籌司)에 있을 때에는 청렴하고 신중하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다스리었으므로 매양 벼슬이 갈리어 돌아오면 백성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서 칭송하였지만, 집에는 저축한 재물이 없었고 여러 번 세자시강원과 경연(經筵)에서 왕이나 세자를 모시고는 문득 옛일 중에서 다스리는 이치에 적당한 말을 인용하여 간곡히 그 뜻을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하니, 당시에 진정한 강관이라는 칭송이 높았다. 벼슬살이 하면서 그 충성과 사랑을 겸하여 바치기를 이처럼 하였다. 문장과 한문이 모두 독특한 구상과 체의 묘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름을 노출시키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아는 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였다. 사람들과는 화하고 후하게 사귀고 접촉하며 무엇이든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아니하였고, 아름답지 못한 일을 보면 반드시 의리로 타일러서 굳세고 높은 뜻을 보이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해년(1827)에 익종(翼宗)이 대청중(代聽中)에 내시가 종이를 가지고 와서 빈지(賓旨)라고 전하면서 병풍 글씨를 써 달라고 하며 재촉이 성화같았다. 부군께서 얼굴빛을 고치고 말씀하시기를
『영지令旨는 마땅히 춘방(春坊)으로부터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은 사리와 체통에 어긋나는 것이니, 내가 그 명령을 받들 수 없다.』고 거절하니, 내시가 돌아가서 다시 춘방(春坊)에게 격식을 갖추어 지시가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써서 올렸다.
평소에는 문을 닫아 걸고 손을 물리치고 문에 발을 치고 깊숙한 곳에 단정하게 앉아서 간소한 책상, 떨어진 자리에 좌우에 도서를 쌓아놓고, 일체의 명리와 득실은 전혀 잊은 듯이 무관심하였다. 옛날 영선(瀛選) 때에 당무자(當務者)들의 의견이 부군께서 음관(蔭官)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한 차례의 추천은 늦추어야 한다고 하여 드디어 뒤로 미루어 천거하지 않았는데 그때 불초한 내가 마침 부군을 모시고 서 있다가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니,
부군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일에 대하여 무심할 수 있는데 너는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하느냐? 사람이 진취(進取)하는데에 임하여 진실로 일득일실에 기쁘고 섭섭함을 참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찌 고요하고 편한날이 있겠느냐?』고 하셨다.
둘째 아들 흥민(興敏)이 일찍이 성균관시에 응시하였는데 주사主司가 선발할 생각을 가진 듯하였다. 시험이 다 끝나는 날 부군께서 사람을 시켜 흥민(興敏)을 불러 들이고 말하기를『들으니 네가 아무와 성적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만약 선발(選拔)하는데 너는 급제하고 아무는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 심중이 어떠하겠는가?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 양보하여 그 어버이를 위로하게 하는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서로 앞뒤를 다투어 경쟁하는 마당에 능히 이와 같이 초탈(超脫)한다면 내 마음이 기쁘기가 한량없을 듯하니 어찌 한번의 자신의 낙선(落選)에 비길 것인가?』라고 하였다.
주사가 그 시권(試券)을 열어보고 마침내 응하지 않았다. 불초한 아들들이 삼가 유훈을 지키어 도리에 어긋나는 길로 진출할 수 없어 밤낮으로 전전긍긍(戰戰兢兢)조심하여 항상 부군께 옥됨이 있을까 하여 두려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다.
아! 슬프다 첫 부인은 정부인으로 추증된 광산김씨이니 군수(郡事) 두항(斗恒)의 딸로서 어진 어른이었는데 무후하였고, 묘는 양근(楊根) 수회리(水回里)의 선산하에 있다.
계비는 정부인 해주최씨이니 학생(學生) 도행(道行)의 딸인데 장후(莊厚)하고 근검하여 일찍부터 부덕이 갖추었었고, 아들 형제 딸 하나를 두어 맏아들은 시민이니 현재 참판이고, 다음은 흥민(興敏)이니 현재 판서이며, 딸은 안동김보근에게 시집갔으니 전판관(前判官)이고 서녀(庶女) 하나가 있는데 연안김욱연(延安金勖淵)에게 시집갔다. 시민은 아들이 없어서 흥민의 아들 근명으로 후사를 삼았는데 현재 한림(翰林)이고, 흥민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 근명은 큰집으로 입사하였고, 다음은 근수이니 생원이며, 맏딸은 민석호(閔奭鎬)에게 둘째딸은 조세희(趙世熙)에게 각각 시집갔으며, 서녀 하나는 김병려(金炳驪)에게 시집갔는데 현령을 지냈고, 김보근(金普根)의 아들은 병식(炳軾)이 있으며, 근명(根命)과 근교(根敎)의 아들은 모두 어리다.
불초 남 시민(時敏)이 피눈물을 뿌리면서 삼가 지음.
|
|
|
古東公 諱 翊會 墓碣文
我先府君卽世○今二十有九載○墓道尙闕顯刻○不肖兄弟○俱己衰暮○失今不圖○竊恐後之考德無所○謹擧官歷事行之警○涕泣而書之○府君諱翊會○字佐輔號古東○我李籍全義○上祖高麗太師諱棹○自後宦學相承○入本朝○有諱貞幹○官中樞院使○善事百歲母○諡孝靖公○屢傳而至諱濟臣○文科北兵使○贈領議政○文章節義○冠冕一代○世稱淸江先生○四傳諱萬雄○黃海監司○贈吏曹判書號夢灘○寔府君高祖也○曾祖諱徵夏○知敦寧府事贈左贊成○祖諱德載○司諫院正言○贈吏曹判○考諱得培○吏曹議○贈吏曹判書○騙贈貞夫人平山申氏○校理諱靖夏之女○兩世推恩以府君貴也○本生祖諱德顯○密陽府使○贈吏曹判○正言公之弟也○考諱樂培○同知敦寧府事○騙贈貞夫人南陽洪氏○府使諱鼎猷之女○擧一男○諱靖會○晉州牧使○繼騙貞夫人海州吳氏○學生諱珽之女○擧一男○卽府君也○府君以英廟丁亥二月八日生○天資秀異○語言遲重○見者皆以遠大期之○辛酉選司馬試一等○壬戌筮仕 永禧殿奉○歷司僕○戶曹諸司郞○甲子出爲任實縣監○丙寅轉金提郡守○辛未擢庭試丙科○己卯陞通政○丁亥晉嘉善○庚寅擢資憲○先入侍講院正言○獻納○弘文館修撰○至應敎○承政院承旨○吏禮工三曹議○大司諫○大司成○敦寧都正○通政職也○禮曹工曹判○嘉善職也○禮刑工三曹判書○漢城判尹○知中樞府事○資憲職也○大司憲○弘文藝文館提學○世孫賓客○選職也○經筵春秋館義禁府事摠官○籌司堂上○典醫提調○知實錄事兼啣也○冬至正使往役也○安東府使○黃海監司○水原留守○外職也○丙申入耆杜○癸卯十一月十日考終○享年七十七○甲辰葬于龍仁縣樊山里○宅兆不利○丙午移奉于楊州陽正里負子之原○癸亥贈諡文簡公○府君琺然脩幹○眉宇疎朗○粹潔洞澈○明允簡謐○天品然也○事親有至性○親意所欲○缸力承○奉同敦寧公吳夫人俱享大鮎○而家庭恒融融如也○伯氏牧使公○以純孝聞○自童幼奉爲師資恩愛○老而彌篤辛巳秋輪漁遍熾○牧使公菱患方極○族里皆避遠○府君扶護不暫離○及其終事○情禮備至○諸弟諸○妹至于庶弟妹一視均愛○以及其子女○嫁娶而成立○靡不盡心○在家而篤於倫義者如此○其贇提郡値歲大侵○經劃佾濟○擧闔境溝壑之命○而奠之殉席○及秋登熟○民有啣米而庭者曰○吾屬之保有今日慶○此韶黍皆侯之賜也○今以是獻○欲我侯之知吾屬有此樂也○以至蕃司居留○爲政淸愼○公嚴每解官而歸○民頌遺愛家○無餘資○屢侍胃筵經席○輒引前言古事之切於治理者○委曲敷陳○務陳納約之義○時以眞講官稱之○在官而盡其忠愛者如此○文章翰墨俱有獨臻之妙○而不欲近名○斂而晦之○未嘗以一能自居○接人和厚○與物無競○而遇有不庇○必以義理裁之○毅然無撓奪○丁亥翼廟代聽○中涓人蒻紙來○傳睿旨彭寫進屛書甚促○府君改容曰○令旨堂自春坊下○今以口宣○事穿苟簡○不敢奉承○炳人歸而剡自春坊下○始爲書進○平居度門却軌篇閣○冗邃 免敞○薦左右圖史○一切名利得失○泊然無所累記○昔瀛選○時時議以府君○由蔭進當○遲一選○遂置不擧不肖適侍立○不覺形于色○府君莞爾曰○吾則無心○汝以是動心乎○人於進取○苟不耐一得一失○方寸豈有寧靜時乎○仲子興敏○嘗赴泮試○主司屬意選拔○乃於畢試之日○府君赴慌召還曰○聞若與某人相上下○若能中選○某人當屈○今且讓諸彼○彭得慰其親○不亦可乎○趨競之地能自超脫○吾心喜悅○豈止一解己也○主司趣其券○竟不應○意不肖等謹守遺訓○亦不敢非道進○而蚤夜兢兢○恒有贊之懼焉○嗚呼痛矣○初配贈貞夫人光山金氏○郡事諱斗恒女○賢而無育○墓在楊根水回里先山下○繼配貞夫人海州崔氏○學生諱道行女○莊厚勤儉○夙有懿範○生二男一女男○長時敏○今判○次興敏今判書○女適安東金普根前判官○庶女一○適延安金勖淵○時敏無育○取興敏子根命○爲後○今翰林○興敏二男二女○男長根命○入嗣長房○次根敎生員○女長適閔奭鎬○次適趙世熙○庶女一適金炳驪縣令○金普根○男炳軾○根命根敎有子皆幼○不肖男時敏泣血謹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