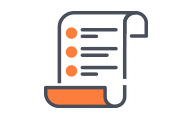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묘표
순조21 신사년(1821)에 중국에서 들여온 이른 바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우리나라 경종(景宗)때의 신사사화(辛巳士禍)무렵의 사건으로서 저궁(儲宮)을 봉할 때에 4대신 곧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饋命) 조태채(趙泰采)등이 모두 망극(罔極)한 무고를 입었고, 저위(儲位)를 핍박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까지 게재(揭載)하였는데, 조정에서 전권대사(全權大使)를 보내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여러 번 사신임명을 바꾼 끝에 결국 판서 이공(李公) 호민(好敏)에게 이 사명을 맡겼으니, 이것은 공이 사석(師錫)으로의 명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이 나라일을 감히 사사로운 일로 거절할 수 없어, 명령을 받은 즉시 중국에 들어가 해당부에 정자(呈咨) 제출(提出)하였다. 처음에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공이 곡진하게 사실을 설명하여 잘 이해시킴으로써 마침내 우리나라 소청을 쾌히 승낙하게 되자 우리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깨끗이 씻기었는데, 그 때부터 공의 이름이 온나라안에 떨치었다.
공의 자(字)는 학여(學余)요 호는 구헌(龜軒)이니 전의(全義)의 대성(大姓)출신이다. 시조는 고려 태사 휘 도(棹)이며 여러 대를 지나 청강(淸江)선생 휘 제신(濟臣)에 이르러 문장과 기절이 높아 선조조의 명신이었으며 벼슬이 북병사에 이르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4대를 지나서 휘 만웅(萬雄)은 호(號)는 몽탄(夢灘)이며 벼슬은 감사(監司)를 지냈고 청표준망(淸標俊望)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았으니 공은 그 5대손이다. 고조의 휘는 징하(徵夏)이니 지돈령(知敦寧) 부사(府事)이고, 증조(曾祖)의 휘(諱)는 덕부(德孚)이니 승지를 지내고 이조 참판으로 추증되었으며, 조고(祖考)의 휘(諱)는 원배(元培)이니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고, 고(考)의 휘(諱)는 단회(端會)이니 부사를 지냈으며 좌찬성으로 추증되었다. 비는 연안김씨이니 사간(司諫) 재천(載天)의 딸이요, 청주정씨는 학생 택빈(宅彬)의 딸이니 모두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으니 이상 3대는 모두 공에 대한 은전이 조상에게 미친 증직이었다.
공이 생가(生家) 아버지의 휘는 장회(章會)이니 이조 판서로 추증되었는데 즉 찬성공의 종제이고 공은 그 장남이었다. 공은 영조 임오년(1762) 10월 29일에 출생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모습과 거동이 범상한 아이들에 뛰어나서 장난하고 놀 때에는 아이들을 지휘하여 엄연하게 기율이 있었으니 보는 사람이 기특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차차 자라나며 기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지식과 사고가 탁 트이고 명민하여 공보(公輔)가 될만한 인재로 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순조 신유년(1801)에 정시에 급제하여 괴원(槐院)에 소속되어 주서로 6품에 승진되었고, 임술년(1802)에 정언(正言)으로 옮기어 소(疎)를 올려 성학(聖學)의 학문에 힘쓰고 기강을 세우는 요체를 진술하였다. 병조 정랑•몽학교수(蒙學敎授)•훈국(訓局)•실록낭청 종사를 거쳐 홍문관에 뽑히어 부수찬이 되어 경연(經筵)에 출입하면서 잠규(箴規)대로 일을 처리하니 임금께서 특별히 어정(御定)한 사부수권(四部手圈)을 하사하였고, 내전에서는 겹옷 한 벌을 하사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특별한 대우이었다. 10월에 헌납(獻納)으로 임명되었는데 겨울에 천둥이 있어 이에 대하여 왕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의 경고로 알고 모든 일에 조심하여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말씀이 간절하고도 솔직(率直)하였다. 부교리(副校理)로 옮겨 있을 때에 대계(臺啓)에 대하여 비답(批答)하시지 않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공이 또 항의하여 소를 올려 말하기를
『개국이래 400년 동안에 비답을 받잡지 못한 예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가납(嘉納)된 일이 있었다. 곧 이어서 관서(關西)의 경시관(京試官)으로 임명되었지만 바꿔줄 것을 아뢰어 사임되었다.
갑자년(1804)에 숙선옹주의 가례도청(嘉禮都廳) 일을 본 후 통정대부에 승진되어 형조 참의로 임명되었다가 동부승지로 옮기었고, 을축년(1805)에 이조•예조의 참의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병인년(1806)에 황해 감사가 되었다가, 무진년(1808)에 체임遞任되어 돌아왔다. 이로부터 좌승지로서 거의 빈틈이 없이 바쁘게 일하였다. 기사년(1809)에 원자元子가 탄강하였음으로 예방 승지(禮房承旨)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어 동의금 호조 참판 부총관 한성(漢城) 우윤(右尹)이 되었고, 신미년(1811)에 강원(江原) 감사(監司)로 임명되었다. 겨울에 남쪽의 홍경래난이 있었고 또 흉년마저 들어서 민정이 대단히 급박하게 되었다. 공이 있는 힘을 다하여 잘 다스리어 한사람도 그 구제의 은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였으며, 무릇 세금이나 환상還上의 잘못 처리되는 예를 고치고 부과금곡을 일체 경감시키었더니, 온 경내가 감사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 뒤 10여년이 지나 공이 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명주와 무명들을 다투어 부조(賻助)하였으니, 얼마나 인심을 얻었기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사모되었을가?
계유년(1813)에 이조(吏曹) 참판(參判)으로 들어와서 바로 도승지로 임명되었는데, 이때에 임금께서 병환으로 항상 조섭중에 있으시었는데 공이 도승지로서 약달여 바치는 일을 겸하여 궁중을 떠나지 않고 숙직하면서 매양 탕제를 진어(進御)할 때에는 침전밖에 엎드려서 동정을 살폈는데 비록 깊은 밤이라도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본디부터 산증이 있었는데도 추위를 무릅쓰고 통촉하는 정성의 종시가 하루 같았는데, 그 노고를 고맙다고 하고 구마와 표피를 하사받았다.
을해년(1815)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되어 차비국(差備局) 당상(堂上)을 겸하고 있다가 한성(漢城) 판윤(判尹)으로 임명되었고, 또 공조 판서로 옮기어 지의금부사를 겸하였다.
병자년(1816)에 가순궁(嘉順宮) 수빈(綏嬪)박씨의 상을 당하여 초상일을 열심히 살핀 공로로 정헌대부로 가자(加資)되었고, 정축년(1817)에 이조(吏曹) 판서(判書)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네 사람을 추천(推薦)하였는데 공이 우두머리를 차지하여 은전으로 이조(吏曹) 판서(判書)가 제수되었는데 사헌부에서 글을 올려 일시에 넷씩 추천하는 것은 과람한 일이라고 논하니, 공도 옳지 아니한 추천에는 응(應)할 수 없다하고, 강교에 물러나가서 소를 올려 굳이 사양하니 왕께서 벼슬을 삭파하고 귀양보내라는 명령이 있기까지 하였다가 다시 용서하기를 네번이나 되풀이 하였는데, 왕께서는 진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니 그대로 고집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다시 나오니 공의(公議)에서 결정한 것을 사견으로 스스로 불응하였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이원(梨院) 제거(提擧)로 있더니 어떠한 일로 체파(遞罷)되었다가, 바로 좌참찬(左參贊)으로 임명되었다.
임오년(1822) 봄에 중국사신으로 들어 갔다가 돌아와 복명하니 극진하게 포상하여 질(秩)을 숭정대부(崇政大夫)로 높이고, 예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 혜민서(惠民署) 제조로 임명하였고, 계미년(1823)에는 휘경원(徽慶園)을 돈장(敦匠)한 공로로 숭록대부로 가자(加資)되었고, 왕명을 받아 북쪽의 여러 능을 봉심하고 돌아와 형조 판서로 임명되었다.
공이 참좌(佐)로 부터 장석(長席)에 이르기까지 주로 추조(秋曹)에 있었는데 청단(聽斷)를 심리(審理)하고 결정(決定)함이 공정엄숙(公正嚴肅)하고 법률적용이 흔들림이 없어서 도하(都下)가 숙연(肅然)하였다.
이 해 12월 4일에 62세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고가 정부에 알리어지자 예에 의하여 조문과 부조가 있었고, 순조(純祖)께서 등극(登極)하신 즉시 효헌공(孝獻公)이란 시호를 내리었다. 처음에는 양근 백포(白浦)에 장사지내었다가 뒤에 같은 군의 가좌곡 임좌 언덕으로 이장하였으며, 정경부인 김씨를 부장(蟄葬) 합폄(合哮)하였다. 공께서는 청강공의 유범(遺範)을 잘 지키어 효성과 우애로 가정을 다스리고 충성과 근면의 업적이 외부에 드러났는데 특히 이론이 날카롭고 정확하여 아무리 얽히고 설킨 어려운 일로서 여러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도 공은 옹용雍容하게 처리하여 성기(聲氣)를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녹을 먹으면서 맡은 일에 게으른 것은 임금을 섬기고 몸을 닦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생을 벼슬살이 하였어도 쉽고 어려운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힘을 기울여 중앙과 지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였다. 심지어 각박한 세속의 악착스러운 일을 더러운 물건보듯하며 명민하게 급한 일을 도와주고 궁한 사람을 구하여 주어 은의가 두루 미치였고, 가까운 인친족척(姻親族戚)에서 부터 아래로 서리(胥吏)나 하인에 이르기까지 그 턱택을 입지않은 사람이 없으며 사람마다 기쁘게 하여 주었다.
영초(潁樵) 김병학(金炳學)이 일찍이 공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충후(忠厚)하고 돈실(敦實)한 품이 일대의 거인장덕鉅人長德이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공을 알고 하는 말이며 아무도 그 말이 틀렸다고 이의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 거룩도 하여라.
김부인은 본관이 안동인 돈령도정(敦寧都正) 이규(履珪)의 딸이니 단정하고 정숙하여 부덕에 어긋남이 없었고, 공보다 1년 먼저 나서 공보다 14년을 더 살았다. 아들 형제 딸 하나를 두니, 맏아들은 근오(根五)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이조(吏曹) 판서(判書)로 추증되었으며, 다음은 근우(根友)이니 계부(季父)의 후계로 들어 갔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고, 딸은 판서 박주수(朴周壽)에게 시집갔다.
측실의 소생으로 아들 근윤(根允)과 사위로 현감 장돈근(張敦根)이 있다. 큰아들 집에 아들이 없어서 정로(正魯)를 후계를 삼았는데 현재 판서(判書)이며 감사공의 동생 만종(萬鍾)의 칠대손이고, 이조(吏曹) 참판(判)으로 추증된 근두(根斗)의 둘째 아들이다.
출계한 근우(根友)의 아들 승로(升魯)는 도사(都事)이고, 기로(箕魯)는 참봉이며, 딸은 김명균(金命均)과 김상규(金尙圭)에게 각각 시집갔는데 김상규는 참판이다. 또 측실 소생으로 맏이 두로(斗魯)는 학관(學官)이고, 둘째는 익로(翼魯)이며, 딸은 안숙(安淑)에게 출가하였는데 학관(學官)이다. 근윤(根允)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경로(慶魯)는 오위장이고, 응로(應魯)는 사과(司課)이다. 사위 박주수(朴周壽)의 아들은 판서 제헌(齊憲), 진사(進士) 제완(齊完), 판서(判書) 제인(齊寅)이 있고, 딸은 참판 홍순대(洪淳大)에게 출가하였다.
내외 증손과 현손의 적서출이 약간있으며, 정로(正魯)가 또 사자(嗣子)가 없어 기로(箕魯)의 아들 능세(能世)로 후사를 삼아 2대나 단사된 가계를 이었으니 아직 가문의 음덕(蔭德)이 끊어지지는 아니함이라 하겠다. 공의 세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외종의 줄에 끼어 있는 공의 덕망을 듣고 흠모하기로는 남보다 배나 더한 터인데, 이 일을 위하여 정의로 보아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공의 행장 등을 참고로 하여 개략을 위와 같이 모아 쓴다.
대광보국숭록대부 치사(致仕) 봉조하 은진 송근수(宋近洙)가 지음.
|
|
|
孝獻公 諱 好敏 墓表
父我純廟二十一年辛巳○燕購有所謂文獻通考○載國朝景廟辛壬事○而冊儲時四大臣○皆被罔極之誣○至逼於儲位○朝廷將專价辨正○而難其人○屢更使命○末乃屬之判書李公好敏○盖用師錫之望也○公以王事○不敢言私○聞命卽行○到燕呈咨該部○始頗持難○公委曲開陳○竟得竣請邦誣快伸○於是公之名○聞於一世○公字學余○號龜軒○全義大姓○始自高麗太師諱棹○屢傳至淸江先生諱濟臣○以文章氣節爲宣廟朝名臣○官至北兵使贈領議政○四世而有諱萬雄○號夢灘○官監司○淸標俊望○爲世所推○公其五代孫池高祖諱徵夏○知敦寧府事○曾祖諱德孚承旨○贈吏曹判○祖諱元培○贈吏曹判書○考諱端會○府使贈左贊成○騙延安金氏○司諫載天女○淸州鄭氏學生宅彬女○俱贈貞敬夫人○以上三世皆公推恩也○本生考諱章會○贈吏曹判書○卽贊成公從弟○而公其長男也○以英宗壬午十月二十九日生○自幼氣貌擧止○超出凡兒○其遊戱部分指揮○儼有紀律○見者異之○及長○器量寬弘○知慮通敏○莫不以公輔器期之○純廟辛酉○擢庭試文科○隸槐院以注書○陞六○壬戌拜正言○疏陳勉聖學立紀綱之要○歷兵曹正郎○學蒙敎授○訓局從事○實錄郞廳○選弘文錄○爲副修撰○出入經筵○隨事箴規○上特賜御定四部手圈○內殿又下表裏○皆異數也○十月拜獻納○因冬雷應旨進戒○語甚切直○移副校理○時有臺啓○不賜批還下公○又抗疏言○四百年所無○承溫批嘉納○旋拜關西京試官○辭遞○甲子以淑善翁主嘉禮都廳○陞通政○拜刑曹議○移同副承旨○乙丑歷吏禮曹議○大司諫○丙寅出按黃海道○戊辰遞歸○自是佐承宣○除旨此翩○殆無虛月○己巳元子誕降○以禮房承旨○陞嘉善○爲同義禁○戶曹判○副摠管○漢城右尹○辛未○拜江原監司○冬有西警○歲且飢荒○民情急於焚溺○公皆悉心懷綏○一無捐 ○凡係營納謬例○一切懼減○全境頌其惠○後十餘年○聞公之喪○爭出紬綿以賻之○苟非入人之深○何以有此○癸酉○入爲吏曹判○旋拜都承旨○時上候恒在靜攝○公以都令職○兼嘗藥不離禁直○每進湯劑○詣伏閤外○雖至夜深○不敢退○素患疝積○購寒闖肆而洞屬之誠○終始如一日○以其勞○賜廐馬豹皮○乙亥擢資憲○仍兼知申差備局堂上○拜漢城判尹○移工曹判書○知義禁○丙子以嘉順宮喪○敦匠勞○加正憲○丁丑拜吏曹判書○時新薦四人○公首蒙恩○除而臺章○以一時四剡謂之濫屑○公以爲不可○冒應退伏江郊○陳疏力辭○至有竄削之命○尋降異敍○如是凡四○次上意必欲○不捨進退縮蹙不獲己湊勉出肅○恢公黜私爲世○暾磻而不少顧聞○以梨院提擧○因事遞罷○旋敍拜左贊○壬午春○燕使復命○吻加褒賞○進秩爲崇政○拜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惠民署提調○癸未用徽慶園敦 勞○加崇祿○承命奉審北路諸陵○還拜刑曹判書○公自佐○至長席○多在秋曹○聽斷公嚴○按法不撓○都下爲之肅然○是年十二月四日○壽六十二而考終○訃聞○吊賻如例○今上初○賜諡孝獻○始葬楊根白浦○後移哮于同郡嘉佐谷負壬原○貞敬夫人金氏蟄○公克遵淸江公遺範○孝友之行篤于內○忠勤之績著于外○尤長於煙理遇事盤錯 衆所却顧○公則雍容措處○不煩聲氣○嘗曰食焉而怠其事○非事君致身之道故一生居官○不擇夷病缸竭中外○盖多賢勞○至於薄俗齷齪之事○視之若雀○周急恤窮○恩義周匯○自姻親族戚○以至胥英鞫從○無不飽德○各得其歡○潁樵金相公炳學○嘗稱其忠厚篤實○爲一代鋸人長德○此固知公之言○而人無間然○嗚呼庇哉○金夫人籍安東○敦寧都正履珪女○端莊貞淑○配德無違○生先公一歲○沒後公十四年○擧二男一女○男長根五早卒○進士贈吏判○次根友爲季父後○文判書○女適判書朴周壽○曰根允○及縣監張敦根○側出子晦也○長房無嗣○以正魯爲后○今爲判書○乃監司公之弟諱萬鍾之七代孫○贈吏○諱根斗之第二子也○過房男升魯都事○箕魯奉○女適金命均○金尙圭判○曰斗魯學官○曰翼魯○曰安淑學官○其側出也○根允二男慶魯○五衛將應魯司果○曰判書齊憲○進士齊完○判書齊寅○適判洪淳大者朴出男女也○內外曾玄嫡庶摠若干○而正魯又無嗣○以箕魯之子能世爲后○再絶而紹○將見其未艾也○歟公墓尙無刻○主竣孫判書將樹表于徑彭○余記其陰○余生也晩○雖未及公之世○而贊在表從之列○誦慕之私○有倍○余人於斯役也○誼何敢辭○遂就其狀而撮其警如右云○大匡輔國崇祿大夫致仕奉朝賀○恩津宋近洙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