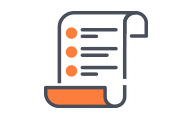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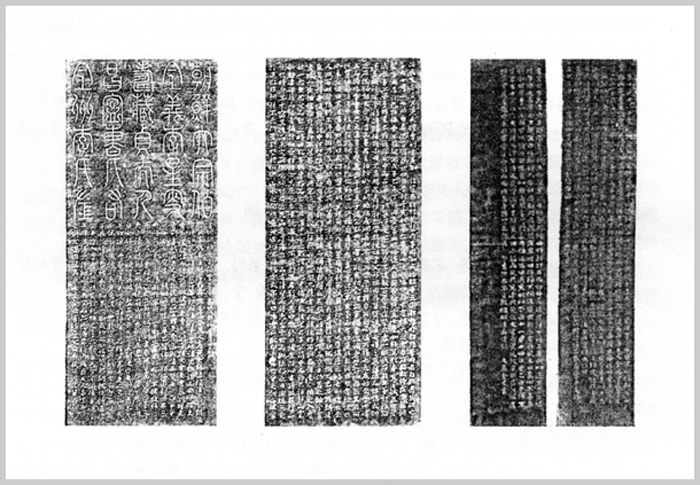
성수공 휘 현서 비
비명과 서문
성수(星叟)의 성은 이씨요, 이름은 현서(玄緖)요, 자는 치장(稚長)이며 호는 성수이다. 전의(全義 ) 사람으로서 고려 태사(太師) 도(棹)의 후예이다. 본조의 청강 선생(淸江先生)이 있는데 휘(諱) 제신(濟臣)이다. 상국(相國) 서화(西華)의 휘(諱)는 행원(行遠)이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덕린(德鄰)으로 금산군수(錦山郡守)를 지냈으며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증직(贈職)받았다. 조(祖) 영배(永培)는 황주목사(黃州牧使)을 지냈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증직 받았다. 고(考)의 휘(諱)는 문회(文會)로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증직 받았다. 비(妣) 정부인(貞夫人)은 청송 심씨(靑松沈氏)로 정언(正言)을 지냈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증직 받은 휘(諱) 상현(商賢)의 따님이다. 정종(正宗=정조) 신해(辛亥, 1791) 10월 7일에 늙은이(叟)가 태어났으며 순조(純祖) 병자(丙子, 1816)에 생원(生員)이 되었고 신사(辛巳, 1821)에 현륭원(顯隆園) 참봉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사과(司果)에 올랐고 전설사(典設司), 호조(戶曹), 영희전(永禧殿), 돈녕부(敦寧府), 종묘(宗廟)를 거쳤으며 영동현감(永同縣監)으로 나갔으나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불편하여 곧 돌아왔다. 헌종(憲宗) 무술(戊戌, 1838)에 호조정랑(戶曹正郞)이 되었고 양성현감(陽城縣監)으로 나갔다가 판서가 주청하여 고양군수(高陽郡守)가 되었는데 사안 때문에 박탈당했다. 대신(大臣)의 청으로 관직에 돌아와서 공주목사(公州牧使), 울산부사(蔚山府使), 충주목사(忠州牧使) 등 다섯 차례 관직이 바뀌었는데 모두 계청(啓請)하여 발탁된 것이었다. 갑진(甲辰, 1844)에 증광문과에 합격하였으며 준직(準職)에 등용되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성상(聖上 : 철종) 계축(癸丑, 1853)에 세폐사(歲幣使) 부사(副使)가 되었으며 인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무오(戊午, 1858)에 독옥책관(讀玉冊官)에 서용되어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으며, 경신(庚申, 1860)에 시종으로 천거되었고 임금의 은혜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다. 이조참판, 병조참판, 형조판서, 예조판서, 한성부 판윤, 돈녕도정, 동부가 되었으며, 좌승지, 사간원 대사간, 사헌부 대사헌, 국자감장, 경연춘추관의금지사(經筵春秋館義禁知事), 동지성균(同知成均), 동지총관(同知摠管), 승문원 도 ․ 부제조, 특진관에 이르렀고 안동부사가 되었다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전후에 전형을 담당하는 관직에 있을 적에 족인(族人)을 가까이 하는 폐단이 오래되었다. 장관이 인맥에 치우치게 사람을 뽑는 것을 다투었고 생원 ․ 진사 선발을 주관할 때는 세력가의 입김이 행해지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관직을 잃어버렸지만 또한 후회가 없었다. 첫 부인은 증정 부인(贈貞夫人) 창녕 조씨(昌寧曺氏)로 참판 윤수(允遂)와 동복 오씨(同福吳氏)의 따님이다. 계축(癸丑, 1793)에 태어났으며 깊이 부모를 사랑하였고 어버이 상에 거의 멸성(滅性 : 부모의 상중에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애통하는 것)하였다. 시아버지 상에 병으로 죽었으니 곧 무자(戊子, 1828) 10월 18일이었다. 아들 근필(根弼)은 지금 승지이며 부인은 풍산부사(豊山府使) 홍석모(洪錫謨)의 따님이다. 딸은 파평(坡平) 윤긍규(尹兢圭) 진사와 혼인하여 자손 둘을 두었다. 정로(政魯)는 승지 나주(羅州) 박홍양(朴弘陽)의 딸과 혼인하였고 무로(茂魯)는 군수 동래(東萊) 정헌조(鄭憲朝)의 딸과 혼인하였다. 손녀는 창녕(昌寧) 조경승(曺慶承)과 혼인하였고 외손자는 윤홍진(尹泓鎭)이다. 외손녀 둘은 각각 한명교(韓明敎), 정인건(鄭寅健)과 혼인하였다. 두 번째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전주 이씨(全州李氏)로 학생(學生) 지숙(趾肅)과 고령신씨(高靈申氏)의 따님이다. 기사(己巳, 1809)에 태어났으며 슬하에 자식을 낳았지만 모두 죽었다. 조부인(曺夫人)은 북부 성산리(城山里), 조고(祖考) 묘 계좌(癸坐) 앞에 장사지냈고, 선고(先考) 묘는 서쪽에 있으니 또한 이 늙은이의 수장(壽藏 : 생전에 만들어 놓은 무덤)이다. 일당삼실(一堂三室)의 제도를 만들기를 명하고 이어서 돌을 세워 식별하고 또한 여기애서 고치지 않는다. 옛날 현인이 스스로 묘도문자를 지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첨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늙은이는 효성이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데 부족했으며 충성은 임금을 바르게 하는데 부족했다. 학문은 자기의 인격을 이루는 데에 부족했으며, 정치는 남을 다스리는 데에 부족했다. 덕은 후손을 넉넉히 하기에 부족했으며, 지위는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했다. 언행은 삼갔으나 혹 졸렬함에 가까웠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은 침착하였으나 혹 느슨함에 가까웠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했으나 혹 인색함에 가까웠고, 베풀어 주는 것은 균등하게 하였으나 혹 한계를 지어서 함에 가까웠고, 잡아 지키는 것은 단단하였으나 혹 막히는 데에 가까웠다. 서로 사귀는 것은 간이하였으나 혹 교만함에 가까웠으니 그 지리멸렬하여 일컬을 만한 것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 설령 매우 찬미한다 해도 누가 깊이 믿겠는가! 이를 위해 [뒤에 자신의 비문을 세우는]일에 간여하는 자에게 고하니, 내가 죽은 후에 큰 비석을 세우지 말라.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어울리지 않고 친압하지 않으니 마음이 맞는 이가 적구나 不羣不狎志寡合
재주도 없고 공업도 없으니 재앙이 오는 것도 드물구나 無才無業災鮮及
이런 습성을 온전히 이룬지가 이제 70이로다 全此性習今七十
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깨끗한 땅 양지에 내 수장(壽藏)을 다스리니 我治壽藏淨陽土
풍상을 겪은 삶의 이력은 옆에 묻히고 生履露霜歿侍傍
영원히 산등성이 가에 무덤 둘이 있네 二琴在床千歲岡
성상(聖上) 30년 숭정(崇禎) 사임술(四壬戌, 1862)에 이현서(李玄緖)는 스스로 지었다. 김생(金生)의 글씨를 집자하였고 고전(古篆)을 임서하였다.
이것은 우리 선고(先考)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경연춘추관의금사(知經筵春秋館義禁事)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오위도총부도총관부군(五衛都摠府都摠管府君)께서 직접 새긴 수장비(壽藏碑)이다.
임술년(壬戌, 1862) 10월 24일에 불초를 버리셨고(돌아가셨다는 의미) 12월 24일에 어머니 묘 좌측에 합봉하였으며 향년 72세였다. 오호라! 부군(府君)께서는 하늘에 뿌리를 둔 효심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어버이가 병이 드시면 옆을 모시고 약을 맛보고 밝게 살피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여려서부터 병든 어버이를 모시고 약을 맛보면서 성실함을 풀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재물에 뜻을 두고 음식을 갖추어서 봉양하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무자(1828)년과 을미년(1835)에 아버지의 상(喪)을 만나고 어머니의 우환을 만났으니, 고인 피를 토하여 드디어 고질이 되었다. 상(喪)을 치룬 나머지에 울부짖으면서 일흔이 되도록 처음과 같이 하였으며 선조 받듦을 도탑게 하였으니, 먼저 오세(五世)의 영역(塋域)에 정성을 쏟으면서 사치스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작년 여름에 이르러서 병환의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서화선생(西華先生) 조(祖)의 묘도문(墓道文)에 종손(宗孫)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수백 년을 통하여 묘역(墓域)에 비(碑)를 세우지 못한 것을, 일조(一朝)에 빗돌을 다듬어서 몸소 극진히 각자(刻字)를 감독하였으니, 생각하면 능히 역사를 미치지 못함을 두려워함이었다.
가문에서는 일찍이 고적(故蹟)이 있었지만, 작은 전답도 구해놓지 않았고 문서를 수집하여 영원히 후손에 전할 계획이 없었다.
일찍이 종조(從祖)와 계부(季父), 외조(外祖)와 내구(內舅, 외숙)와 외구(外舅, 장인)와 종제(從弟)와 여서(女壻)의 묘에 미치기까지 자기(磁器)를 구워서 지석(誌石)을 하였고, 혹 누이의 지석(誌石)도 더하였으며, 석물(石物)을 하고 현각(顯刻, 비문)을 하였다. 당내(堂內)의 길흉사를 힘써서 다스리는 것이 집안일을 하는 듯 하며 친척과 친구를 도와주고 진휼하는 것은 미치지 못한 듯 하였다. 이것은 모두 평소 정력이 도달한 바요. 심덕(心德)이 궁구하는 바이다. 9살에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15살에 널리 많은 책들을 섭력하여 문장과 생각이 크게 진전되었다. 『성수집(星叟集)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공사의 전고에 대해 식견이 풍부하여 묻는 것이 있으면 응당 답하였다. 처음 벼슬길에 오를 적에 재추(宰樞)가 살펴보고 나라의 인재로 인정하였다. 현감으로 있을 적에는 전결(田結)의 폐단을 정리하고 포안(逋案)을 청산하였으며 떨어지고 꺾인 것을 보완하였다. 굶주린 이들을 구휼하고 송사를 신중히 다루었으며 유학과 무술을 권하였다. 보루를 수리하고 음악을 멀리하였다. 마음을 성실히 하고 정사를 충실히 하여 아전의 일을 낮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염명지치(廉明之治), 인유여회(刃有餘恢), 여목지승(如木之繩), 한후양춘(寒後陽春), 중구성비(衆口成碑), 이치를 살피는 데에 명철하고 법을 세우는 데에 엄격하다. 많은 업적이 영호남에 드러났다 등등의 말이 있었다. 곧 전후 관찰사와 어사가 공을 기리는 내용의 대략이다. 한 어사가 남에게 사주를 받아 공을 여러 가지로 혹독하게 조사하여 들추어냈지만 작은 흠도 찾지 못했다. 이에 도리어 경복(敬服)하고 스스로 그 정황을 말하였다. 비변사는 일찍이 공을 천거하여 의주부사를 맡기려고 하니 공이 두터이 사양하였다. 이로부터 지방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공을 헤아렸다. 조정에 있을 적에는 지출계획을 넉넉히 하고 고시(考試)를 정밀히 하였으며 징토(懲討)를 엄밀히 하였다. 법금(法禁)을 명백히 하며 막혀있는 것을 소통시켰고 통색(通塞)을 법도에 맞게 하였다. 사문(師門)에 참여하여 분변하는 상소를 펼쳐서 혼자 자정(自靖)의 의리를 진술하였다. 삼정(三政) 문란을 바로 잡는 논의를 바쳤고 힘써 전례를 따르는 논의를 주장하였다. 관직에 임해서는 직분을 다하여 한결 같이 정성을 다했다. 몸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곧개 해서 구차하게 남에게 영합하지 않았다. 연경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는데 가까이 닥쳐왔는데도 평온한 모습이 마치 재실에 있는 듯하였다. 단지 서적만 손에 들고 돌아왔으며 기호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지금까지 칭찬한다. 기로소에 들어가니 태사(太史)가 글을 지었으며 그 서술의 대략을 말하면, ‘공자께서 인재 얻기가 어려움을 탄식하였으니 옛날의 이른바 재(才)는 지금의 이른바 덕(德)이다. 재주와 덕이 갖춘 뒤에야 군자가 되는 것이다. 공(公)은 간중(簡重)하면서, 자신을 검속함이 편안하고 욕심이 적고 행동함에 법도가 있어서 논자들이 나라의 회계를 맡을 인재라고 칭찬하면서 가리킬 때 반드시 먼저 공을 손꼽았다. 그러나 권력가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니 공은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였고 물러나서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 처신하였다. 종일 책상에 앉아 서적에 잠심하여 실행에 민첩하였으나 시속의 일에 졸하였으며 그 재주와 덕은 노숙하였으나 그 베품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호라! 부군(府君)께서는 백성을 가까이 하며 두터운 은택이 있었으며, 조정에 있을적에는 청망이 있었다. 장차 세상에 크게 기대가 되었는데 세속이 날로 침체되는 것을 개탄하고 마침내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조정의 청이 아니면 나오지 않았고 고향의 산수(山水) 속에 별장을 설치하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모한 생각을 붙였다. 일찍이 불초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충(忠) ․ 효(孝) ․ 인(仁) ․ 경(敬)은 집안에 전해 내려오며 대대로 지켜온 교훈이다. 집안을 다스리고 공무를 처리하는 요체는 또한 근검(勤儉)에 달려 있다. 일은 미리 하면 성립되는 것이니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물건이 해지면 기울 것이니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말라. 공명과 외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실지에 따라 발을 붙여라” 하시며 자손에게 다하지 않는 복을 남기셨다. 돌아가신 날 저녁에 오히려 손님을 대하고 대화하시는 데에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고 정신도 편안하셨다. 그러다 하루 아침에 병이 위독해짐을 알게 된 것이다. 찬탄하기를, 지위가 비록 덕에 맞지 않았으나 오히려 본보기로 삼을 만한 하다. 또 말하니,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명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에서 거의 한 사람이니 이는 모두 공의(公議)를 가리지 않고 멀리서도 징험을 할 수 있다. 불초가 어찌 감히 망령되게 칭찬하여 말하겠는가! 오호라! 우리 어머니(先妣)는 계축(癸丑, 1793) 11월 14일에 태어나시고 을축(乙丑, 1805)에 혼인하셨다. 불초 나이 겨우 13세에 아버지를 잃게 되자 애통함이 심하여 예의에 미치지 못하였고, 근심에 빠진 불초는 어둡고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행적을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지으신 지문(誌文)을 보니, 천부의 재능을 일찍이 이루셨으며 자친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태도를 단정히 하며 식견이 명철했고, 제수를 정결히 하며 비첩에게 두터이 베풀고 종당의 법도가 되는 말에 복종하였다. 그러니 후손이 된 자는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한다. 계해(癸亥, 1863) 중추(仲秋)에 불초고자(不肖孤子) 근필(根弼)이 눈물을 흘리며 추기(追記)하였다. 또한 김생(金生)의 글씨를 집자했다.
|
|
|
碑銘 幷序
星叟姓 李氏名玄緖字稚長號星叟全義人高麗太師諱棹浚 本朝有淸江先生諱濟臣西華相國諱行遠曾祖諱德鄰錦山陞郡守贈吏曹參議祖永培黃州牧使贈吏曹參判考諱文會吏曹參判贈吏曹判書妣貞夫人靑松沈氏正言贈吏曹參判諱商賢女 正宗辛亥十月七日叟生 純祖丙子生員辛巳筮仕 顯隆園超司果歷典設司戶曹 永禧殿敦寧府 宗廟出監永同縣養不便旋歸 憲宗戊戌戶曹辟爲正郞出監陽城縣判書奏留守高陽郡因事奪大臣請還職判公州牧使蔚山府忠州牧五遷皆 啓擢甲辰登增廣文科用准職陞通政 聖上癸丑亥年貢副使因兼銜陞嘉善戊午敍讀冊勞陞嘉義庚申推侍從恩陞資憲爲吏二叅兵三叅分議刑判議禮判叅戶叅漢三尹都正同副至左承旨兩司國子長 經筵春秋館義禁之事同知成均同知摠管都副槐提特進使安東府入耆老所前後居銓族赽人之久廢爭長官之偏係主選生進解關節不行雖由是失官而亦旡悔焉初內贈貞夫人昌寧曺氏參判允遂同福吳氏女生癸丑有深愛父母喪幾滅性先舅喪病歿卽戊子十月十八日 男根弼 今承旨男婦府使豊山洪錫謨女女歸坡平尹兢圭進士孫二男政魯娶承旨羅州朴弘陽女茂魯娵郡守東萊鄭憲朝女孫女歸昌寧曺慶承外孫男尹泓鎭外孫二女歸韓明敎鄭寅健再內貞夫人全州李氏學生趾肅高靈申氏女生己巳累擧未育曺夫人葬北部城山里祖考墓前癸坐先考墓在西又叟之壽藏也命爲一堂三室之制仍樹石以識之且無改焉昔賢有自銘墓道者以世人諛辭爲愧然今叟孝不足以怡親忠不足以匡君學不足以成己政不足以治人德不足以裕昆位不足以顯世言行謹或近於拙知思沈或近於緩服食儉或近於嗇施与均或近於畵執守固或近於滯過從簡或近於傲其滅裂無稱如此縱或溢羙夫孰深信爲此預事者䛇身後勿樹穹碑也銘曰不羣不狎志寡合無才無業災鮮及全此性習今七十又銘曰 我治壽藏淨陽土陽生履露霜歿侍傍二琴在床千歲岡聖上十三年 崇禎四壬戌李玄緖自撰 集金生壬書 臨古篆
此我先考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義禁事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府君自銘壽藏碑也
壬戌十月二十四日棄不肖臘月二十四日合封于先妣墓左享年七十二嗚呼府君有根天之孝自在齠齔侍疾嘗藥洞屬靡懈及長志物備養不離親側戊子乙未丁外內憂畜血吐咯遂成貞痼喪餘號霣七耋如初篤於奉先先誠五世塋域靡事不擧至昨夏已在違豫之中而西華先生祖墓道文之宗孫力不逮數百年未遑塋立者一朝伐石躬極董刻惟恐不克竣役家嘗故蹟雖系徵小田不纂輯爲壽傳計之嘗於從祖季父外祖內外舅曁從弟女婿之墓燔磁而妹誌或加之石儀顯刻凡堂內吉凶事爲之治辦如家助賙族戚姻舊如不及此皆平日精力所到心德所推也九歲始受學十有五而淹博群書文思大進有星叟集藏于家且多識公私典考有叩則應初登仕路宰樞有鑑識皆許以國器其在州縣釐結弊淸逋案補流折賑匱飢荒愼獄訟勸儒武修樓觀遠聲樂實心實政不卑吏事而有曰廉明之治曰刃有餘恢曰如木之繩曰寒後陽春曰衆口成碑曰察理明立法嚴曰茂績著嶺湖利器試盤錯卽前後巡察褒褒繡褒之略也一繡衣受人嗾百岐苛摘終不得微瑕乃反敬服自言其狀籌司嘗欲薦授灣節以廩厚辭自是蕃任有缺輒低擬而己其在朝廷贏支計精考試嚴懲討申法禁疏滯鬱規通塞叅師門伸辨疏而獨陳自靖之義獻三政矯捄議而力主仍舊之論當官盡職一出悃愊正身直行不爲苟合赴燕京値南匪迫近恬然若在齊閣只携書籍而歸玩好不與商譯至今稱之入耆社一太史爲文而敍之略曰孔子歎才難而古之所謂才今之所謂德也才德備然浚爲君子公簡重而約己恬靜而寡欲動有矩獲而論者稱計相之材指必先屈然要津競渡逡巡不前歛退處散若畏四鄰終日據案潛必書籍敏於行而拙於時老其才宿其德而未究厥施嗚呼府君近民而有厚澤立朝而有淸望若將大需于世而慨流俗之日渝遂無意於進取非朝請不出門置別墅於楸鄕山之間隨意往還以寓遐想嘗戒不肖曰忠孝仁敬卽家傳世守之訓而理家處官之要亦惟在乎勤儉 事豫則立 毋謂有明日 物弊則補 毋好新 功名外物毋羨騰翥從實地上著脚以遺不盡之福於子孫也易簀之夕猶不示憊酬接人客神思安閒同朝聞疾革歎曰位雖不稱德在世則尙有矜式又曰眞必不喜名利今世庶乎一人此皆不揜之公議足以徵遠不肖何敢妄有稱述嗚呼我先妣以癸丑十一月十四日生乙丑于歸不肖年甫十三以處失所恃慟深不洎儀範寖邈不肖顓蒙莫狀令懿而觀於先考所製誌文有天資夙就早服慈訓端度明識潔薦厚施婢妾服宗黨之辭而爲後裔者槩可承諗焉 癸亥仲秋不肖孤子根弼泣血追記 又集金生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