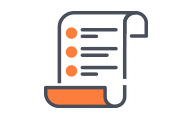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과 서문
영의정 이유원(李裕元) 지음
난석 이공(蘭石李公)이 역책(易簀)1)하던 날에 나에게 면결(面訣)2)을 요구 하였다. 당시에 나는 죄를 지어 칩거하던 중이었는데, 계율을 파기하고 가서보니, 공(公)이 기쁜 모습으로 나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다만 면려하고 경계하는 말은 백성과 나라의 일 아님이 없어서 하나라도 사사로움이 미쳐서는 안 된다.”
고 하였다. 아! 공과 같이 신중하고 간결하며 공변되고 공평함이 세속과 더불어 물들지 않은 사람을 어느 곳에서 다시 볼 수가 있을까! 나의 사사로운 마음을 그르게 여기고 국인(國人)의 말을 공변되게 여기면서 자리를 치우고 거연(居然)히 임종(臨終)에 임하였다. 나는 재문(齎文)3)을 들고 곡(哭)하고 산언덕에 올라서 절하였었다.
공의 둘째아들 무로(茂魯)가 울면서 나에게 와서 대규문(大逵文, 신도비문)을 청하였다. 나는 늙고 또한 병들어서 조고(操觚)4)의 일을 폐한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공에 대한 마지막의 일이니, 어찌 차마 사양하리오!
삼가 상고하면 공의 휘(諱)는 근필(根弼)이고 자(字)는 여해(汝諧)이며 호(號)는 난석(蘭石)이니, 전의이씨(全義李氏)이다. 멀리 고려의 태사(太師)인 도(棹)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에 들어와 휘(諱) 정간(貞幹)이 있으니, 중추원사(中樞院使)로 시호(諡號)는 효정(孝靖)이다. 휘 사관(士寬)을 낳으니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이며, 휘 서장(恕長)을 낳으니 대사헌(大司憲)으로 봉훈(封勳)이 되었고 시호(諡號)는 양간(襄簡)이다. 네 번 전하여서 휘(諱) 제신(濟臣)이 있으니, 문무(文武)에 온전한 재주를 가지고 관직은 북병사(北兵使)이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으니, 호(號)는 청강(淸江)이다. 삼전(三傳)하여 휘(諱) 행원(行遠)이 있으니, 관직은 우의정(右議政)이고 시호(諡號)는 효정(孝貞)이며 호(號)는 서화(西華)이니 중흥(中興)한 현상(賢相)이 되었으며, 휘(諱) 만최(萬最)를 낳으니 관직은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이고, 휘(諱) 징해(徵海)를 낳으니 원주목사(原州牧使)이며, 휘(諱) 덕린(德鄰)을 낳으니 금산군수(錦山郡守)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종질(從姪) 영배(永培)를 취하여 후사(後嗣)를 삼았으니, 관직은 황주목사(黃州牧使)이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으니, 이가 공(公)의 증조(曾祖)가 되신다.
목사(牧使)는 휘(諱)가 징집(徵楫)이고, 참봉(參奉)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된 휘 덕봉(德鳳)은 곧 황주공(黃州公)의 본가 조고(祖考)와 약고(若考, 父)이다. 조고(祖考)의 휘는 문회(文會)니 이조참판(吏曹參判)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으며 호(號)는 당헌(棠軒)이니, 정조(正祖)와 순조(純祖) 두 조정에서 알아줌이 심히 높았고, 선고(先考)는 휘(諱) 현서(玄緖)니 예조판서(禮曹判書)이고 호(號)는 성수(星叟)이니, 문학(文學)과 정사(政事)를 구비하여 세상에서 추중(推重)5)하였고, 선비(先妣)는 증정부인(贈貞夫人) 창녕조씨(昌寧曺氏)이니 참판(參判) 윤수(允遂)의 여식이고, 계비(繼妃)는 정부인 전주이씨(貞夫人全州李氏)이니, 선비인 지숙(趾肅)의 여식이다.
공은 순조(純祖) 병자(1816)생이니, 조부인(曺夫人)에게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비범하였으며, 5세에 취학(就學)하여 과정이 필요 없이 문사(文思)6)가 날마다 진전하니, 왕고(王考) 당헌공(棠軒公)께서 이마를 어루만지며 그를 사랑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문을 크게 할 자는 이 아이이다.”고 하였다. 7세가 되어서 당헌공(棠軒公)을 따라 해영(海營)의 임소에서 누각의 사이에 제명(題名)7)하기를, “타일에 내가 응당 이곳에 부임하겠다.”고 하였는데, 뒤에 과연 징험이 되었다. 13세에 질병을 만났는데, 소노(小奴)의 꿈에 ‘당헌공(棠軒公)께서 급한 명령으로 약을 들이라.’고 해서 그 약을 들여서 복용하고 곧바로 나왔으니, 당시 당헌공(棠軒公)의 장례 전이었다. 이 해에 모부인의 상(喪)을 만났는데, 어린 나이에 상례(喪禮)를 노성(老成)한 사람과 똑같이 하였고, 정성(定省)8)하는 여가에 단정히 앉아서 경서를 공부하고, 곁으로 공령(功令)9)을 공부하면서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헌종(憲宗) 갑진(甲辰, 1844)에 사마시(司馬試)10)에 합격하였고, 철종(哲宗) 임자(壬子, 1852)에 문과(文科)에 올랐으며, 계축년(1853)에 괴원(槐院, 승정원)에 예속이 되어서 매일 경연에 올라가서 기주(記註)11)함이 민첩해서 대료(大僚)12)에서 극구 칭찬하였다. 을묘년(1855)에 승정원 주서(注書)에 오르고, 정사년(1857)에 육품(六品)에 올라서 성균관(成均館)의 전적(典籍)과 사간원의 정언(正言)을 역임하고, 문신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였으며, 무오년(1858)에 특별히 홍문관 교리(校理)에 제수되었고, 연이어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제수되었으며, 경신년(1860)에 여러 번 경악(經幄)13)의 직임에 제수되어 문득 칭찬 [獎許] 하는 하교를 입었고, 그 사이에 호남의 경시관(京試官)14)이 되었고, 벽어영 종사관(辟御營從事官)에는 부임하지 않았다. 신 년(1861)에 순조대왕추상존호도감(純祖大王追上尊號都監)에는 도청(都廳)15)으로 일한 공으로 통정(通政)의 품계에 올라 형조참의(刑曹參議),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병조 분사참지(兵曹分司參知)에 제수되었다. 임술년(1862)에 여러 번 은대(銀臺, 승정원)에 들어가서 법을 잡고 유윤(惟允)16)하니, 동료들은 두려워서 떨었고 판서는 공을 걱정하였다.
고종(高宗) 을축(1865)에 복결(服闋)17)하고 우승지(右承旨)에 제수되었으며, 병인(1866)에 이조참의(吏曹參議)와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에 제수되었고, 연이어 승지(承旨)에 제수되었다. 예릉(睿陵)의 친제(親祭)시에 예방(禮房)에서의 공로로 가선(嘉善)의 품계에 오르고 좌승지(左承旨)가 되었으며, 한성부 좌우윤(漢城府左右尹)과 병, 공조참판(兵工曹參判)에 제수되어서 동지 경연 의금부춘추관사(同知經筵義禁府春秋舘事)와 도양부 부양관(都揚府副揚管)을 겸하고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에 차출되었다. 기사년(1869)에 시진관(時進官)으로 등대(登對)18)하여 조주(條奏)19)하는 문의(文義)가 밝게 통찰하고 고금(古今)을 이끌어서 인용하여 힘써 개진하고 개절(凱切)20)하니, 상께서 자세를 바로잡고 잘한다고 칭찬하시었다.
경오년(1870)에 형조참판에 제수되었고, 그해 여름에 이부인의 상(喪)을 만났다. 계유년(1873)에 첨서(添書)21)하여 이조참판에 제수되고, 대신(大臣)이 진용(進用)함의 뜻을 진주(進奏)하니, 품계가 자헌(資憲)에 올라 형조판서에 특제(特除)되었다. 지의금도양관(知義禁都揚管)을 지내고 별행정사(別行正使)22)에 충당되었는데, 더위와 장마를 만나 길은 질펀하고 갈증이 심했다. 지나는 곳마다 진기한 구경거리가 많았는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만책(灣柵)의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에게 청조(淸操)하다 칭하였다. 가을에는 지경연사(知經筵事)23)와 판윤(判尹)에 연이어 제수되었다.
갑술년(1874 고종11)에 지춘추중추부사(知春秋中樞府事)에 제수되고, 연이어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제수되었다.
을해년(1875 고종12)에 우참찬(右參贊)과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舘事)에 제수되고 의정부 유사당상(議政府有司堂上)에 차임(差任)되었다.
병자년(1876 고종13)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제수되고 식년문과복시(試式年文科覆試)를 주관하여 공도(公道)를 널리 펼치니, 선비들의 희망이 울연(蔚然)하였다. 봄에 특별히 황해감사(黃海監司)에 제수되었는데, 그 해에 마침 큰 홍수가 나서 어려웠으므로, 곡물의 유출을 막고 남 몰래 담그는 양조(釀造)를 금하여 쌀의 소비를 막았고, 당시에 산군(山郡)의 사곡(社穀)을 도성으로 수송함이 있었으며, 연해(沿海)의 세(船稅)를 경사(京司)에 옮겨 배속하라는 영(令)을 내리니,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어서 여러 번의 걸쳐서 방보(防報)24)를 올려서 마침내 허대(許代)하여 포구에 예속시키라는 준청(準請, 임금의 윤허)의 비답이 돌아오니, 스물 세 개의 주군(州郡)에서 비를 세워 은혜를 칭송하였고, 관서지방도 또한 이를 모방해서 시행하였으며, 마애(磨崖)에 새기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축년(1877. 고종14)에 택차(擇差 골라서 뽑음) 되어서 경상감사(慶尙監司)에 이배(移拜)되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곧바로 위엄 있고 신중하게 진무(鎭撫)하고 청렴하고 간결함을 유지했으며 변방의 정세를 염탐하여 그 방위를 엄히 하였고 야박한 풍속을 조사하여 돌이키고 그 병듦을 맑게 했으며 형벌을 엄하게 하고 삼가고 살폈으며 도창(都倉)을 파하고 곧 관청과 백성이 모두 편리하게 했으며, 소송이 번다한 곳에서는 청촉(請囑, 청탁)함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험을 주관하면서 관절(關節)25)이 이르지 못하게 하니 잘한다는 소문이 먼 곳까지 미쳐서 의정부에서 진주(進奏)하여 만기가 된 임기를 늘려주어서 신사년 봄에 비로소 돌아오니, 선비와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도로에 깐 것이 몇 십리에 이르렀다.
부절(符節)을 반납한 뒤에 상께서 편전에서 부르시고 하교하시기를,
“경은 양번(兩藩)을 안찰(按察)함에 있어서 커다란 치적을 세움이 가상하고, 옥음(玉音 임금의 말소리)이 누차 번거로움을 공은 곧바로 환정(還政)26)으로 교정 [矯捄] 함을 진소하였으며, 이무미(移貿米)27)의 폐해를 혁파하고 전결(田結)을 개량하였으며, 조운(漕運)28)의 임선(賃船)과 영장(營將)의 전최(殿最)29)와 수령(守令)의 구임(久任)등 여섯 가지의 고질적인 폐해를 상주하여 상께서 빈 마음으로 개납(開納)30)한다.”고 하시었다. 물러나올 때는 액속(掖屬)31)에 명하여 부축하게 해서 대궐을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리고 곧 우구(雨具)를 허락했으니, 이수(異數)32)이었다.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에 차임(差任)되었다가 곧바로 이조판서에 제수되고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관상감 사옹원 제조(觀象監司饔院提調)를 겸하도록 하였다.
임오년(1882. 고종19)에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가 되어서 별시문과(別試文科)와 초시(初試)의 주시관(主試官)으로 주재하면서 한 관직에 누차 제수된 자는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해 봄에 병으로 고향의 집으로 돌아왔고, 6월에 군오(軍伍)의 변고를 듣고 병을 무릅쓰고 도성에 들어가서 공직에 부임하였으니, 그의 충근(忠勤)하고 진췌(盡瘁)33)한 절도가 이와 같았다. 마침 8월 5일에 정침(正寢)에서 종명(終命)을 고하였으니, 향년이 67세이었다.
부음의 소식에 상께서 슬퍼하시고 전례에 의해 부제(賻祭)34)하였으니, 예(禮)를 차린 것이었다. 9월을 넘긴 계축일에 양근 북면 미원리 장석촌 신좌(辛坐)의 언덕에 장사를 지내니 공이 평소에 지팡이 짚고 생활하는 곳이다.
공은 이마는 넓고 볼은 살졌으며 아름다운 수염에 안광은 빛이 발산하였으니, 밖에서는 너그럽게 보이나 안으로는 실제로 강정(剛正)하였으며, 전적(典籍)에 몸을 담가서 고금을 통하여 알고 경사(經史)를 기억하고 외움이 방책(方策)을 대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언제나 치부(置簿)하였고 눈을 스쳐간 것은 잊지를 않았으니, 어린이로부터 덕이 많은 선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기(國器)35)라고 생각하였다.
공의 효도와 우애는 하늘에 근원을 두었고 일찍이 부모를 여위었으므로 국록을 받아서 부모님을 봉양함이 미치지 못함을 지극히 슬퍼했으며, 판서공(判書公)을 섬김에는 능히 맛이 감미로운 것을 준비하였고, 이부인(李夫人)을 섬김에는 그 뜻을 받들어 따르고 힘써서 그의 환심을 맞추어서 만족하여 감화가 되게 하였다. 초상(初喪)에 미쳐서는 슬퍼함이 상제(喪制)를 넘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공의 효도가 이에서 다한 것이었다.
집안의 다스림은 정정(井井)36)하여 조리가 있었고 일찍이 산업(産業)을 가지고 폐가 되지 않게 하였으며, 한 명의 누이가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또한 가난하였으므로 지탱하고 조섭하는 자금과 가솔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그 정성을 다하였고, 또한 외가에 더욱 마음을 써서 제전(祭田)을 갖추어서 제사를 봉양하게 하였으며 재종의 두 아우 보기를 형제 같이 하여서 걱정과 즐거움을 함께 하였고 족척(族戚)의 원근(遠近)을 따지지 않았다. 벗과 동료간에도 친소(親疎)를 따지지 않고 급히 구휼함이 있었으니, 이는 장차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공사(公私)의 구분과 시비의 분별에 이르면 늠연(凜然)히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기상이 있었다.
대개 공은 검소함이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는데, 맑음에는 탁함이 스며들고 행차함에는 먼지가 가득하였으므로, 공이 아니면 나가지를 못하였다. 세로(世路)에는 버릇이 없어지기 쉬운데, 어찌 앞으로 더렵혀 짐을 바라만 보겠는가!
상의 두터운 권주(眷注 은총을 베풂)함을 입었고, 지위는 팔좌(八座)37)에 올랐으며, 몸을 낮추므로 더욱 돈독해져서 바라던 양관(兩館)38)을 도왔고 겸억(謙抑 겸손하여 자신을 억제함)하여 스스로 재능을 감추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여망(輿望)은 더욱 정중하였고, 금사발[金甌 국가의 계승된 왕실]를 점침에 ‘이 조정이 저무는 일이라.’고 해서 오히려 귀영(歸穎)39)하는 뜻을 품고 가지고 있던 관직을 갑자기 사양하였으므로, 크게 쓰임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조야(朝野)의 애석하고 탄식할 일로, 오히려 지금도 그 애석하다는 말이 없어지지 않았다.
바야흐로 송나라 명신 여정혜(呂正惠)처럼 지중(持重)40)하여 대체(大體)를 인식하고 청정(淸靜)함을 가지고 간이(簡易)함에 힘썼으며 지난 문사(文詞)에서 가려내어 사방에 임하였고 백성의 일을 진심으로 거행했다.
파면이 된 즈음에는 기쁨과 화냄을 형용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숨었으며, 문사는 육경(六經)에 근본(根本)하였고 화려함을 숭상하지 않았으며 제고(制誥)41)의 문체는 공거(公車)42)의 문장이었으니, 조금도 경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붓으로 글씨를 쓰면 사사(纚纚)43)했으며 문장은 유창하고 이치를 승했으니, 시문(詩文) 약간의 책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배위는 정부인(貞夫人) 풍산홍씨(豊山洪氏)이니, 부사(府使) 석모(錫謨)의 여식이고, 이조판서 문목공(文穆公) 희준(羲俊)의 손녀로, 인자하고 효성있는 성품과 정숙하고 근신하는 덕을 가지고 공과 더불어 몸을 가지런히 하였다. 순조조의 을해년(1815. 순조15)이고 고종 신사년(1881. 고종18)에 졸서(卒逝)하니, 향수(享壽)는 67세이다. 처음에는 같은 군 창촌리(倉村里)에 장사지냈다가 공의 묘비 좌측에 이장하여 붙였다.
모두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정로(政魯)는 성균 진사(成均進士)이니, 승지 반남 박홍양(朴弘陽)의 여식에게 장가들었고, 차남은 무로(茂魯)이니, 지금 정자(正字)이다. 승지 동래 정헌조(鄭憲朝)의 여식에게 장가 들었고, 여식은 창녕 조경승(曺慶承)에게 시집 갔으니 오늘날에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무로(茂魯)는 삼녀(三女)를 두었으니, 장녀는 반남 박풍서(朴豊緖)를 맞았고 차녀는 동래 정인억(鄭寅億)의 아내가 되었으며, 삼녀는 어리고, 측출(側出)로 2남을 두었으니 모두 어리다. 조경승(曺慶承)은 3남 1녀를 두었으니, 병정(秉楨)과 병주(秉柱)이고 다음은 모두 어리다.
아! 공은 나와는 호려(蠔荔)44) 사귐이었다. 젊어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공과 더불어 시종(始終)을 같이했으니 공을 아는 사람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공은 약관(弱冠)에 상시(庠試)에 부거(赴擧)하여 여러 사람의 바람이 공에게 붙였었는데, 말하기를.
“주제(主題)가 휘(諱)를 범했다.”
고 하고 시권(試券)을 가지고 나갔으니, 이는 공의 신중함이었고, 세상길에 나온 처음에 일시의 재상이 보자고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의 간결함이며, 내가 시원(試院)을 주관할 때에 공은 두 번이나 참시관(參試官)이 되었는데, 하나도 간여함이 없었으니, 이는 공의 공변됨이다. 해서(海西)에 의심스러운 송사가 있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는데, 공이 한 번의 안무(按撫)에 분별하여 해결하였으니, 이는 공의 공평함이다. 이는 다 내가 목격하였고, 그리고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라. 눈물을 흘리며 가장(家狀) 외에 일을 모아서 쓴 글이다. 드디어 공을 위해 명(銘)을 하나니,
維古太師 생각하면 옛적 우리 태사께서는
大闢公門 공(公)의 문을 크게 열었다네.
淸江奕裔 청강(淸江) 같은 빛나는 후손이고
西華後孫 서화(西華)같은 후손이라네.
四世一轍 사세(四世)가 한 궤철(軌轍)이었고
駟馬高軒 사마(駟馬)에 높은 수레를45) 끌었네.
公起繩武 공이 일어나 그 뒤를 이었고
樂易粹溫 역(易)이 좋아하고 순수하고 온화했네.
舘閣周流 관각(舘閣)46)을 주류(周流)하였고
經傳爲根 경전(經傳)에 뿌리를 두었네.
天官三膺 천관(天官, 이조)에 세 번 부응하였고
淸朝峻掄 맑은 조정에서 높이 뽑히었네.
威振惠洽 위엄을 떨치고 은혜는 흡족하였고
海嶠兩藩 해교(海嶠)47)에 위치한 양번(兩藩)하였고
傳世循良 세상에 전해지는 순량(循良)48)이었고樂志田園 전원에서 뜻을 즐겼네.
處若韋布 거처함을 위포(韋布)49)와 같이했고
自修克敦 스스로 수양하여 능히 돈독하였네.
一心慮國 일심으로 나라를 걱정하였고
百行溯源 일백 행실을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갔네.
恤貧周窮 가난한 자를 구휼하고 위급한 자를 도왔고
尺縫匙飱 한 자의 실로 꿰매고 한 수저의 밥을 먹었네.
王曰嘉乃 왕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니
庶循輿論 많은 여론이 이를 따랐다네.
利澤將流 이로운 은택이 흐르려 하니
廊廟將尊 낭묘(廊廟. 의정부)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네.
勞瘁養疾 수고롭고 초췌하여 병을 길렀고
台宿奄昏 삼태성이 문득 어두우려 하네.
知與不知 지혜가 지혜 없는 자와 함께하니
咸惜騰喧 모두 시끄러운 세상을 애석해 했네.
禮官來侑 예관(禮官)이 와서 도왔고
庇具優恩 상구(喪具)를 도운 은혜 넉넉하였네.
愼簡公平 근신하고 간결하고 공평하다고
史氏斷言 사관(史官)이 단언했다네.
不磷不緇 닳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니
公去名存 공은 갔으나 이름은 남았네.
石陽吉岡 바위 양지 길한 산이 있으니
杖履之村 공이 장이(杖履)하는 마을이라네.
賢配禮祔 어진 배위를 예에 의해 붙이고
若室作垣 집 같은 곳에 담을 만들었네.
積累有因 인연에 의해 덕을 쌓았고
本支宜繁 줄기와 가지가 번성함이 마땅하네.
樵牧敬護 나무꾼과 목동이 공경하게 보호하니
名卿泉原 명경(名卿)의 묘가 있는 언덕이네.
|
<註> |
|
1)역책(易簀) : 임종(臨終)함을 말함.
2)면결(面訣) :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결별함.
3)재문(齎文) : 싸가지고 온 문서, 곧 제문과 같은 것.
4)조고(操觚) : 글 짓는 것, 또는 문필에 종사하는 것으로, 고(觚)는 옛날에 어떤 사실을 기록하던 네모난 나무 패(牌)다.
5)추중(推重) : 추앙하여 존중히 여김.
6)문사(文思) : 시문(詩文) 속에 담겨있는 사상.
7)제명(題名) : 관아의 벽에 이름과 이력을 써서 기록하는 것.
8)정성(定省) : 밤에는 부모의 이부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는 안부를 묻는 일. 즉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 혼정신성(昏定晨省)
9)공령(功令) : 과거(科擧)에 사용하는 시문(詩文).
10)사마시(司馬試) :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11)기주(記注) : 조선 시대에, 춘추관에 속하는 사료(史料)가 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정오품 ․ 종오품으로 의정부 ․ 육조 ․ 홍문관 따위에서 같은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가 겸직하였다.
12)대료(大僚) : 의정(議政)을 이르는 말.
13)경악(經幄) : 임금 앞에서 경전(經傳)을 강론하는 자리. 경연(經筵)
14)경시관(京試官 ) : 조선 후기에, 3년마다 각 도(道)에서 과거를 보일 때에 서울에서 파견하던 시험관.
15)도청(都廳) : 도감(都監)에 딸린 벼슬의 하나로서 낭관(郎官)의 우두머리, 도감은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맡아보는 임시로 설치한 관아.
16)유윤(惟允) : 오직 옳게 한다는 말인데, 대언(代言)이라는 직무는 비서와 같은 것으로 임금의 명령을 옳게 인도하는 데에 있다.
17)볼결(服闋) : 삼년상을 마침.
18)등대(登對) : 어전에 나아가 면대(面對)하는 것.
19)조주(條奏) : 조목별로 써서 상주함.
20)개절(剴切) : 간절히 잘못을 간함.
21)첨서(添書)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에 든 사람이 모두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이외의 사람을 더써 넣어서 점을 찍어 결정하던 일.
22)별행정사(別行正使) : 정기적으로 조공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행(使行) 이외에 특별한 임무로 가는 사행(使行).
23)지경연사(知經筵事) :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2품 벼슬.
24)방보(防報) : 상급 관아의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에 그 이유를 변명하여 올리던 보고.
25)관절(關節) : 요로(要路)에 뇌물을 바치고 무엇을 청탁하는 일. 관절은 뼈마디로서 인체의 요긴한 부분이므로, 관료조직에서의 요로를 뜻함.
26)환정(還政) : 왕대비가 관여하던 정사를 왕에게 완전히 돌려줌을 선포하는 교서이다.
27)이무미(移貿米) : 이조 말 지방 원의 탐학하던 수단의 하나로, 지방의 관원이 시세가 오른 때 고을의 환곡을 내 팔고 대신 값이 싼 딴 고을의 곡식을 사서 채워 이익을 얻게 하던 쌀.
28)조운(漕運) : 현물로 받아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서울까지 배로 운반하던 제도, 내륙의 수로를 이용하는 수운 또는 참운(站運)과 바다를 이용하는 해운이 있다.
29)전최(殿最) : 매년 연말에 감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감시해서 중앙에 보고할 때, 상은 최, 하는 전이라 했음.
30)개납(開納) :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임.
31)액속(掖屬) : 대궐 안의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 이하 각급 잡직을 일컫는 말.
32)이수(異數) : 남다른 특별한 은총.
33)진췌(盡瘁) : 몸이 파리하도록 마음과 힘을 다함.
34)부제(賻祭) : 부의(賻儀)를 보내어 제사지냄.
35)국기(國器) : 나라를 맡아 다스릴 만한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36)정정(井井) : 질서 정연한 모양.
37)팔좌(八座) : 상서(尙書) ․ 복야(僕射)의 지위.
38)양관(兩館)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
39)귀영(歸潁) : 한(漢)의 황패가 경조윤으로 있다가 영천태수가 되어 돌아감을 말한다. 황패는 한 나라 시대에 지방장관으로 지방정치 잘하기로 이름 높은 사람이다.
40)지중(持重) : 사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중임을 맡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승중(承重) 즉 남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41)제고(制誥) : 임금을 대신하며 글을 지음.
42)공거(公車) : 과거에 급제하는 것.
43)사사(纚纚) : 글씨가 길게 연이은 모양.
44)호려(蠔荔) : 자전에 전거할 수 없다. 문맥으로 이해하길...
45)사마(駟馬)에 높은 수레로 : 고거사마(高車駟馬)와 같은 말, 거개(車蓋)가 높은 수레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라는 뜻으로, 고귀한 사람이 타는 수레를 이르는 말.
46)관각(館閣) : 조선 시대에, 홍문관 ․ 예문관 ․ 규장각을 통틀어 이르던 말.
47)해교(海嶠) : 산중과 해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48)순량(循良) : 법을 잘 지키며 선량한 사람.
49)위포(韋布) : 가난한 선비.
|
|
|
神道碑銘 幷序
領議政 李裕元 撰
蘭石李公易簀之日。要我面訣。時余被罪蟄居。而破戒往見。公欣然執手。但有勉戒之辭。無非民國事。而一不及私。噫。如公愼簡公平。與世不涅之人。何處復覿。非余之私。國人之言。公之撤筵。居然臨期。余齎文而哭。登邱而拜。公之次子荗魯。泣請大逵之表。余老且病。廢操觚之役久矣。於公終事之地。豈忍辭諸。謹按公諱根弼。字汝諧。號蘭石也。全義李氏。遠自高麗大師棹。入我朝。有諱貞幹。中樞院使諡孝靖。生諱士寬京畿觀察使。生諱恕長大司憲。封勳諡襄簡。四傳。有諱濟臣。以文武全才。官至北兵使。贈領議政。號淸江。三傳有諱行遠右議政。諡孝貞號西華。爲中興賢相。生諱萬最司饔院奉事。生諱徵海原州牧使。生諱德鄰錦山郡守。贈吏曹參議。無嗣。取從侄永培爲後。官黃州牧使。贈吏曹參判。寔爲公曾祖也。牧使諱徵楫。參奉贈吏曹參議諱德鳳。卽黃州公之本生祖考若考也。祖考諱文會吏曹參判。贈吏曹判書。號棠軒。正純二朝。受知甚隆。考諱玄緖禮曹判書。號星叟。文學政事。爲世推重。妣贈貞夫人昌寧曺氏。參判允遂女。繼妣貞夫人全義李氏。士人趾肅女。公以純祖丙子生。曺夫人出也。幼而聰慧異凡。五歲就學。不待課程而文思日進。王考棠軒公撫頂而愛之曰。大吾門者此兒也。及七歲。隨棠軒公海營任所。題名於樓榭之間曰。他日吾當莅此。後果驗。十三遘疾。小奴棠軒公促令進藥。服而旋甦。時棠軒公葬禮前也。是歲丁母夫人憂。執禮如老成。定省之暇。端坐劬經。旁治功令。未嘗少懈。憲宗甲辰。中司馬。哲宗壬子。擢文科。癸丑。分隷槐院。每登筵。記註敏速。大僚稱詡。乙卯。薦拜承政院注書。丁巳陞六品。歷成均舘典籍, 司諫院正言。文臣兼宣傳官。戊午。特除弘文舘校理。連除修撰, 副修撰, 司諫院獻納, 司憲府掌令, 掌樂院正。庚申。屢除經幄之任。輒蒙獎許之敎。間爲湖南京試官。不赴辟御營從事官。辛酉。純祖大王追上尊號都監。以都廳勞。陞通政階。拜刑曹參議。承政院同副承旨。兵曹分司參知。壬戌。屢入銀臺。執法惟允。同僚畏憚。判書公憂。今上乙丑服闋。拜右承旨。丙寅。拜吏曹參議。敦寧府都正。丁卯。連拜承旨。睿陵親祭時。以禮房勞。陞嘉善階。爲左承旨。拜漢城府左右尹。兵工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舘事。都揚府副揚管。差承文院提調。己巳。以時進官登對。條奏文義。昭通鬯。以之援引古今。陳勉剴切。上動容稱善。庚午。拜刑曹叅判。夏丁李夫人憂。癸酉。添書除吏曹叅判。大臣以進用之義奏。擢資憲階。特除刑曹判書。歷知義禁都揚管。充別行正使。時値炎澇。原隰殫竭。所過多瑰玩。而無所顧眄。灣柵之間。尙稱其淸操。秋連除知經筵判尹。甲戌。拜知春秋中樞府事。連拜司憲府大司憲。乙亥。拜右叅贊。同知成均舘事。差議政府有司堂上。丙子。拜禮曹判書。主試式年文科覆試。恢張公道。士望蔚然。春特除黃海監司。歲適大浸。防穀物之流出。禁潛釀之糜費。時有山郡社穀轉輸都下。沿海船稅。移屬京司之令。以其爲民弊。屢度防報。竟以許代屬浦。準請回下。二十三州竪碑頌惠。關西亦倣而行之。至有磨崖之擧。丁丑擇差。移除慶尙監司。至則威重以鎭之。廉簡以持之。邊情嚴其防。査還薄淸其瘼。欽獄刑則克愼克審。罷都倉則便官便民。訟繁而干囑不行。主試而關節不到。聲聞遠及。大僚奏展瓜期。辛巳春始歸。士民之解衣布路。幾亘十里。納節後。上召見于便殿。敎曰。卿按兩藩。嘉乃茂績。玉音屢煩。公仍陳還政矯捄。移貿革罷。田結改量。漕運賃船。營將殿最。守令久任等六條痼弊。上虛懷開納。退出。命掖屬扶而下殿。仍許雨具。異數也。差經理統理機務衙門事。旋拜吏曹判書。兼弘文舘提學,藝文舘提學,觀象監司甕院提調。壬午。爲永禧殿提調。主試別試文科初試。一官屢除者不書之。是年春。病歸鄕廬。六月。聞軍伍之變。力疾入城。舁而赴公。其忠勤盡瘁之節。有如是。竟於八月五日。考終于寢。享年六十七。訃聞。上震悼。致賻祭如例。禮也。越九月癸丑。葬楊根北面迷源里丈石村負辛之原。從公平日杖屨之所也。公廣顙豊顂。迷鬚髥。眼光曄如。外著坦易。內實剛正。涵淹典籍。通識古今。記誦經史。如對方策。雖尋常簿書。過眼不忘。自眇小。先輩長德。皆許以國器。孝友根天。早失所恃。以祿養不逮爲至慟。事判書公。克備旨瀡。奉李夫人。承順其志。務適其歡心。有足以感化。及喪。哀毁踰制。幾乎滅性。公之孝於斯盡矣。治家井井有條理。未嘗以産業爲累。有一娣早寡且貧。支調之資。育之方。務盡其誠。又於外氏家尤致意。置祭田以供享祀。視再從二弟如同胞。憂樂與共。不計族戚之近遠。朋儕之親疎。有急周恤。若將不及性也。而至於公私之分。是非之別。凜然有不可犯之色。盖公儉可以範俗。淸可以漓濁。軒車塵滿。非公不出。世路易昵。望焉將。厚被眷注。位躋八座。而卑躬愈篤。望副兩舘。而謙抑自晦。由是輿望彌重。金甌之卜。是朝暮事。而猶懷歸穎之志。有官輒辭。未究大用。朝野之嗟惜。尙今不泯。方之宋朝名臣。呂正惠持重識大軆。以淸靜簡易爲務。向文簡出臨四方。盡心民事。拜罷之際。喜慍不形。公宲近之。爲文本於六經。不尙藻華。制誥之軆。公車之章。不少經心。下筆。辭達理勝。有詩文畧干卷藏于家。配貞夫人豊山洪氏。府使錫謨女。吏曹判書文穆公羲俊孫。仁孝之l性。淑愼之德。與公齊軆。純祖乙亥生。當宁辛巳卒。得壽六十七。初葬同郡倉村里。移祔公墓左。擧二男一女。男長政魯成均進士。娶承旨潘南朴弘陽女。次茂魯今正字。娶承旨東萊鄭憲朝女。女適昌寧曺慶承。今縣監。茂魯三女。爲潘南朴豊緖,東萊鄭寅億妻。次幼。側出二男皆幼。曺慶承三男一女。秉楨,秉柱。次幼女幼。鳴呼。公余之蠔荔交也。自少至老。與之終始。知公者莫如余。公弱冠赴庠試。衆望屬公。謂題有犯諱。抱券而出。此公之愼也。發軔之初。有一時宰要見不應。此公之簡也。余主試院。公再爲參試。一無干與。此公之公也。海西有疑獄久不決。公一按辨析。此公之平也。此皆余目擊。而余所不及者也。垂淚撮狀外之辭。遂爲之銘。銘曰。
維古太師。大闢公門。淸江奕裔。西華後孫。四世一轍。駟馬高軒。公起繩武。
樂易粹溫。舘閣周流。經傳爲根。天官三膺。淸朝峻掄。威振惠洽。海嶠兩藩。
傳世循良。樂志田園。處苦韋布。自修克敦。一心慮國。百行溯源。恤貧周窮。
尺縫匙。王曰嘉乃。庶循輿論。利澤將流。廊廟將尊。勞瘁養疾。台宿奄昏。
知與不知。咸惜騰喧。禮官來侑。庇具優恩。愼簡公平。史氏斷言。不磷不緇。
公去名存。石陽吉岡。杖屨之村。賢配禮祔。若室作垣。積累有因。本支宜繁。
樵牧敬護。名卿泉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