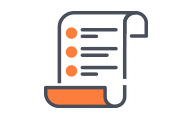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릉리 낙촌 |
묘갈명과 서문
동양위 신익성 지음
유명조선국 고신계현령 증의정부영의정 이공(有明朝鮮國故新溪縣令贈議政府領議政李公)의 묘는 양근(楊根)의 치서(治西)에 있는데, 장차 비석을 세워서 그곳에 표석(表石)을 삼으려고 하여 그의 아들 참의 행건(參議行健)과 관찰사 행원(觀察使行遠)이 나에게 명(銘)을 청하여서 이미 허락하고서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더니, 관찰사가 바야흐로 기보(畿輔)1)를 살피려고 간모(干旄)2)를 숨기고 하리(下里)를 따라 내가 있는 회상(淮上)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선인(先人)께서 돌아가셨는데, 현각(顯刻, 碑)은 아직 없습니다. 저의 선인(先人)을 알아 능히 그에 대하여 글을 쓸 사람은 오직 공(公)만이 있으니 감히 전에 부탁드린 것을 청합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이행(履行)3)함은 공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바를 빌릴 말씀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선인께서 병으로 위독할 때에 힘내어 일어나서 손으로 소열제(昭烈帝, 유비의 시호)가 말씀한, ‘착한 일이 적다고 해서 하지 않지 말고 악한 일이 적다고 해도 하지 말라.(無以善少而不爲惡少而爲之)’고 한 말을 써서 행원(行遠)에게 주고 힘써 행하라 하셨는데, 제가 진실로 불초(不肖)하지만 감히 이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하고 드디어 눈물이 몇 줄기 흘렸다. 내가 궐연(蹶然)4)히 불민(不敏)함을 사례하여 말하기를, “나는 선공(先公)에게 오직 당종(堂從, 4촌)의 의친(懿親)5)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보고 삼가 그를 섬긴 지가 40여년이 되었고 공께서도 또한 나를 오리고 변변치 않게 보지 않으시고 이끌어서 나가게 하였는데, 하루는 술을 마시는 사이에 나의 손을 잡고 곁눈질을 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죽으면 명(銘)을 할 자는 자네가 아니겠는가!’고 하시었다. 나는 그 말씀이 그냥 장난 삼아 하는 말씀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가고 오는 자취에 느낌이 있었으니, 이에 나는 슬며시 명(銘)을 기록하려고 하였었다.
이제 묘석(墓石)을 다듬었으니 나를 권하여 그 역사(役事)를 돕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공을 위해 중요하게 되지 못함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의 기술한 말이 감히 가벼워서는 안 되니, 임종(林宗)6)이 숙도(叔度)7)에 대하여 찬술(撰述)한 “맑게 해도 맑지는 않고 휘저어도 탁하지를 않는다.”함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사공(事功, 일한 공로)을 논하기는 쉽고 사람의 덕행을 형용하기는 어려우니, 내가 망령되게 선공(先公)의 일을 기술하지 않는 것은 가볍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때문이니, 그러므로 의당 그의 큰 것은 들어 말하고 세세한 것을 버릴 것이다.
공께서는 나이 13살에 고자(孤子)가 되었는데, 상례(喪禮) 치르기를 성인(成人)과 같이 하였고 슬퍼하는 모습과 곡하는 소리는 능히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능히 그 가문을 떨칠 것이다.”고 하였다. 집에 들어가서는 청상(靑孀)이 된 어머니를 받들어 어기지를 않았고 집을 나가서는 제부(諸父)8) 섬김을 아버지 섬기는 것 같이 하였으며, 물러가서는 어린 아우와 같이 책을 읽고 행실을 신칙했으며 방에 앉으면 자리를 같이 하고 나가면 수레를 함께 탔으며 풍채(風彩)가 서로 비취니 세상 사람들이 연벽(聯璧)9)이라 칭하였다.
계부(季父) 잠와공(潛窩公)은 나이가 공(公)과 같았는데, 중부(仲父) 지범공(志范公)이 그들을 끌어내서 가르쳤으니 뜻을 합하고 언약을 지키도록 해서 모두 수립(樹立)10)한 바가 있었다.
공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품이 심히 높았으니,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 같이 대(隊)를 이루고 놀 때에 몸을 깊은 나무 숲 가운데에 숨겼는데, 부모님이 급히 찾았다. 나무 숲 가운데서 부모님의 노기 띤 소리를 듣고 문득 반성하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또한 부모님께 근심을 끼친 것이다.’고 생각하고, 이로부터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작심(作心)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고치지를 않았다.
이러한 마음을 추구해서 어른을 섬기거나 추(醜)한 곳에 살면서도 한결같이 정의로웠고 승척(繩尺, 법도)에 구애받지를 않았으며, 본말(本末)과 중도(中度)에는 화합함으로 법을 삼고 궁해도 상심하지를 않았다. 집이 비록 가난하여도 아내와 자식에 대하여는 일찍이 고생이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조상의 제향(祭享)에는 힘을 다해 후회가 없게 하였으며, 행실은 돈독히 하고 늙도록 쇠하지 않았다.
지범공(志范公)이 봉사(奉使)11)로 국경을 넘어서 이국(異國)의 여관에서 운명(殞命)하였다. 공의 형제가 부츤(扶櫬)12)하여 반장(返葬 )하려하니 복상(服喪)에 참담함을 삼켰고 고달픔은 간극(艱棘)과 같아 군자(君子)도 어렵게 여겼다.
신축(辛丑, 1604. 선조34)에 사마시(司馬試, 생원)에 올라 태학(太學,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당시 선비들이 휴이(攜貳)13)를 논의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 흉보며 중얼거리자 공께서,
“능히 정성을 밀어 진실하게 하면 휴진(畦畛,경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니, 선비들은 날마다 더욱 진취하였으며, 모두 공을 일시(一時)의 명사(名士)로 여겼다.
공문(公門)에 들어온 자는 순주(醇酒)14)를 마시고 훈연(醺然)15)히 젖어드는 것 같아서 각각 그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간에 다시 찾아온 재앙 때문에 전패(顚沛)16)되어 군색하게 되었으나 그 마음을 두드려보면 희희(熙熙)17)하면서 남은 즐거움이 있었다.
성품은 술을 좋아하여 모임에서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난잡함에 이르지는 않았고, 때때로 주머니가 비어도 청좌(淸坐)하고 서로 바라봤으니, 속물(俗物)이 감히 간여 할 바는 아니었다. 늙어서는 물관재(勿關齋)라 자호(自號)하였으니 생각하면 이에 뜻을 붙이려는 것이었다.
처음에 상국(相國) 이정귀(李廷龜)18)가 정형(銓衡)을 잡고 추천하여 금오랑(金吾郞)에 제수되었고 내섬시(內贍寺)의 직장(直長)에 전보되었는데, 계축년(1613)의 어려움19)을 만나 10년을 좌폐(坐廢)되었다.
계해년(1623) 개옥(改玉, 인조반정)에 다시 호조좌랑이 되었고 신계현령(新溪縣令)에 나갔으니 이는 어버이를 위해 몸을 굽힌 것이었다. 그 다음 해에 병으로 관사에서 운명하니 천계(天啓) 갑자년(1624 인조2) 11월 7일이고 춘추(春秋)는 54세였다. 이해 ○월 ○일에 장례를 치렀다. 신계현령(新溪縣令)으로 있은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현(縣)의 백성들이 현령을 생각하여 비(碑)를 세웠다.
공의 휘(諱)는 중기(重基)요. 자(字)는 자위(子威)이며 전의인(全義人)이니, 고려태사(高麗太師) 도(棹)의 후손이다.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효정공 정간(孝靖公貞幹)은 100세가 되는 어머니를 잘 봉양하여 세종(世宗)조에 포상을 내리고 가상히 여겨 중추원사(中樞院使)에 제수하였고 여러 대를 지나서 휘(諱) 제신(濟臣)에 이르러서는 함경북도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에 증영의정(贈領議政)이고 대명(大名)이 목릉조(穆陵朝)20)에 있으니 세상에서 청강선생(淸江先生)이라 칭하였다. 이가 휘 기준(耆俊)을 낳으니, 공의 선고(先考)이시다. 학문과 행실이 있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요사(夭死)하였으니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로 도승지에 증직되었고 그 아우 지범공 수준(志范公壽俊)이 영흥부사(永興府使)로 효의(孝義)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잠와공 명준(潛窩公命俊)은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청직(淸直)21)함으로 현달하였다.
공은 포의(布衣)로 삼공(三公)과 사보(四輔)22)의 기대를 지고 아름다운 복과 길함을 이었으니 세수(世數)23)의 명가(名家)는 반드시 이씨(李氏)에게 돌아갈 것이다.
비(妣)는 숙부인 광산김씨(淑夫人光山金氏)로 감역(監役) 익휘(益輝)의 여식이고 판서 개(鎧)의 손녀이다. 좌랑인 풍천임색(豊川任穡)의 여식에게 장가 들었으니, 부인은 법도를 익혀 대의(大義)에 통하였고 공을 돕는 것으로 덕을 삼았고, 가문과 향당(鄕黨)에서 부인을 본보기로 여겼고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으며, 공과 동년의 출생으로 공보다 몇 년 뒤에 운명하여 ○월 ○일에 공의 무덤에 합폄(合窆)하였다. 2남 2녀를 길렀으니 장남은 참의(參議)이고 차남은 관찰사(觀察使)니 모두 유과(儒科)24)를 거쳐 진출하였고 성부(省部)25)를 두고 역임하고 위계가 경좌(卿佐)26)에 올랐다. 장녀는 정용(鄭涌)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현감 허박(許博)에게 출가하였다. 참의는 2남을 두었으니 만웅(萬雄)과 만종(萬鍾)이고 관찰사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정용(鄭涌)의 장남은 시성(時成)이고 차남 시창(時昌)은 진사(進士)이며 나머지는 어리고, 허박(許博)의 자녀는 모두 어리다. 공은 덕의 기량(器量)을 가지고 조금도 세상에 쓰이지 않았으니, 앞으로 그것을 저축해서 내세(來世)에 발양하려는 것인가! 말명(末命)의 창성함은 더욱이 그 여경(餘慶)이 끝이 없음을 증명한 것인져! 명(銘)을 하노니
산은 높고 내는 깊어 / 山高川深
누가 그의 덕을 알겠는가! / 孰識其德
정녕 혼백과 더불어 없어졌으니 / 寧與魄朽
새겨 쓴 것이 비석이 아니라네. / 可泐非石
|
<註> |
|
1) 기보(畿輔) : 경기지방을 말함
2) 간모(干旄) :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편명인데, 이 시는 위문공(衛文公) 때 지은 것으로, 위(衛)나라 풍속이 음란하고 무례하던 끝에 위문공이 즉위한 이후로는 풍속이 일신되어, 높은 벼슬에 있는 대부(大夫)가 수레에 깃대를 꽂고서 몸소 시골에 사는 어진 선비를 예방하자, 위나라 사람들이 이를 기쁘게 여겨 부른 노래다. 여기서는 도백(道伯)의 깃대를 말함.
3) 이행(履行) : 실제로 행한 일.
4) 궐연(蹶然) : 벌떡 일어나는 모양.
5) 의친(懿親 : 지친(至親) ㆍ 근친(近親)과 같음.
6) 임종(林宗) : 후한(後漢)의 곽태(郭泰)라는 사람으로 자가 임종(林宗)이다. 학문이 대단하고 제자가 수천 명에 달했는데, 언젠가 비를 만나 그가 쓴 두건의 한쪽 귀가 껶여 있었다. 그를 본 당시 사람들이 일부러 모두 그렇게 한쪽 귀를 접어서 쓰면서 그 두건을 일러 임종건(林宗巾)이라고 하였음. 《後漢書 卷九十八》
7) 숙도(叔度) : 후한 때 사람 황헌(黃憲 )으로 자가 숙도이다. 그는 자픔이 청수하고 총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안자(顔子)에 비유되기까지 했는데, 그와 같은 고을 사람인 진번(陳蕃)과 주거(周擧)는 항상 말하기를 “두어달만 황생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린한 생각이 다시 싹터 버린다. [時月之間不見黃生 則鄙吝之萌 復存乎心]”하였다. 《後漢書 卷53 黃憲列傳》
8) 제부(諸父) : 백숙부(伯叔父)를 말함.
9) 연벽(聯璧) : 두 구슬이 서로 연했단 말로, 둘이 똑같이 아름답다는 표현이다. 진서(晉書) 하후담전(夏侯湛傳)에, “담(湛)은 풍채가 아름다우며 반악(潘岳)과 더불어 사이가 좋아서 나가면 수레를 함께 타고, 앉으면 자리를 같이하니 서울 사람들이 연벽(聯璧)이라 칭하였다.” 하였다. 후에 와서는 형제(兄弟)가 동방(同榜)으로 과거한 데 쓰기도 하였다.
10) 수립(樹立) : 학문이나 도의(道義)를 이루어 세움.
11) 봉사(奉使) : 사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감.
12) 부츤(扶櫬) : 죽은 이의 관을 호송(護送)하다.
13) 휴이(攜貳) : 사이가 나빠짐. 사이가 틀림.
14) 순주(醇酒) : 좋은 막걸리.
15) 훈연(醺然) : 술에 취한 모양.
16) 전패(顚沛) : 넘어지고 자빠짐. 여기서는 세상이 반전된 것을 말함.
17) 희희(熙熙) : 화락(和樂)한 모양.
18) 이정귀(李廷龜) : 1564~1635. 조선 인조 때의 상신(相臣)이며, 문장가,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 본관은 연안. 윤근수의 문인, 인조 6년(1628)에 좌의정이 됨. 한문학의 대가로 글씨에도 뛰어났음.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알려짐. 저서로는 《월사집(月沙集) ㆍ 서연강의(書筵講義) ㆍ 대학강의(大學講義)》 등이 있음.
19) 계축년의 어려움 :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大北派)가 영창 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의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 등이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역모하였다는 구실로 소북파를 축출하였다.
20) 목릉(穆陵) : 선조(宣祖)의 능호(陵號).
21) 청직(淸直) : 청렴하고 강직하다.
22) 사보(四輔) : 임금의 좌우(左右) 전후(前後)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네 사람의 벼슬아치. 좌보(左輔) ㆍ 우필(右弼) ㆍ 전의(前疑) ㆍ 후승(後丞)임.
23) 세수(世數) : 대(代)의 수.
24) 유과(儒科) : 진사과를 이르는 말.
25) 성부(省部) : 상서도성(尙書都省)과 육뷰(六部)를 말함.
26) 경좌(卿佐) : 중앙의 큰 아문(衙門:육뷰(六部) 등)의 으뜸 관원과 버금 관원.
|
|
|
新溪公 諱 重墓 墓碣銘 幷序
東陽尉 申翊聖 撰
有明朝鮮國故新溪縣令贈議政府領議政李公之墓 在楊根治西 將樹石以表之 其嗣參議行健 觀察使行遠 謁銘於余 旣諾而久未就 觀察方按畿輔 屛干旄從下里訪余於淮上曰 先人墓木拱矣 顯刻尙闕 知先人而能言之者惟公在 敢申前請 且曰 先人履行 公所自諗 匪假辭之一二 而先人疾革 强起手書昭烈無以善少而不爲惡少而爲之之語 付行遠而勉之 行遠誠不肖 不敢忘焉 遂泣數行下 余蹶然而作 謝不敏曰余於先公 不唯堂從之懿 師視而謹事之者四十年所 公亦不以余幼無似 引而進之 一日酒間握手而睨謂曰 吾死而銘之者非若也耶 其言似戲 而實有感於去來之迹 余竊識之 今治墓石 責余以相其役是矣 而懼言之不足爲公重也 則出之未敢以輕 以林宗贊叔度 不過曰澄不淸撓不濁已 則論人事功易 狀人德行難 余不佞述先公事 所以出之不得以輕也 宜擧其大而細之遺也 公年十三而孤執喪如成人 顔色聲容之戚 能感動人 人謂必能世其家 入而奉孀母色亡違 出而事諸父如嚴君 退與稚弟讀書飭行 處則同室 出則竝轡 風彩相映 世稱聯璧 季父潛窩公 年與公齊 仲父志范公提而誨之 俾合志守約 俱有所樹立 而公之天資甚高 爲孩兒時 與同隊嬉戲 隱身於深樹中 父母索之急 從樹中聞恚怒聲 輒惕悟曰 此亦貽父母憂也 自是以順父母志爲心 白首無改 推是心而事長居醜 一於正誼不拘拘於繩尺 本末中度 和而有制 窮而弗隕 家雖貧 對妻孥未嘗作契活語 致養享先 竭方而亡憾 制行之篤 老而不衰 志范公奉使出疆 卒於旅館 公兄弟扶櫬返葬 服衰茹慘 纍若艱棘 君子難之 辛丑捷司馬 游太學 時士論携貳 彼是相訾謷 而公能推誠任眞 不寘畦畛 士日益進 悉一時名勝 入公門者如飮醇醪 醺然沾灌無不各厭其意 中更菑故 顚沛窘阨 而叩其中則熙熙有餘樂矣 性喜酒 遇會心人 飮終日不亂 至空無時 淸坐相看 俗物部不敢干也 晩而自號勿關齋 以寓意焉 初李相國廷龜秉銓 薦授金吾郞 轉內贍寺直長 遭癸丑之難 坐廢十年 癸亥改玉 復敍爲戶曹佐郞 出宰新溪縣 爲親屈也 其明年病卒于官 天啓甲子某月某甲也 春秋五十有四 以是歲某月某甲 克葬焉 在官未朞月而縣氓思而碑之 公諱重基 字子威 其先全義人 高麗太師棹之後 入本朝孝靖公貞幹善養百歲母 英廟褒嘉之 授中樞院使 累傳至諱濟臣 咸鏡北道節度使贈領議政 有大名於穆陵朝 世所稱淸江先生 寔生諱耆俊 公考也 有文行 不幸蚤夭 承文正字贈都承旨 其弟志范公壽俊 永興府使 孝義聞 潛窩公命俊 兵曹參判 淸直顯 公以布衣負公輔望 襲美祉吉世數名家 必歸之李氏云 妣曰淑夫人光山金氏 監役益輝之女 判書鎧之孫 娶佐郞豐川任穡之女 閑婦則通大義 佐公爲德 門黨儀之 封貞敬夫人 與公同年生 後公幾年而逝 用某年某月 窆從公兆 育二男二女 男長參議 次觀察使 皆以儒科進 歷敭省部 秩躋卿佐 女長適鄭涌 次適縣監許博 參議有二男萬雄 萬鍾 觀察有二男二女 幼 鄭涌之出曰時成 時昌進士 餘幼 許博之出子女俱幼 以公之德之器不少需于世 其將蓄而發之于后 而末命之昌 尤足以徵其餘慶於無涯也夫 銘曰
山高川深 孰識其德 寧與魄朽 可泐非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