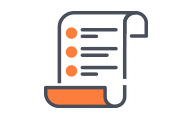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묘갈명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수화곡 |
현종11년(1670) 겨울에 정부의 유사가 중외의 효행으로 이름난 사람들을 조사하여 왕께 보고하였더니 대신들에게 회부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표창할만한 이는 표창하도록 하라고 명령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난 영흥 부사 이수준은 정문은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름하게 되니 진신대부들이 모두 서로 전하여 세상에 드문 거룩한 일이라고 하였다. 아! 어질기도 하여라. 공의 자는 덕여이며 그 선조는 전의사람 태사 도(棹)의 후예이다. 8세조인 정간(貞幹)은 나이 80세에 100세나 되는 모부인을 효성을 다하여 섬기니, 세종대왕께서 특히 궤장(免杖)을 하사하시고 총애하시었으며, 세상을 떠났을 때 시호를 효정공(孝靖公)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훈벌이 서로 이어졌으니, 증조 휘 문성(文誠)은 절도사를 지냈고, 조고인 휘 제신(濟臣)은 호가 청강인데 시종직 책을 역임하고 북병사로서 세상을 마치었는데 절행과 재략이 당시의 일인자이었으며, 선고는 곧 영흥공(永興公)이니 의를 두텁게 지키고 신을 세웠으며 특히 독실한 효성이 있어 당세에 이름이 높았다. 청강공께서 병이 위독할 때에는 하늘에 빌고 대변을 맛보았으며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구하니 약간의 차도를 보았다. 기어이 세상을 떠남에 애통해함이 예제를 넘었었다. 삼취로 양천 허씨에게 장가들어 만력 무술년(1598) 6월 초7일에 공을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웠다. 겨우 열살때에 영흥공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도중에 객지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공이 이 사실을 듣고 호통하며 예제를 지키는 폼이 마치 어른같았다. 장성하여서도 끝까지 부친을 모시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여 항상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허부인을 지성껏 받들 되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에 힘써 온화한 얼굴로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며 자리를 펴드리고 즐기는 음식을 받드는 일과 변기(便器)를 깨끗이 준비하는 일들은 반드시 몸소 보살폈다. 밖에 나갔다가 혹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버이에게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느라고 차마 먹지를 못하였다. 기사년(1629)에 모부인께서 병으로 누우니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조한 마음으로 병 시중을 드는데 옷을 벗거나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었으며, 비록 물러나가 있으라는 명을 받고 딴 방에와 있으면서도 문득 방문이나 벽사이에 귀를 기울이고 모부인의 숨소리와 말소리에 신경을 기울이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를 거의 100여일이나 되었다. 오직 병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약에 섞어서 잡수시게 하기를 거듭하니 성한 손가락이 없었다. 그때가 마침 엄동인데도 목욕재계하고 북두칠성을 향하여 회복하기를 빌며 또 대변을 맛보아 병의 징후를 알아 내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기어이 내간상을 당하게 되매 공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통곡을 그치지 않았으며, 상옷을 벗는 일이 없고 사람과 말할 때에 한번도 이(齒)를 드리내고 웃는 일이 없으며, 조석으로 다만 미음 죽만을 마시면서 삼년상을 마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어깨를 들먹이며 탄식하였다. 그런데 정려와 표창이 있던 날 조정에서는 부와 자의 사적에 차등이 있다는 이유로 증직만으로 끝나니, 군자들이 모두 한스럽게 여기었다. 공은 아름답고 순수한 성품과 뛰어난 재주가 있으며 생각하는 방향이 속기(俗氣)가 없고, 기개와 의리를 숭향(崇向)하며 가부(可否)에 대한 발표를 신중히 하였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주고 사귄 친구는 늙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이 상이나 참척을 당하였거나, 굶주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집이 가난하다고 하여 구제의 손을 늦추는 일이 없었다. 일가와 집안간에는 더욱 돈독하였는데 형수를 모시고 한집에서 살 때에는 마치 어머니를 섬기듯 하였고, 종가가 성안에 있었는데 매달 초하루 보름이면 반드시 새벽에 가서 가묘에 어른들에게 참알(○謁)하였다. 자질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엄하게 꾸짖었는데 그가 비록 귀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 병자년(1636) 호란 때에는 마침 산질에 있었지만 필마로 임금의 행차를 따라 모시어 조금도 뒤돌아 보거나 꺼리는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찌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해야 한다는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처음 인조께서 반정하였을 때에 공이 천거로 선공감(繕工監) 감역으로 제수되고, 이듬해 갑자년(1624)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며, 곧 사헌부 감찰을 거쳐 황간 현감으로 나갔다가 다시 감찰이 되어 들어와서 호조 좌랑으로 옮기었고, 3년상을 마친 뒤에 형조 좌랑에 임명되었다가 정랑으로 승진되었다. 공이 상중에 있을때부터 병을 얻었는데 이때 쯤에는 점점 심하여져서 드디어 벼슬을 그만두고 정양하였다. 십여년이 지나 마지막으로 당로한 사람중에서 공을 아끼는 이가 있어서 다시 귀휴서(歸休署) 별제(別提)로 제수되었다가 종친부 전부(典簿)와 의빈부(儀賓府) 도사(都事)로 옮기었는데, 숭정 계사년(1653) 9월 10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56세이었으니 이것이 공의 경력의 시종(始終)이다. 청주 한씨에게 장가드니 감찰 사덕(師德)의 딸인데, 부도를 모두 갖추어서 군자의 배필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행도(行道)는 지평(持平)이고, 행일(行逸)은 도사이며, 행적行迪은 현감이고, 행운(行運)은 군수이며, 딸은 첨정 박세교(朴世橋), 정랑(正郞) 이계(李稽)에게 각각 시집갔고, 친손 외손 증손들이 약간명이 있다. 공은 양근의 서종면 수화동(水禾洞) 경향갑좌 언덕에 장례를 지냈는데 뒤에 행적이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에 참여함으로써 지금의 벼슬(의정부 좌찬성)이 추증되었다. 공은 세채에게 표종숙이 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뵈었는지라, 매양 엄연한 모습으로 종일 관복차림으로 단정히 앉아 책을 보시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빈객을 예로써 대접하고 가법이 심히 엄하여 자제들의 출세를 서두루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근신하도록 하며, 또 가정 안에서도 함부로 떠드는 일이 없게 하여 집안이 늘 고요하였다. 뜰 가운데에 네모진 연못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소나무와 국화들을 심어 놓고, 몸소 그 사이로 산책하던 것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날때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적이 없다. 마침 현감공 묘문을 지어 달라고 청하므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명을 엮는다.
선비란 모든 행적 기림 받지만
그들의 분묘에는 누가 찾던가.
공의 집 부자 행적 비교한다면
어느 분이 높거나 낮음이 없어,
남들이 못따르며 이어서 자손들도 영광아닌가?
남은 경사 난옥(蘭玉)들이 현달(顯達)한지고,
이 명당 산과 물이 돌고 서렸네.
내 지금 이 비석에 명을 새기니
영원토록 공의 유적 널리 보이리.
현석 박세채(朴世采)가 지음
|
|
|
楊湖公 諱 碩基 墓碣銘
顯宗十一年冬○有司以中外孝行聞○遂下大臣○議命表故永興府使李壽俊之閭○又贈其子刑曹正郞碩基○職右贊○以旌焉○於是搢紳大夫○相傳爲希世盛擧○嗚呼賢哉○公字德輿○其先全義人○太師棹之裔也○八世祖貞幹○年登八秩○事百歲母夫人盡孝○世宗特賜免杖○以寵之○卒諡孝靖公○自是勳閥相聯○曾祖諱文誠○節度使祖諱濟臣○號淸江○歷侍從臣終北兵使○節行才略○卓冠一時○考卽永興公○惇義立信○尤以篤孝名當世○淸江公疾革○祝天嘗糞○竟斫指出血以救○幸得少蘇○及喪致毁踰禮○三娶于陽川許氏○以萬曆戊戌六月初七日生公○幼性仁孝○僅十歲○永興公○奉使返自京師道卒○公聞報號慟持制○視長者○旣長○痛不克終養○居常流涕○事許夫人務盡子職○和顔順志○枕沃繫隋○必躬自點檢○在外或値珍未○思以供親○不忍食也○歲己巳母夫人菱疾○公日夜焦勞○不解帶不就枕○雖被命退○輒屬耳竹壁間候其喘息言語○如是者殆百有餘日惟幾○乃復刺指出血○和藥以進○至指無宛肉○時方嚴終○沐浴行禱于北辰○又嘗糞滑以驗之○逮遭內艱○公刺踊無算○哭不絶口○衰經不去身○與人言語○未嘗啓齒○朝夕叉鳥粥以終喪○聞者聳歎○然堂表閭日○廟堂猶持以父子有差君子恨焉○公有美質儁才風○調拔俗○尙氣義重然○諾與朋友交○至老不變○見人有喪慽飢寒者○不以家貧○故少沮其濟恤○尤篤於內行○奉兄嫂同居一家○事之如母○宗家在域中○朔望必晨往謁○子姪有過○更爲鐫責○雖鼎貴不貸○丙子之亂○方在散秩○匹馬扈駕○無少顧憚○豈亦所謂求忠臣於孝門者耶○初仁祖反正○公以薦除繕工監役○明年甲子○中司馬試○尋由司憲府監察○出爲黃澗縣監○歸復拜監察○轉戶曹佐郞○服局拜刑曹佐郞○陞正郞○公自居憂得疾○至是益苦○遂休官靜養○踰十餘年最後堂路有惜公者○復授歸厚署別提○累移宗親府典簿○儀賓府都事○乃以崇禎癸巳九月十日不起○壽五十六此其始終也○娶淸州韓氏○父曰監察師德○婦道甚備○無違○男四人○行道持平○行逸都事○行迪縣監○行運郡守○女適僉正朴世橋○正郞李穉○內外孫曾○總若干人○公葬于楊根西終面水禾洞抱庚之原○後以行迪保社原從功贈今官○公於世采爲表從叔○肖落承拜○每炬其儼然○冠服終日危坐○看書○待賓客有禮○家法甚嚴○子弟進趨必謹○無或岸語○室廬靜散○中開方塘○旁樹以松菊○己輒逍遙其間○至今追想○未嘗不起敬也○適縣監公○以墓文請○不敢辭銘曰士稱百行○孰爲其墓○繫公父子○繼孰秉彛○超群絶綸○聖朝有命○何以旌之○曰表曰贈○匪驕錫類○先祖是光○淃伊餘慶○蘭玉冠裳○拇拇北麓○山盤水悚○我銘斯石○永無止○玄石朴世采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