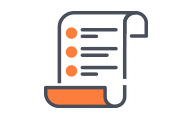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묘비문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백자곡 지범공 묘계하 |
공의 자는 사형(士亨)이고 호는 눌재이시다. 영의정을 추증한 청강 이름 제신 영의정을 추증한 용계 이름 수준 좌찬성을 추증한 양호 이름 석기 (이 어른이) 공의 증조와 조와 고이시다. 비는 청주한씨이다. 인조 임신년(1632)에 출생하시었다. (효종 31년) 임진년(1652)에 진사에 급제하시고 신해년(1671)에 영릉 참봉으로서 도사로 옮기시었다가 주부와 좌랑이 되신 뒤에 연산현감,정선군수 등의 벼슬을 지내시고 신미년(1691)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배위는 여주이씨이니 아버지는 승지 이성이시고 외조는 선원 김상용 어른이시니 공의 누린 나이 91세 이었다. 아들 3형제 딸 형제를 두시었으니 정겸은 이조참판으로 중씨되시는 행일 어른께 입후 하시었고 언겸은 좌승지를 추증하였고 충겸은 이조참판을 추증하였다.
딸은 원경회 유민정에게 시집갔다. 공은 타고 나신 성품이 자상하고 착하시며 기품이 온화하고 인자하시었다. 그리고 글 읽기를 좋아하시었다. 시비들이 몰래 그 외는 장귀를 들어보니 마치 정강성집과 같았다. 자경가에 이르기를 길을 가는데는 반드시 정로로 가야 할 것이고 집에 있을 때는 반드시 편안한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신조는 삼공이 되어도 고칠 수 없고 높은 벼슬아치가 줄을 이어도 이 절개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 자설을 지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해석하기 어렵다 이것으로 보면 공의 안정된 뜻을 넉넉히 볼수 있고 독경한 행실을 볼수 있다하겠다. 무와파의 흡곡공의 묘 하의 건좌 곤향 자리에 합폄하였다.
친손자 외손자가 모두 귀하여 중간에 잃어버린 일이 계해년에 광중을 열어보고 이 묘표를 살핀 다음에 봉분을 다시 만들고 이 묘표를 세우노라.
어허! 슬프다.
갑자년(1864) 3월 일
운손 학로는 세우고 뒤 정미년(1967) 가을에 지범공의 묘하 진좌 자리로 민례 하였다.
|
|
|
묘지명과 서문
공의 휘는 행운(行運)이요 자는 사형(士亨)이며, 그 선계는 전의 사람인 고려 태사 이도가 그 비조이다. 조선에 들어와서 휘 구직(丘直)은 호조 전서를 지냈고 이 어른이 강원도 도관찰사를 지낸 휘 정간(貞幹)을 낳았는데 하늘이 낸 효자로서 이름이 높았다. 6대를 지나 휘 제신(濟臣)은 문과에 급제하여 병사를 지내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호를 청강선생이라 하였고, 문장과 절행이 한 시대를 덮었는데 이 어른이 공의 증조이고, 조의 휘는 수준(壽俊)이니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정려로 표창되었고 호를 지범당(志范堂)이라고 하며, 고휘(考諱)는 석기(碩基)이니 또한 효도로 이름이 높아서 좌찬성으로 추증되었고 호를 양호라고 하며, 비는 청주한씨이니 현감 사덕(師德)의 딸이요 청원군(淸原君) 경록(景祿)의 증손이다.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공은 그 막내이며, 숭정 임신년(1632) 11월 13일에 났다.
일찍부터 가정교육을 통하여 도의에 젖었고 또 형제간의 우애와 처세의 행검을 모두 갖추었고, 문사와 전서(篆書) 예서(隸書) 등에 모두 능하였다.
임진년(1652)에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신해년(1671)에 태학사 박태상(朴泰尙) 방의 정시에 응시하여 공이 그 조카인 하산공 만겸과 함께 입격이 되었는데, 답안의 전편중 수귀 문장 귀절이 우연히 서로 같다고 하여 고관중 집요한 사람이 있어 이것을 트집잡아 말썽을 일으켜서 모두 급제에서 빼어 버리니 그때 사람이 아깝게 생각하였다. 이 해에 첫 벼슬로 영릉참봉에 제수되더니, 6품으로 승진 전직되어 내직으로 금부도사, 종부시, 주부, 공조 좌랑을 지내고, 외직으로 연산 현감, 정선 군수를 지내었는데, 신미년(1691) 7월 22일에 성서의 아곡(鵝谷)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 60이었다.
공은 성품이 법도가 있고 착하며 기품이 온화하고 어질어서 몸가짐을 처자같이 하였다. 어버이를 깊은 사랑으로 받들어 항상 즐겁게 하며, 여러 형을 심히 공경하였고, 많은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서 구별하는 일이 없었다. 가난한 살림에 쪼들렸지만 언제나 태연하였으며, 평시에는 독서를 좋아하여 고급의 위인들의 업적을 비교하여 보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공의 맏 며느리되는 정부인 최씨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귀(于歸)한 뒤에 공은 이미 노성한 대인이었는데, 언제나 대부인의 침소 곁에서 모시면서 아침에 여러 형제와 그 며느리가 함께 모여 새벽 문안을 드릴 때에 보면, 항상 서안을 자리옆에 놓아두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각각 돌아간 뒤에는 이미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여 종일토록 그치지 아니하니, 시비가 하도 여러 번 들어 귀에 익히어 가만히 글귀를 외우게 되니 정강성(鄭康成)의 집사람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써 공이 얼마나 학업에 부지런히 힘썼는지를 가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첨정 유봉일(柳鳳逸)이 그 조상에 정승을 지낸 약헌(約軒)의 말을 외어 들려주기를 『내가 본 바로는, 내 친구중에 이아무의 문장이 정대에서 가장 우수하였는데 마침내 급제하지 못한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아! 공의 효성과 우애는 한 집안의 내정까지 화목을 이루게 하였고, 문학의 성예는 스승과 친구 사이에 넘쳐 흘렀던 것은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스스로 호를 눌재라 하고 이어서 스스로 눌재옹전을 지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질이 고요하여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간략하여 번거로운 것을 싫어한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장단을 겨루다가 서로 다투고 시비나 비교하여 서로 변론하는 것보다는 홀로 팔장을 끼고 종일 벙어리처럼 말없이 앉아 있어 꼭 말더듬이 같은 까닭에『눌(訥)』자를 넣어 호를 삼았노라.
대대로 청한한 집안이라, 담박한 것을 즐기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며, 무슨 물건이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없고, 성색으로서 이목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당초부터 심술에 접하려고 하지 않았다. 집이란 오직 네 벽만 쳤을뿐, 가난함이 내뜻에 누가 될 것이 없고, 굵은 삼베 도포를 입고 비단옷에 살찐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면서도 부럽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마음에 맞고 아니맞는 것이 없이, 오직 진실을 근본으로 삼고 행동이 절벽에 선듯하더라도 순정과 근신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며, 간사함에 약한 것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느슨하더라도 풀어지지 아니하고, 부드럽더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여 평화롭게 소원을 이루웠으면 굳게 지킬 것이며, 뜻을 얻지 못하여 잠겼을 때에는 강한 정신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니, 마음속에서 행동을 작정하면, 우뚝하고 뚜렷하여 빼앗을 수 없는 지조가 생기게 되고 남이 알아줄 것을 바라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명자설』과 『객난해(客難解)』를 지어 그 깊은 뜻을 표시하였는데 명자설(名字說)에서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가정에서 하고 깊이있는 훈계를 받들었고, 어릴적에 비유(比喩)하여 경계하는 참 뜻을 받은 바 있는데 이름은 행운이고 자는 사형(士亨)이다. 이름은 그 행동을 표시하는 것이고, 자는 그 덕을 일깨우는 것이다.
주역에 말하기를 『하늘의 운행은 건전하다. 군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였고, 선유가 운전할 운(運) 자의 뜻을 풀어 말하기를 『운행하되 쉬지 않는 것을 운(運)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무릇 천리가 흘러가며 운행하는 데에는 음과 양의 두 기가 서로 운행하여 능히 사시의 질서를 순조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이와 기를 받아서 하늘 뜻을 본받아 쉬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능히 사단(四端)의 정성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는 쉬지 아니하는 천명을 본받아 나의 마음의 하늘을 닦고자 한다. 그러므로 유행(流行)하는 하늘의 이치(理致)를 행동으로 본받고 음과 양의 두 기가 서로 교류하는 운을 따서 이 두 뜻을 합한 것으로 나의 이름을 삼아 나의 행동이 순일(純一)하도록 힘써서, 이것으로 가정에서의 행동은 효성 우애로써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것으로 국가에 대하여는 충성과 신의로써 스스로 격려하되 곤궁하여 하위에 있을 때에는 빈천을 바탕으로 분수를 잘 지키어 쉬지 않고 행동할 것이며, 현달하여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부와 귀를 바탕으로 분수를 지키어 쉬지 않고 전진하자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내 이름에 비유된 뜻을 나의 행동으로 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군자는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순경에 처해 있듯이 항상 행복하다는 생각을 바꾸지 말아야 하고, 운수가 비색한 경우에 처하여서도 태평(泰平)한 처지(處地)에서 안주(安住)하듯이 항상(恒常) 행복(幸福)하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어야 할 것이다. 쓰이거나 버려지거나, 시행하거나 수장되는 것은 비유하는 뜻에 따라서 행복으로 통할 수 있고, 얻거나 잃거나 영화롭거나 욕된 것을 한결같이 행복으로 보아야만 춥고 배고프며 곤궁하여 급박하고 겨를이 없이 지내며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서 마음속이 즐겁고 편안하여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타고난 행복을 누리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자 곧 사형(士亨)의『형(亨)』자를 경계의 뜻으로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으며,『객난해(客難解)』에서 대략 말하기를 『한도(漢都)의 양지(陽地) 바른 곳, 목멱산의 남쪽 수리쯤 되는곳 청파(靑坡) 마을에 눌재옹(訥齋翁)이란 사람이 있어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일그러진 처마는 비가 올까 무섭고, 무너진 벽이 들어오는 바람을 간신히 막을가 말까한데, 그렇지만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끼니를 이어 나가지 못할 때가 많고, 아침에는 저녁을 걱정하여야 하건마는 항상 태평하기만 하다.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경영하려는 옥심과는 담을 쌓고 지혜가 캄캄하여 임기응변할 능력이 없으니 이웃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웃고 친척들은 그 졸한 성질을 업신여긴다. 한 객이 이것을 보고 비난하여 말하기를 『예기에 이런 말이 있지 아니한가? 비천한 것 이상의 욕된 일이 없고, 곤궁한 것 이상의 슬픈 일이 없다고, 무릇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살고, 영화롭게 되어 높은 지위에 올라 화려한 집에서 훌륭한 기구(器具)를 갖추어 놓고 자주빛 인수(印綏)를 늘어뜨리고 붉게 칠한 수레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인정으로서 즐거움일 것이고,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부와 귀를 모두 만족하게 얻지 못한다면, 집이나 잘 수리하고 생산에 힘을 써서 곡식이 잘되는 기름진 땅을 점령하여 온갖 가축들을 잔뜩 기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이것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며 즐기는 것은 마치 중장통의 낙지론(樂志論)처럼 하는 것이니 이것도 하나의 멋이 될 것이다.
이제 자네는 출세하여 높은 벼슬을 하여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앉았으면 재산을 모으거나 물업(物業)을 늘려서 처자를 부양하지도 못하면서 궁벽한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안방과 사랑의 구별도 없으며 뜰에는 울타리와 대문도 없으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거리끼는 빛이 없고, 조금도 개의하는 뜻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듯이 제멋대로 즐기고 기쁜 듯이 배짱좋게 잘도 지내고 있으니, 거의 하조(荷篠)어른께서 이른바 사체를 부지런하게 놀릴 줄도 모르고 오곡(五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고 하였다.
옹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하기를 『말이 어찌 그렇게 비루한가? 부귀를 즐겨하고 빈천을 슬퍼하는 것은 본디 사람의 떳떳한 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데는 그 방법이 옳아야 하고 얻을 수 있고 없는 것은 통명(通命)이 있는 것이니, 요행을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바른 길을 굽혀 가면서 벼슬지위를 얻는 것을 탐위(貪位)라 하고, 그 의롭지 아니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을 탐재(貪財)라고 하였다. 어찌하여 도의를 안다고 하는 군자가 탐위(貪位)를 하고 탐재(貪財)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옛날 나의 선조가 훈계(訓戒)한 말씀에 있기를「학문하는 이가 부귀와 재리를 추구하고 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로 친다면 배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였고, 또「재물을 보기를 마땅히 분토(糞土)처럼 하라」고 하였다.
그런즉 청백하게 살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집에 전하여 오는 가훈이고, 청렴하고 깨끗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고유의 가업(家業)이다. 이제 나는 욕심을 죽이고 마음을 맑게 가지며, 타고난 성정(性情)을 온전히 길러서 그 지조를 굳게 하여 우리 선조의 유훈을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행동이 자신의 뜻에 비추어 결함이 있고, 도의가 자기의 뜻에 비추어 굴복함이 있으면서 오직 재리나 도모하고, 벼슬자리나 기웃거리는 일은 나로서는 차마 하지 못하겠노라』고하였다.
공이 지은 시편에도 또한 탁의(托意)하여 지은 것이 많다.
그 자경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정로가 아니면 가지를 말고, 갈 곳이 없으면 내집이 있네. 삼공의 지위로도 뜻 못 굽히며, 천사(千駟 : 말 천마리) 권위로도 절개 못 꺽지. 저 사람 부자라고 나를 깔보면 이 몸은 의기로써 대항해야지. 저 사람 벼슬 높다 우쭐거리면 이 몸은 덕성으로 굴복시키지. 주는 것도 받기가 혐의롭구나 운명이란 무엇인가. 내 할 탓이지 그 누가 무엇이라 떠들더라도 나는 꼭 배우겠네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자장학간록(子張學干祿)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가 남긴 저서나 필적은 정밀(精密)하고 화려하면서도 재치가 있고, 아담하고 고우면서도 순수(純粹)하여 애써 꾸민 구석이 없으니, 이것만으로도 그의 몸가짐, 마음가집, 정신적인 자세 등 만분의 일을 상상하여 볼 수 있으며, 안존하고 고요한 뜻과 돈독(敦篤)하고 겸공스러운 행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은 여주 이씨이니 대제학 행(行)의 후예요 군수 이성(以省)의 딸이며 선원(仙源) 김상용공(金尙容公)의 외손녀인데, 공이 세상을 떠난뒤 31년을 더 살아 91세에 세상을 떠나서 금천의 마장리(馬場里) 우와릉(牛臥陵)의 임좌 언덕에 합폄하였으니, 즉 양대 선좌의 곁이다. 아들 3형제 딸 형제를 두었으니, 맏아들은 정겸(廷謙)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吏曹) 참판(參判)을 지냈고, 다음은 언겸(彦謙)이니 통덕랑이고, 다음은 충겸(沖謙)이며, 맏딸은 원경회(元慶會), 둘째딸은 봉사(奉事) 유민정(柳敏廷)에게 각각 시집갔다.
친손 외손 증손자들은 많아서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아! 공의 높은 재주와 맑은 글솜씨로도 한 세상에 수용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과 의젓한 행실이 또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창명(彰明)되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선비들이 모두 탄식하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아니 하겠으며, 그 후손들이 흐느껴 통곡하면서 죄송스러워 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증손되는 덕용이 세월은 자꾸 흐르고 조상의 끼친 규범(規範)은 유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공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지문(誌文)을 부탁하는지라, 감히 글솜씨가 졸하다고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가장의 실기를 참고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를 주워 정리하여 간략하게 돌아가신 어른의 묻혀진 덕을 들되, 약간이나마 뒷 사람들의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조판서 겸 양관 대제학 오도일(吳道一)이 지음
|
|
|
旌善公 諱 行運 墓誌銘 幷序
公諱行運○字士亨○其先全義人○高麗太師李棹爲鼻祖○入我朝有諱丘直○戶曹典書○生諱貞幹○江原道都觀察使○以天孝聞○歷六世有諱濟臣○文兵使贈領議政○號淸江先生○文章節行冠冕一世○爲公之曾祖考也○祖考諱壽俊○贈領議政○以孝旌閭○號志范堂考諱碩基○亦以孝贈左贊城○號楊湖○騙淸州韓氏○縣監師德之女○淸原尉景祿之曾孫○生四男○公卽其季也○以崇禎壬申十一月十三日生○早襲家庭之訓○兄弟之業○行誼篤備○文詞篆隸俱臻工○壬辰司馬試○辛亥太學士朴泰尙榜庭試○公與其姪霞山公萬謙俱入格○而全篇中數句適相同○考官中執拗者以此爭執俱至拔科○時人惜之○是年筮仕○除英陵奉○遷轉陞六○內經禁府都事○宗簿寺主簿○工曹佐郞○外歷連山縣監○旌善郡守○辛未七月二十二日○終于城西鵝谷第○壽六十歲○公性度詳善氣○稟溫仁律○身若處子○奉兩親深愛○怡愉如也○事諸兄甚恭○待衆人不設畦畛○處貧窮泊然○平居好讀書○玩索古今○以自娛樂○公之長子婦貞夫人崔氏○嘗語人曰吾於于歸後○公己老成大人○而嘗傍侍太夫人寢所○朝日群兄弟諸婦女俱會晨省○而公恒設書案于座側○諸人各還之後○仍開卷吟誦○終日不輟○侍婢熟於耳聞○竊誦章句如鄭康成○家人以此知公之勤於業也○又柳僉正鳳逸○誦其先相國約軒之言曰○吾見用友中○李某之文章○優於庭對○而竟不得一第○是甚不可知者○噫公孝悌之行○雍穆於閨門之內○文學之譽○洋溢於師友之間者○推此可知矣○嘗自號訥齋翁○仍自作傳略曰性靜而厭喧○簡而惡煩○ 人廣座論長短○而互詰較是非而胥辨○獨拱手墨坐○終日若訥○因以爲號焉○世襲淸寒○恬淡寡欲○於物無所好○聲色之悅耳目者○固己不接於心術○家徒四壁而不以貧淚累其志○溫袍款段間於輕肥○而未嘗有艶慕之意○心無適莫而本於眞實○行絶崖岸而主於醇謹○人美其優於善○而病其短於缶也○然緩而不弛○柔而不靡○和適而守之以確○苞潛而克之以剛○其用力於方寸之間則○卓乎有不拔之操○而不求人之知也○又作名字說○客難解以見志○名字說曰○余夙奉庭訓之純○深早受寓警之旨義○名以行運○字以士亨○名所以識其行○字所以警其德○易曰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先儒釋運之義曰○行而不息之謂運○夫天理流行○二氣交運○而能順四時之序○人受理氣○法天不息而能復四端之性○今余欲穿於穆不己之命○以修我方寸之天故○則天理流行之行○取二氣交運之運○合二義而爲名○勉吾行之純一○以行乎家則○孝悌以自强○以行乎國則○忠信以自强○窮而在下則○ 貧賤而行之不息○達而在上則素當貴而行之不息○此吾所以寓於名○而識其行者也○寒困窮棲遑遺佚○而不怨不尤○襟袍樂易無入而不得其亨○此吾所以著於字而寓其警者也○客難解略曰○漢都之陽木覓之南○數里許○靑坡村有號訥齋翁者○綠一矮屋癬塹畏雨破壁妨風○而處之怡如○簞瓢屢空○朝不謀夕○而履之晏如○念絶營爲○智昧機變○鄕隣笑其愚○親屬嗤其拙○客有難之者○曰記不云乎○垈莫大於卑賤○悲莫甚於困窮○夫士生斯世○安富尊榮○坐華堂而列五鼎○結紫綏而朱其輪○此人情之所樂○而今昔之同然○富且貴苟不可得全則○繕第宅營産業○占橘州之膏捨○畜平夷之五勝○優游偃仰以此自娛○如仲長統樂志論斯可矣○今子出而不能紆靑拖紫○齧肥持梁○處而不能營財殖産○育妻庇子○居窮僻○處弊廬○堂無內外之別○庭缺門籬之障○而不祿于心○不介于懷○由由焉自適○熙熙焉自娛○殆荷揄丈人所謂○四穿不勤○五寗不知者○非歟○翁捧腹而笑曰○何言之陋也○樂富貴而悲貧賤○固人之常情也○然而求之有道○得之有命○可幸而致也○吾聞枉其道而得位曰貪位○非其義而取財曰貪財○焉有知道君子○而貪位貪財而可爲也○昔吾先祖有訓○學者以有富貴利達之心○不如不學之爲愈○又曰視財物當如糞土○然則淸白礪節○吾家之箕輪也○廉儉潔行○吾門之 業也○今吾欲寡慾而澄其心○養性而堅其操○以佩我先祖之遺訓○行有虧於身道有屈於己○而惟利之是圖○惟位之是求○吾不忍爲也○所著詩篇亦多○托意之作○其自警歌曰○行必由正路○止必居安宅○三公不易介○千駟不移節○彼以其富我以義○彼以其爵我以德○猶嫌賜也不受命○肯學子張之干祿○其遺篇遺墨○精華而工姸○開雅而醇粹○絶無藻飾之熊○此可以磋辦乎聲容形氣之萬一○而亦可想見○恬靜之志○篤敬之行矣○配驪州李氏○大提學行之後○郡守以省之女○仙源金公尙容之外孫○後公三十一年而終○壽九十一歲○合哮于衿川馬場里○牛臥陂壬坐原○卽兩代先塋之側也○擧三男二女○長廷謙文吏○次彦謙通德郞○次沖謙○女長元慶會○次奉事柳敏廷○內外孫曾○多不盡記嗚呼○公之高才淸文○旣不能需用於一時○嘉言懿行又不得彰明於身後則○豈非衿紳之所歎惜○而雲仍之所隱痛者乎○曾孫德容○懼夫歲月之不待○而先範之無傳也○抱本狀而囑誌文○不敢以文拙辭○拈取家狀之實記○此拾世好之稔知○略廻繼壙之潛德○而少慰後承之深悼者耳○吏曹判書兼兩館大提學吳道一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