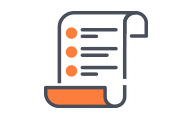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신도비명
고려 건국초에 태사 벼슬이신 도(棹)라는 어른은 태조를 도운 개국공신이다. 이씨로서 전의를 본관으로 가진 사람은 다 이분이 시조가 된다. 전의이씨는 오랫동안 현직을 맡아 세족으로 800여년 이어 내려오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세종대왕 때에 효정공(孝靖公) 정간(貞幹)이 효성이 지극하여 온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 뒤 6대를 이어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래서 북도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된 제신(濟臣)이 문무에 뛰어나 선조때의 명신으로 손꼽히어 세상에서 청강선생이라 부른다. 청강 선생의 둘째 아들의 휘가 수준(壽俊)으로 벼슬이 영흥 부사에 이르렀고, 영의정으로 증직되었다. 효도가 지극하여 정려의 영광을 받았다. 이분의 아드님은 휘를 석기(碩基)라 하고 벼슬이 형조 좌랑에 이르고 좌찬성을 증직받았다. 이 어른 역시 효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분의 아들의 휘가 행일(行逸)로 벼슬은 의금부 도사였고 이조 참판을 증직받았다. 이 분의 동생의 휘는 행운(行運)으로 벼슬이 정선 군수에 그쳤다. 이렇게 3세를 이어 벼슬을 하여서 크게 현달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달하기 시작한 것은 공으로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공의 휘는 정겸(廷謙)이고 자는 경익(景益)이니 정선공의 아들로서 도사공에게 출계(出系)하였다. 정선공의 배위는 여주이씨니 승지로 추증된 이성(以省)의 따님이다. 도사공의 배위는 청송심씨이니 교리로서 이조 판서에 증직된 희세(熙世)의 따님이다. 공의 성품이 언제나 한결같이 활달하시고 이광(夷曠)하며 평상시에는 간묵(簡默)하고 말씀이 적으셨다. 영리에는 손댄 일이 없으시고 더욱 우대하는 행동을 아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치축(馳逐)으로 낙을 삼으셨다. 젊었을 때에 옛친구와 술을 즐기며 시를 지으시며 자연을 벗삼으시고, 권문 세가들을 문앞에 들이지 아니하였다. 당론이 한창 치열하던 당시에 한쪽에 치우쳐서 대치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사리에 맞고 꼭 해야할 말만 해야 할 자리에서는 뜻이 있고 깊이 있게 지적하여 말하여 조금도 굽히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
무인년에 사간 정호(鄭澔)가 상소를 올려 좨주(祭酒)로 있는 윤증(尹拯)을 몹시 헐뜯어 스승을 배반한 사람으로 지목하니, 불같이 성을 내며 갖은 소리를 다하는 데도 한사람도 이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에 공이 집의(執義)로서 홀로 계문啓文을 올리어 정호의 죄를 청하니, 이에 응교 김진규(金鎭圭), 지평 정유점(鄭維漸) 등이 잇따라 공을 매우 모질게 공박하였다. 공이 인피(引避)하여 말하되 스승과 제자의 의와 부자 사이의 인륜은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윤증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이 두가지 상충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니 그의 잘못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정 호는 그 사단의 근본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재를 다시 불어내어 불집을 일으키니 신이 어떻게 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장령 김덕기(金德基)가 공의 직책을 바꿀 것을 핵주(劾奏)하니 임금께서 공의 바른 의견이 옳다고 하시고, 유점(維漸)을 체직시키고 선비의 시론(時論)을 힐책하시니,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 수십년 동안 쟁의가 그치지 아니하다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시비가 비로소 진정되었다. 공의 시론에 대한 주장에 반대 의견이 부딪힌 것이 이 때문이었다.
기묘년에 사릉(思陵)(단종비릉端宗妃陵)의 역사(役事)를 잘 감독한 공로로 통정대부로 승진되어 형조 참의를 배하였다가 우부승지와 병조 참지로 옮기었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연안 부사가 되었다. 이때에 한결같이 자신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를 위주로 하였다. 그때에 그 고을의 아전 가운데 군포(軍布)를 축낸 사람이 수십명이었다. 법에 따르면 모두 사형감이었으나 공이 이들을 모두 곤장으로 다스리고 군포를 받아들이고 못다 마친 사람은 부역에 충당토록 하였다. 이로써 아전과 백성 할것없이 모두 부사를 칭송하였다.
신사년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있다가 신씨 부인의 상사를 당하였고, 상을 마친 뒤에는 잇따라 병조 참지•예조 참의•승지를 지내고 충청 감사에 제수되었다. 이때에 이숙인(李淑人)이 연만하여 사양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병조 참의와 대사간(大司諫)을 제수받고 정부에서 장차 도성을 개축하려 할 때에 힘이 부치어 치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주관한 대신이 정역(停役)할 이유가 없음을 혐오하여 이를 왕에게 올린 뒤에야 비로소 축조하게 되었다. 공은 그 계교가 궁지에 몰리게 되어 미봉책을 써서 적당히 처리하는 것을 배척하였다. 당시의 대신은 공이 한 일을 중표(中表)로 생각하고 공의 신망을 깊이 생각하였다.
병술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발탁되어 무비(武備)를 수련하고 요역과 세금을 경감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한다면 불휼(不恤)하였다는 불명예보다는 낫다고 하였다. 안변은 북로(北路)에 통하는 큰 고을이라 거기에는 청렴하고 깨끗한 안전이 적어서 백성들이 기아에 헤메이는데도 방치하고 아울러 민폐가 극심하여 백성들이 관의 명령에 견디지 못하였다. 공이 조정에 장계를 올려 7년 동안의 공세(貢稅)를 경감토록 하였다. 또 감영에 비치하여 둔 곡식을 풀어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때까지는 해마다 흉년이 들면 영남 곡식을 배로 실어 왔는데 늘 적절한 시기에 미치지 못하고 고기잡이나 소금도 언제나 그 때를 놓치고야 말았다. 이런 결과로 백성을 구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백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공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 남관(南關)의 여러 고을에 곡식을 비치하되 일년 정도를 지탱할 정도만 여유를 남겨두게 하였다. 어느 고을이나 수백석을 늘 창고에 쌓아 두게 되었다. 공이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토록 하고 또 영營의 비축미를 옮기어 창고를 짓고 쌓아두었다가 때에 맞추어 나누어 주기도 하고 거두어 들이기도 하였다. 이미 해운(海運)의 폐가 적어지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곡식을 조달할 필요가 없게 되니 이때부터 백성의 병폐가 많이 적어졌다. 과만(瓜滿)으로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임금이 왕자의 저택을 짓기 위하여 구혁(具赫)의 집을 사들이려 하니, 공이 말하기를 구혁은 인현왕후(仁獻王后)의 부모를 주사(主祀)하는 사람이요 또 그 옆에 있는 민가가 많이 헐릴 것이니 사들이지 마십시오 하고 아뢰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 의견을 따라서 그 일을 중지토록 하였다. 호조 참판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직하였다가 다시 대사헌과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였다. 이 때에 최석정(崔錫鼎)이 예서를 편찬한 것이 있었는데 간행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이때에 사간(司諫)이 말하기를 경서가 훼손되면 성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여 의견을 왕에게 올리어 물리치게 하였다. 공은 그 뜻이 예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딴 뜻이 있는 것을 미워하여 상소를 올려 극력 변백(辯白)하였다. 이조(吏曹) 참판(參判)에서 선공감(繕工監) 제거(提擧)가 되었다가 병으로 예조 참판으로 바꾸어 제수되었다. 기축 5월 28일에 정침에서 세상을 떠나시니 춘추가 62이었다. 그 해 7월에 양주읍 나곡마을(余谷村) 사좌해향(巳坐亥向)의 언덕에 장사지내었다.
임술년에 증광시(增廣試)에 뽑히어 괴원1)(槐院)에 권지(權知) 부정자(副正字)가 되고 천망으로 사국(史局)에 들어가 검열로부터 대교(待敎) 봉교(奉敎)를 거쳐 전적(典籍) 감찰(監察) 예조 좌랑에 오르고 여러 번 대성(臺省)2)의 망에 올라 낙점을 받았으나 외직을 택하여 양양 현감이 되었다가 벼슬을 사양하고 오랫동안 교사(郊舍)에서 병거(屛居)하였다. 다시 왕명으로 병조 좌랑을 제수받았다가 정랑으로 승진되고 외직으로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가 되었다. 갑술 경화(更化)에 비로소 시강원(侍講院) 사서가 되고 사간원 정언(正言)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 기사 환국(換局)에 여러 신하가 폐비를 힘써 간하지 못한 죄를 수론(首論)하고 이로 인하여 이후정(李后定)과 이만원(李萬元)을 포장하여 신하의 절의를 권장할 것을 청하고 천망으로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에 제수되고 교리에 승진되었다가 또 헌납(獻納)으로 지제교(知製敎)를 겸하고 한학교수(漢學敎授) 서학(西學)교수 시강원 사서 교서관(校書館) 교리를 거쳐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 이 자리는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였는데 인물을 등용할 때는 모두 공의(公議)에 따라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병자년에 암행어사로서 호서지방을 염찰할 때에 안흥창에 있는 곡식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뒤 필선(弼善)으로 승진되고 다시 사간원에 응교(應敎)와 사인(舍人)으로 옮기어 보덕(輔德)을 겸하고, 사복시정(司僕寺正)과 집의(執義)를 지냈다. 오랫동안 가물고 비가 올 기미가 없게 되자 빈민들이 사는 집 외에는 불필요한 영조물(營造物)을 짓는 역사(役事)를 중지하고 그 물자를 가지고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데 사용할 것을 청하였다. 공의 일생동안 지낸 벼슬이 이와 같고, 옥당(玉堂)에 입직한 것이 제일 오래였다. 문의(文義)를 해석할 때는 언제나 풍규(諷規)3)로서 정신을 삼았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할 때에 공이 진헌하여 말하기를, 밖에는 금황(禽荒)이 있고 안으로는 색황(色荒)이 있다고 옛사람들은 두가지 사실을 열거하였으나, 예부터 임금된 사람이 완호지(玩好之物)에 대하여는 경계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여색(女色)에 있어서는 자제하는 임금이 드물어서 몸을 망치고 나라를 뒤엎어 버리는데 그 이유가 여색을 가까이 하는데서 비롯되는 일이 많았으니 이를 보면 내황(內荒)이 외황보다 훨씬 심하고 무겁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칭찬하시었다. 또 말하기를 옛날에 우리 인조 임금께서 오랫동안 외지에서 난리를 겪으시어 백성들 일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뒤 효종께서는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서 많은 고난을 겪으신 까닭에 즉위하신 뒤에 와신상담하시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이 두 임금의 치적은 훌륭하게 빛나셨으니 전하께서는 옛 분을 본받기보다는 두 임금의 정치하신 큰 뜻을 본받으시면 다행일까 합니다 라고 하니 또 칭찬하시었다. 또 진서산(眞西山)4)이 한나라의 문제(文帝)와 무제(武帝)를 논한 대목을 인용하여 강(講)하면서 말하기를,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말하기도 어렵지만 이 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허물임을 절실히 느끼시어 간곡한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진심으로 진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가장하시나 그런 신하를 등용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을 거의 무제의 정치에 가깝습니다. 제도나 조직면에서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문제(文帝)로 말하면 깊고 말이 없는 가운데서 공경하고 투철하여 연을 타고 가다가도 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두 임금의 치적을 가히 알 것입니다 하니 칭찬하기를 마지하지 아니하셨다.
또 석인장(碩人章)을 강할 때에 공이 문제를 제기하기를 왕이 만약에 수신제가하는 덕이 없으면 정정(貞靜)한 덕을 소홀히 하기가 쉬울 뿐더러 여자의 교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위장(衛莊)에는 장강(壯姜)5)과 신후(申后)6)의 덕이 있으나, 마침내는 폐첩(嬖妾)들에게 빠졌으니 이 일을 후세 사람들은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후세의 임금이 마땅히 이것을 거울삼아 경계할 점입니다고 하니 임금이 가만히 듣고만 있고 답을 못하였다. 이것은 임금이 공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서 짚이는 데가 있기 때문이었다. 공이 어려서 어버이를 잃고 심부인을 지극한 효도로 섬기었다. 이것을 보고 심씨의 친정에서 모두 말하기를 부인은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보다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 아들없음을 한탄하지 말라고 하였다. 두 동생이 다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웠다. 이를 보고 내가 지금 좀 넉넉하다 하여 가난했을 때의 일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보살펴 주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혹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물으면 문득 말하기를 나의 이 말은 내 아들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대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입을 다묻었다. 배위는 정부인 해주최씨이니 영유 현령(永柔縣令)을 지낸 시설(時卨)의 딸이다. 어질고 부덕이 있어 그 지아비를 잘 보좌하여 내조를 잘 이루었는데 공이 세상을 떠난뒤 14년에 세상을 떠났다. 공의 묘에 부하였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징성(徵成)이니 현재 성천 부사이다. 참판 정제두(鄭齊斗)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후사가 없다. 후취는 서종눌(徐宗訥)의 딸인데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으니 모두 어리다. 공이 덕수(德壽)에게 족조(族祖)가 되는데 모두 청강공의 후손이고 또 나의 선인과 동갑이다. 또 한 조정에서 벼슬하였는데 성천공 징성(徵成)이 행장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을 지어 주기를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하여 보니 공이 원래 과장하거나 속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묘문을 쓰는 자가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는 것을 폐가 되는 일로 생각하던 분이라 이제 공의 덕을 기리어 명을 지으려니 차라리 간략하다는 평을 들을 지언정 감히 아첨하거나 과장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의 뜻이고 성천공의 뜻일 것이다.
명(銘)에 말하기를
청강의 후예로서 4세를 이어 창성하였도다.
매가 날개를 펼치듯 키 크고 잘난 모습,
어려서 경적에 통하여 붓끝에서는 향기가 나고,
운수는 평피7)를 지냈으며
때는 바야흐로 권서지절8)을 이루었네
진도(晉塗)9)가 열리었으니
대여(大輿)10)가 장하기도 하다.
치관(扁冠)11)쓰고 조정에 서서
당언(詵言)12)여러 번 올리었네.
법연(法筵)13)에서 계옥(啓沃)14)하니
임금의 말씀이 다시롭고 온화하다.
누가 백료(伯寮)15)의 뒤를 따르랴.
교언(巧言)과 참소를 함부로 하고,
조정에 있는 백관들이 몸을 사리고
유구무언인듯 말을 못하네.
공이 흥분하여 붓을 잡으면
그런 고관들의 기(氣)를 꺾었다.
아각(牙角)16) 여러 고관들이 풀이 꺾이어
가을의 무서운 보라매로다.
무릇 오늘에 사는 보통사람들
공상(空桑)17)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네.
오랑캐 성이 나서 눈을 휘뜨고 당긴 활처럼 둥그러졌네.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며 적당한 말이로다.
어버이 아니면 누가 기르며 스승이 아니면 누가 가르치나.
진실로 어버이를 헐뜯어 달래고 타이르고 부축하여 주고,
침략에 대비하여 방어에 힘써,
우리 백성 굶주릴 때에 산넘고 물건너
백성을 살리고 배를 띄워 곡식을 실어 날라
험한 길 닦고 터서 길을 열었다.
북쪽에서 올 배는 봄을 넘기고
남쪽에서 올 곡식은 가을에 닿아
내 집에 붙은 불을 어떻게 끄랴.
저 물을 헤어 감아 물을 트고,
창고마다 곡식을 넘치게 쌓고 알맞게 흐트러 주고
때 맞추어 거두도다.
이웃 곡식 거두어 무엇에 쓰리
나의 창고에 곡식쌓여 있는데
재앙도 우리 백성 해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 반석같도다.
백성들이 입을 모아 기리는 소리
공은 우리네의 어버이다.
북녁 땅에 공의 은덕 넘쳐 흐르고
공은 내직으로 들어왔네.
대사헌 중한 일을 잘도 해내고
천조(天曹)18)의 많은 일을 도와 이루어
비불진한(飛不盡翰)19)이라네.
천수를 다 못하시고 떠나니
조야가 눈물바다라
조장(弔狀)으로 가신 님을 아쉬워하고,
양주 고향땅에 고이 모시니
비에 새겨 후세에게 알리노니
백대까지 밝은 빛을 드리워주소서.
|
<註> |
|
1) 괴원(槐院) : 승문원(承文院)의 별칭
2) 대성(臺省) : ①한나라 때에는 상서성(尙書省)의 이칭으로 쓰이었고, ②당(唐)나라 때에는 상서 중서성 등의 3성을 통틀어 이를 때에 쓰이었고, ③우리나라에서는 대(臺)는 사헌부 성省은 사간원으로 대성(臺省)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쓰이었다.
3) 풍규(諷規) : 우회하여 완곡하게 간(諫)하는 말 또는 그 행동
4) 진서산(眞西山) ; 송(宋)나라 때의 유명한 성리학자, 진 덕수(眞德秀), 명나라의 전통연간에 공자묘에 종사(從祀)하였다.
5) 장강(莊姜) : 중국 춘추(春秋)시대에 위나라의 임금 위장공(衛莊公)의 후비, 부덕(婦德)이 뛰어나기로 중국에서 유명함.
6) 신후(申后) : 주나라의 12대 임금 유왕(幽王)의 후비, 어질고 착한 부인으로 이름이 높음.
7) 평피(平陂) : 기복(起伏)이 많은 운수, 평(平)은 평탄함을 뜻하고 피(陂)는 기울어져 있음을 뜻하는데 주역(周易)의 지천태(地天泰)괘의 무평불피(无平不陂) 무왕불복(无往不復)에서 유래한 말임.
8) 권서(卷舒) : 오그라드는 일과 펴지는 일, 일을 경영하는데 수급(綏急)이 득의(得宜)함을 이르는 말. 열녀전(列女傳)의 왕장(王章)의 처, 지권서지절(地卷舒之節) 또 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에 나옴.
9) 진도(振塗) : 나아갈 길, 진(晉)은 진(進)과 통함.
10) 대여(大輿) : 임금이 타는 수레, 주역의 대장(大壯)괘에 있음.
11) 치관(扁冠) : 집법관(執法官)이 쓰는 관, 해치(속칭해태)라는 신수(神獸)가 있는데 사람의 선악(善惡)을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 있다고함.
12) 당언(詵言) : 선량한 말
13) 법연(法筵) : 불교(佛敎)에서 설법하는 자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연유하여 임금께 강의하는 처소를 가리키는데 쓰임.
14) 계옥(啓沃) :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임금에게 그 정성을 쏟음. 서경(書經) 설명상(說命上)에 있음.
15) 백료(伯寮) : 관료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듯함.
16) 아각(牙角) : 어금니와 뿔.적을 전면(前面)에서 제어하는것.
17) 공상(空桑) : 여기에서는 공자(孔子)의 출생지를 가리킴.
18) 천조(天曹) : 이조(吏曹)를 말하는 것으로 청(淸)나라에서 이부(吏部)를 천조(天曹)라고 하였다.
19) 비불진한(飛不盡翰) :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하다는 말로 정치의 수단이 비상(非常)한 것을 말함.
|
|
|
吏曺 叅判 李公 諱 廷謙 神道碑銘
麗初太師棹○佐麗祖○有開國功○李氏之貫全義者咸祖焉○簪組相望八百餘年○至本朝英陵朝○孝靖公貞幹○以孝聞○六傳而北道兵馬節度使○贈領議政濟臣○以文武材爲穆陵朝名臣○世號淸江先生○淸江仲子諱壽俊○官永興府使○贈領議政○以孝旌閭○生諱碩基○官刑曹正郞○贈左贊成○亦以孝聞○生諱行逸○官義禁府都事○贈吏曹判○有弟行運○官旌善郡守○連三世官不大顯○其顯自公始○公諱廷謙○字景益旌善公之子○而子於都事公○旌善公之配曰○驪州李氏○贈承旨以省女○都事公之配曰○靑松沈氏○校理贈吏曹判書熙世女○公性夷曠和厚○平居簡默寡言○無所營爲○尤不喜代代馳逐○唯樂與布 舊交○對酒敍懷○至於要津權門則○足跡如掃○生於黨論之世○深惡傾軋○唯於事之當言者○指陳琴亮○無所撓屈○戊寅司諫○鄭澔疏余祭酒尹拯○甚醜目之以背師○其氣聆如焚○無敢出而抗者○公時爲執義○獨啓請罪澔○於是應敎金鎭圭○持平鄭維漸○相繼攻○公甚力○公引避言○師生之義○父子之倫○輕重有間○尹拯所遭○乃其不幸而非其過也○今澔不究其本○噓燎於旣灰之浚○臣安得不○論掌令金德其○承望時議○劾遞公職○上直公命薦○維漸始士論○以此爭詰數十年○至是而是非始有所定○公之見臨時論○亦由於是○己卯以董役思陵勞○陞通政○拜刑曹議○遷右副承旨○兵曹知○乞養爲延安府使○一以約巳便民爲務○吏盜軍布者數十人○法當盡死○公重之杖○而徵其布以充未輸之役○吏民交頌焉○辛巳棄歸○丁沈夫人憂○服局○連除兵○曹知○禮曹議○承旨出爲忠淸監司○以李淑人年高○辭不赴 除兵曹議○大司諫廟堂將改築都城○力饅而績不成○主事大臣嫌於無辭停役○乃請奏聞○後始築○公深斥其計○窮彌縫之失○大臣於公爲中表○望公頗深○丙戌擢授咸鏡觀察使○修鍊武備○省減民稅○苟可以利民○不恤毁譽之外至○安邊爲北路巨鎭吏其間者多無良○重以質飢○弊滋而民不堪命○公狀于朝○懼七年貢稅○又損營儲彭蘇其殘○舊例每歲裙○輒移嶺南粟搜舶轉漕○恒患後時○而漁鹽復失其時○始欲救民而終乃襄民○公患之南關列邑○皆有營穀○一年之剩○邑率累百石○公錄其數○又移營儲設倉○積峙以時斂散旣除海運之弊○而荒年救民○又不外資○自是民不以病告○秩滿以大司憲召還○上爲營王子第宅○將買具赫家○公言赫是仁獻王后○父母主祀之人且左右民○居見毁者多願勿買○上泛之○遞拜戶曹判○兼同知義禁府事○又除大司憲○兼同知春秋官事○崔公錫鼎○編禮書刊行己久至是司諫李觀命謂○之毁經侮聖○疏逐之○公惡其意○不在禮書爲之疏辨○遞拜吏曹判○提擧繕工監○引疾辭遞○除禮曹判○己丑五月二十八日○終于正寢○春秋六十二○以其年七月○葬于楊州治東奈谷村抱巳之原○公登己酉司馬○擢壬戌增廣○隸槐院爲權知副正字○薦入史局○自檢閱○歷待敎奉敎○陞典籍監察禮曹佐郞○屢擬臺省○輒栢點力求外○出爲襄陽縣監○旣罷歸○屛居郊舍久之○除兵曹佐郞○陞正郞○出爲平安都事○甲戌更化○始除侍講院司書○諫院正言○司憲府持平○首論己巳諸臣○不能力諫廢妃之罪○仍請褒奬李后定李萬元○以勵臣節○薦授弘文館副修撰○陞校理○又拜獻納○兼知製敎漢學敎授○西學敎授○侍講院司書○校書館校理○遷吏曹正郞○通塞人物○率循公議○丙子以暗行○廉察湖西○發安興倉栗○以哺飢民○陞弼善○移司諫應敎○舍人○兼輔德○司僕正○執義○天久旱不雨○請罷嬪御第宅○非時營 之役○以其財移補賑資○公之所歷官位如此○而其在玉堂前後最久○每因文義○多進諷規○嘗講大學衍義○公進曰外作禽荒○內作色荒○古人雖竝言然○自古人君或能存戒玩好○而至於女色鮮○能自制○亡身覆國○恒是之由○內荒比外荒爲尤重○上稱善○又曰昔我仁廟○久勞于外○克至民事之艱難○亦越孝廟○備嘗遼塞風霜○卽祚之後○薪瞻襄志○斯二聖之治度越前古○殿下不必遠法前代○以兩朝之勤政爲法則○幸甚上又稱善○又因眞西山○論漢之文武○公進曰○古人言非言之難○行之惟艱○殿下遇若○靑躬綸音懇惻○而廷臣或有直言者則○外示嘉奬○實無採用之效○此殆近於武帝○見於制詔燁然可觀○而其視文帝○淵默恭儉○止輦受諫之德○果何如也○上復稱善相屬○又因講碩人章公進曰○人君若無修齊之德則○貞靜之德易疎○而狐媚之態易寫○衛莊有莊姜之賢○幽王有申后之德○而終爲嬖妾所蔽○此時人之所哀○而後世之所當鑑○上默然○不答至公意有所指也○公少孤○事沈夫人至孝○族于沈者皆言夫人無子而有子○乃勝有子無子不爲○恨兩弟窮無以爲生○彭於我衣食○賤貧之交○不以旣貴而琥其情○口不談人過失有問者輒云○吾未嘗語吾兒○淃語君耶○配貞夫人海州崔氏○永柔縣令時卨女○賢有婦德○克相君子以成內治○後公十四年而卒○葬蟄公墓○有一男徵成○今爲成川府使○娶贊鄭齊斗女○不育○後娶徐宗訥女○有一男二女幷幼○公於德壽爲族祖○同出于淸江公○又與吾先人同庚○而同仕于朝○今成川公具狀屬銘竊念公 不喜誇翊○恒病世之爲墓文者○過於浮張○今於銘公之德○寧失之約○不敢諛○不敢溢○斯公之志也○亦成川公之志也○銘曰 淸江之後○四世乃昌○長身角貌○鵠峙鸞翔○維初通籍○啣筆含香○運有平陂○時哉卷舒○晉塗旣闢○壯于大輿○扁冠在列○屢奏詵言○法筵啓沃○天語春溫○孰擬伯寮○肆其巧讒○盈庭縮縮○有舌如箝○公奮其筆落其牙角○群僚動色○秋空一璂○凡今之人○匪産空桑○胡努其目○有弧之張○王曰兪哉○乃言其宜○匪父曷育○師敎曷施○苟傷吾親○美固當虧○王言炳炳○日星其揭○維北有土○俗臀而屬摩之置之○亦以武濟○我民
阻飢○踰嶺望哺○雲帆轉海○越險騫阻○北○船春苑○南粟秋至○燎延我廬○資彼遠水○乃積乃倉○斂散有術○隣帑奚發○我庾巳溢○若不爲害○民安其堵○民亦有言○公我父母○公惠在北○公歸王朝○乃長憲司○乃佐天曹○飛不盡翰○齡胡違德○薦紳涕所○交咨迭惜○惟楊有原○惟公收藏○晝文詔後○百代耿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