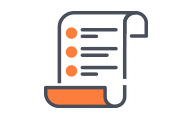본문
|
|
묘지명
척대부(戚大父)인 소곡(韶谷) 이공께서 몸가짐과 언행을 올바르게 규율로 엮어온 지 50여년에 향리의 서당에서 흠앙하여 본받고 수령과 도백이 조정에 추독(推篤)하는 등 덕망이 높았지마는 끝내 야인으로서 늙어 별세하시니 그 아들 상사(上舍) 익순(翼舜)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군(先君)께서는 생전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시고 묘에도 명이 없어 후세에 그 업적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의 증대고모(曾大姑母)가 그대의 고조모이니 우리 선대의 덕행을 알기로는 그대만한 이가 없는 터인즉 그대가 아니면 누가 묘명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양(履陽)이 감히 사양할 수가 없다.
공의 휘(諱)는 징재(徵載)이고 자字는 자후(子厚)이니 전의이씨이다. 고려 초기부터 세상에 알려진 가문으로서 조선에 들어와서 휘 제신(濟臣)은 문무의 큰 재주를 겸하였고, 북병사를 지냈으며 호가 청강(淸江)이니 이 어른이 공의 5대조이고, 고조(高祖)의 휘(諱)는 명준(命俊)이며 호는 잠와(潛窩)이고 참판을 지냈는데 맑은 모습과 곧은 행적으로 한 세상을 뒤덮었으며, 휘 현기(顯基)는 교관이고, 휘 행경(行敬)은현감이니 공의 증조와 조고이다. 고의 휘는 만각(萬珏)이고 비는 순흥안씨이니 정랑 지至의 따님이다. 공은 어릴적부터 그 모습이 뚜렷하여 대인이 될만한 기국이었으며 말과 행동이 성실하였다. 어떤 큰 고을의 수령으로 있는 이가 세찬을 보내어 왔더니 공이 여럿이 보는 앞에서 그 부친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으로서 요로(要路)에 아첨하여 관직을 얻은 자가 보낸 것이니 이것은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때 나이 13세였다.
약관(弱冠) 때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동안 여묘(廬墓)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제(禮制)에 조금도 어긋나지 아니하게 집상(執喪)하여 꼭 덕행을 갖춘 어른과 다름없었다. 백씨 징저(徵著)는 출계하였고, 중씨 징구(徵耉)는 일찍 돌아가니 스스로 소곡(韶谷)의 산과 들을 개간하는 등 몸소 생업에 힘써서 대부인을 지성으로 봉양하였고, 또 과거제도의 운영에 혼란과 부정이 심하여지는 것을 보고 과거공부를 중지하고 실학(實學)을닦아서 집을 다스리고 어버이를 효양하는 일을 당면(當面)한 임무로 삼아서 첫 닭이 울면 어버이의 침실 문밖에 가서 안부를 살핀 뒤에 날이 밝으면 다시 들어가서 안부들이되, 엄동이나 장마철이면 몸소 침실에 불을 때어 온도를 조절하였고, 가세가 매우 가난하였지만 즐기는 반찬을 항상 마련하였다. 대부인께서 연세 아주 많아서 돌아가시니 공도 또한 늙었었고, 때가 깊은 겨울이었는데도 여막(廬幕)에서 호곡하니 나의 조부 군위공께서 들으시고 달려가서 억지로 제지함으로써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고, 항상 잠자리에서이불을 쓰지 않았다. 공은 비록 학문을 한다고 남에게 말하지를 않았지만 책상 위에는 잡서(雜書)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익히고 외는 것은 사자(四子)(성현의 저서 네가지)와 염낙(濂洛)과 관민(關株)(유학이 진흥된 지명)의 문학서적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사서석의(四書釋疑)를 저술하였더니 곧 버리고 말하기를『정자(程子)와 주자朱子께서 연석(演釋)을 남김없이 하였는데, 나로서는 그 테두리를 엿 볼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 억지로 선배(先輩)들이 이미 쓸데없다하여 버린 의견들을 마치 내가 새로 발견한 것처럼 기록에 남겨 자만한다는 것은 후세의 선비들이 누(陋)하다고 할 것이니, 내가 어찌 알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항상 하는 말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나의 마음을 거두어 들이고 묶어 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홀로 깊은 밤에 있을 때에도 등을 펴고 옷깃을 바로잡았고, 베개에 의지하거나 벽에 기대지 아니하였다. 마음속에 게으름이 움직이는듯 하면 『장경일강(莊敬日疆) 사안일투(肆安日偸)씩씩하고 공경하면 날로 강(疆)하여지고, 함부로 행동(行動)하고 편안함을 생각하면 날로 경박(輕薄)하여진다』라고 여덟 자를써서 경계의 뜻으로 책상옆에 붙여 놓았다. 항상 종이쪽을 많이 모아 효용하며 욕심과 기심(嗜心)을 억제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에 괴로움이 심하였다. 반찬(飯饌)에도 반드시 가지 수를 정하여 두었고, 시저(匙著)도 반드시 수를 한정하여서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못하게 하여 언제나 하루와 같았으니 비록 고기반찬이나 별미가 있어도 집 사람들이 감히 들이지 못하였다.
종가(宗家)가 두어마장 거리에 있었는데, 크고 적은 제사때면 비록 강한 바람이나 폭우때라도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라도 가서 참사祀하니 당내(堂內) (동고조의 집안) 여러 어른과 젊은이들이 감히 늦게 오거나 불참하지 못하였다. 가정에서 휴거할 때에 자질들을 모아 놓아도 게을은 태도나 우스개 소리들을 하는 사람이 없어 엄숙하고 정제하기가 조정과 같았다. 당시에 충청도내에 시와 예로서 이름이 두드러진 사대부가많았지만 이 이씨를 반드시 손꼽게 되는 것도 공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조 을사년(1785) 9월 27일에 별세하니 춘추가 77세였고, 덕산현 목과동木瓜洞 술좌의 언덕에 있는 부인인 공인(恭人) 청송심씨의 묘에 합장하였다. 공인은 주부(主簿) 진현(進賢)의 따님인데 성품이 유순하고 우아하며 효도에 독실(篤實)하여 안부인을 섬김에 있어 힘을 다하여 봉양하였는데, 혹 자력이 모자라면 저고리와 치마를 팔아서 보태기도 하면서 자신은 떨어진 옷으로도 조금도 개의하지 아니하였다.
과부가 된 공의 누님이 있어 의탁할 곳이 없게 되니 불러다가 한집에서 보내기를 30여년이나 되었지만 집안에 불평스러운 말이 없이 항상 화기가 감돌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의 뜻이라면 무엇이던 순종하였다. 공보다 16년이나 먼저 별세하였고 2남 2녀를 낳으니 장자는 상사上舍이고 덕우(德隅)는 일찍 죽어 자녀가 없으며 딸은 박홍원(朴泓原) 윤재백(尹載百)에게 출가하였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상사는 5남 1녀를 두었으니만배(晩培)•학배(學培)•문배(文培)•장배(章培)•호배(浩培)인데, 학배는 덕우(德隅)의 후사로 들어갔으나 일찍 죽었고, 딸은 윤택진(尹宅鎭)에게 출가하였는데 또한 일찍 죽었다. 장배는 일찍이 국상(國庠)에 들어갔으며 문사에 능하다. 이양(履陽)이 난 것이 가장 늦었으나 공의 노년을 직접 보았는데, 매양 우리 집에서 빈객(賓客)을 모아 연회가 있을 때에는 공이 한번도 오지 아니한 바가 없으나 와서는 또한 종일 있는 일도 없었다. 관대를 깨끗하게 갖추고 규율(規律)있는 걸음걸이에 몸가짐이 근엄하였으며 목소리가 종의 여운(餘韻)처럼 넓고 웅장하여바라보면 숙연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대화하며 담소할 때에는 어질고 온후하며 정답기 그지없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모두 당에 속하여 있었고, 두 집은 서로 당이 달랐지만 서로 존중하여 이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어른들의 독실한 생각은 기꺼이 이어 나갈만한 것이다. 간혹 가서 뵈일 때에는 대숲속의 초옥이 티끌하나 없이 깨끗하였으며 책상과 서적이 항상 꼭 놓일 자리에 놓여있는 가운데, 공이 산악처럼 우뚝 앉아있어 방바닥이 꺼질 듯하였다. 일찍이 이양(履陽)에게 말씀하시기를
『후배들은 당론에 깊이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당론이란 크면 나라를 망치고 적어도 집을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슬프다, 공이 깊은 생각으로 타이른 바가 아니겠는가?
명을 다음과 같이 엮는다.
말세의 학문이란 말은 많고 실천없이
논쟁(論爭)하고 분렬하니 근본 더욱 멀어지네.
존산(尊山) 밑 아늑한 곳 참된 선비 계셨으니,
덕과 의로 일관하고 진실(眞實)밖에 모르셨네
주자께선 무난하다 공자말씀 좋다 한일,
내 보기에 이 어른은 허(虛)도 가(假)도 전혀 없네.
적선(積善)이 두터우니 여경(餘慶)이 없을손가?
이 돌에 명을 새겨 무궁토록 보이려네.
판서 김이양(金履陽)이 지음
|
|
|
韶谷公 諱 徵載 墓誌銘
戚大父韶谷李公○律身勵行○五十餘年○鄕塾式焉○州刺史以聞○而卒老于野○其胤上舍翼舜○泣曰吾先君之不顯時也○墓而無銘○後無徵焉○且我之曾大姑○爲子之高祖母○知我先德○莫如子 非子其誰宜銘○履陽 不敢辭○公諱徵載○字子厚○系出全義○顯自麗初○逮我朝○有諱濟臣○才兼文武○官北兵使○號淸江○寔公五代祖○高祖諱命俊○號潛窩○官判○淸風直聲盖一世○諱顯基敎官○諱行敬縣監○爲曾祖祖考○考諱萬珏○騙順興安氏○正郞至女也○公幼儀萄然○有大人器○言動無妄○作有都雄邑者○致歲饋○公衆中言於大○人公曰人也諛世而取官○此物不當受○時年十三○弱冠丁外憂○三年不離廬○居動率禮矩類成德長者○伯氏過房○仲氏早歿○遂自拮据山墅韶谷○奉太夫人安焉○旣又見場屋淆甚○廢擧業一以修實學治家養親爲當務○鷄鳴審安否於門外○候天明後入省○盛寒耀雨○或躬點火○以適寒溫○家甚淚○甘脆不乏○太夫人大鮎而終○公亦己老矣○時値隆冬○通夜號哭于廬○吾王父軍威公聞之○馳往强而後入室○而累然藁席衾麟不施○公雖不以學問揭標目○而案上無雜書○習常誦貫○不越乎四子及洛株文字○嘗著四書釋疑○尋去之曰○程朱釋之盡○吾患不能窺耳○强覓先輩己棄之語○要衒自己新得之見○後儒陋矣○吾何尤而效之○常言爲學○當先收束○雖處幽獨○必艮背整襟○不一癬枕衲壁○自省有怠心○作者輒書○莊敬日彊○安肆日偸○八字以警○此兀冊間○常有累葉紙節○嗜慾處貧約甚苦飯饌○必有定器匙箸○必有定數○不增不減○恒若一日○雖有重肉兼味○家人不敢進○宗家在數里間○而大小祀○雖烈風甚雨○必扶策往○堂內諸少長○亦莫敢後焉○燕居娶集子姪輩○無敢說惰容鄙語○齊穆如朝廷○當時湖以內彬彬多詩禮○士大夫而於李氏○必聳一指者以公在也○正宗乙巳九月二十七日卒○春秋七十有七是○歲○合葬于德山縣木瓜洞負戌之原○恭人靑松沈氏之墓○恭人主簿進賢女也○性柔婉篤於孝道○事安夫人竭力供奉○或甚不給○至脫衣裳市之躬弊汚不麴也○公有妹○孀而無依者○筐以居同窕三十餘年○家無間言○融融然惟尊姑夫子之意是順○先公十六年卒○生二男二女○長卽上舍德隅早世無子○女適朴泓源○尹載百○俱夭○上舍生五男一女○晩培學培文培章培浩培○學培後德隅夭○女適尹宅鎭夭○章培早升國庠○能文辭○履陽生最晩○猶能及公之衰矣○每見我家賓客宴飮之○日公未嘗不至○至未嘗不盡日○而偉衣緩帶步履中矩○容體嚴碩○聲音若韻○鍾望之肅然可畏○及其笑語相間仁厚款如也○我國之士○有黨○兩家各異所尊○而不以是或替良飢○前輩篤厚之風爲可繼也○嘗以時往拜之○竹林茅屋○瀟灑絶塵○免沃書籍○位有常處○公凝然山坐○床若不勝○嘗謂履陽曰後輩無甚○黨論黨論甚○大則亡國小則亡家○噫公其命之矣○銘曰叔季之學○言長行短○紛綸割裂○本之則遠○尊山之下○有蘊眞朴○維德之恒○維秉之確○周曰無難○孔曰斯可○吾見其人○非敢虛假○其積也厚○曷不蕃昌○刻此玄石○質諸無彊○判書金履陽撰